[정직성이 읽고 밑줄 긋다] 남녀는 완전히 만날 수도, 완전히 헤어질 수도 없다는
5일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렸다.?최승호 시인의 표현대로?’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이었다.
이를?핑계 삼아 윤대녕 단편집, <대설주의보>를 읽었다, 등장인물들이 다 내 주변 사람들 같다. 장소도 너무 낯익은 곳들이고. 기시감의 강도가 거의 홍상수 감독의 영화, <북촌방향>을 볼 때 수준.
소설도 소설이지만, 책 뒷부분에 신형철의 어여쁜 평문 <해설 : 은어에서 제비까지, 그리고 그 이후>이 인상깊다. 해서 해설 중 발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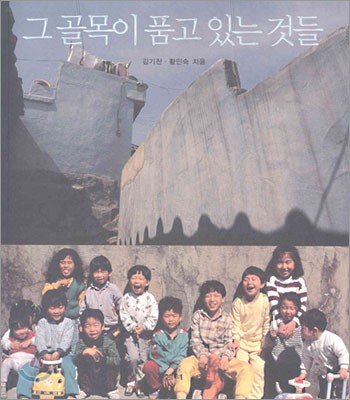
p. 285~286
그러나 이것을 패배주의나 허무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끌어내고야 마는 것이 저 책의 힘이다. 다른 생 혹은 다른 세계에 대한 꿈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는 것은 생의 실상을 향한 차분하고 결연한 직핍(直逼)인데, 그것이 “생의 회한과 허무”(「고래등」)와 비장하게 직면하여 숭고해질 때 그의 최근 걸작들은 독자의 마음에 한순간 지진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초기 윤대녕의 낭만주의가 그 자체로는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니었듯이, 이 ‘범속한 비극’의 세계는 그 자체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비극이 우리 시대에 대한 적절한 문학적 응전이 되고 있는지를 챙겨 물어야 한다. 생의 한 측면에 볼록렌즈를 들이대는 경쾌하고 발랄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아졌지만, 근원적인 가치에 대한 일체의 성찰을 모욕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비극일 수 있다. 비극은 생의 정면과 직면하지 않으면 쓰일 수 없거니와, 직면 없이 어떤 성찰이 가능할 것인가.
p. 290 (각주 부분)
새삼스러운 지적이지만, 윤대녕의 인물들은 어떤 결락 없이는 만나지 못한다. 왜일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저 우연의 소산이었을 만남인데, 거기에 어떤 결락이 서로를 알아보고 손을 내민 것이라는 맥락을 그려 넣는 순간,? 그 만남은 더 이상 우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게 된다. 이 작가는 그의 소설에 숱한 우연들을 작동시키지만 또 그만큼의 비의적인 상징들을 동원하여 그 우연이 사실은 인연이라고 거의 교향악적으로 설득한다. 천지간에 우연은 없고 다만 인연이 있을 뿐이라는 (멀게는 동리와 미당의 세계에 닿아 있는) 이 작가의 뿌리 깊은 세계관의 관철이다.
p. 293
‘신파적인 것’이야말로 온갖 휘장을 걷고 난 뒤에 남는 생의 맨얼굴임을 잘 알고 있는 것에 더해, 정서의 물길을 정교하게 이끄는 기교로 그것을 ‘문학적인 것’으로까지 끌어올리는 솜씨야말로 이 작가 특유의 것이기 때문이다. 꽤나 담백하게 삶을 꾸려왔다 싶었는데 관계의 어떤 난맥 속에서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신파의 한가운데에서 허둥대고 있었다, 라는 식의 체험이 있는 이라면 이 소설과 냉정한 거리를 두기 어려울 것이다.
p. 297
이제는 ‘범속한 비극’의 세계에서 ‘범속한 구원’의 순간들을 발견해내느라 윤대녕의 소설은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구원은 대개 실패하고 아주 드물게 성공할 뿐이지만, 그것은 이 작가가 자신의 세대를 살면서 느끼는 정직한 실감일 것이고 어떤 불가항력에 의해 떠밀리듯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직한 현황일 것이다.
p. 298
이제는 바뀐 세계 속에서 그만큼 바뀐 주체로 서서, 다시 한번 문학만이 넘볼 수 있는 ‘바깥’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결국은 다시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p. 298~299
그의 책은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하염없이 날아가는 새를 닮았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바람이 불고 있어 아프고, 하릴없이 그 바람 맞으며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아리다.
모국어로만 표현되는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좀 감격스러운 일이다. 그런 아름다움에 헌신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평론가가 되기도 한다.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1990년 이래의 윤대녕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천지간에 상춘곡 가득한 이 시절에 그를 읽는다. 시를 엿보는 소설도 있지만 시를 통과한 소설도 있다는 것을,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만날 수도 완전히 헤어질 수도 없다는 것을 나는 그의 소설에서 배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