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성이 읽고 밑줄 긋다] 당신의 ‘오드라덱’은 뭔가요?
발터 벤야민 <문예이론> … 카프카의 단편 ‘가장의 근심’ 속 오드라덱
요즘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을 다시 읽어보고 있었는데, 프란츠 카프카에 대한 글에서 오드라덱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에 ‘공공의 꿈-종로’전을 준비할 때, 매리 언니의 흥미로운 작업 제목이 ‘오드라덱’이었다.
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던 중, ‘오드라덱’이 카프카의 소설 중에 등장한다고 해서 읽을 때마다 뒤져보았는데 쉽게 눈에 띄지 않았던 터라, 이번에 발견한 것이 무척 반가웠다. 번역본 중 카프카의 ‘어떤 가장의 근심’이 수록되어 있는 게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속?오드라덱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P. 88?
카프카에 있어 현세가 죄를 짓고서 만들어낸 가장 이상한 잡종이 ‘어떤 가장의 근심’에 나오는 오드라덱이다.
“언뜻 보기에 그것은 납작한 별모양의 실패처럼 보인다. 그리고 정말 그것은 실로 덮여 있는 것 같다. 확실히 그것은 낡아서 끊어진 것을 연결하고 있고 또 엉켜있기도 한, 여러 종류의 색깔의 실뭉치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패인 것만은 아니다. 별의 한 가운데에서 조그마한 막대가 바로 이 조그마한 막대와 서로 접합되어 있다. 이 두 번째 막대가 한쪽 편에서, 그리고 별의 발산하는 불빛이 다른 한쪽 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도움으로 전체는 마치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처럼 곧추 서 있을 수 있게 된다.”
오드라덱은 ‘다락방, 층계, 복도, 현관 등에서 번갈아 가며 머문다’. 그러니까 그것은 죄를 추적하는 법정처럼 동일한 장소들을 더 좋아한다. 다락방은 폐기되고 망각된 가재도구들이 쌓여있는 장소이다.
오드라덱은 사물들이 망각된 상태 속에서 갖게 되는 형태이다. 그 사물들은 흉하게 일그러져 있다.
‘오드라덱’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며 불쑥불쑥 우리 앞에 나타나?
찾았다. 카프카의 ‘어떤 가장의 근심’. 민음사에서 나온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시골의사 책에 ‘가장의 근심’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네. 짧아서 아래 ?전문을 올린다.
전영애 교수(옮긴이)가 쓴 작품해설 중 오드라덱에 대한 글 일부를 먼저 옮긴다.
‘카프카에 이르는 길, 동시에 카프카가 본 삶의 길이 가늠되는 작품들을 극히 짧은 장편에서부터 중편까지 뽑아 구성하여 보았다. 그 길은 나아가 긍정하는 이성 앞에 느닷없이 부정의 유령처럼 불쑥불쑥 나타나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의 인간의 병적인 집착을 섬뜩한 웃음으로 비웃는 듯한 수수께끼 사물-카프카가 만들어낸-오드라덱이 다니는 길(‘가장의 근심’), 온 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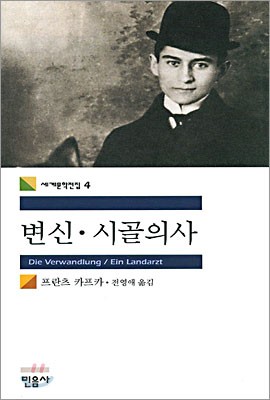
<가장의 근심> (전문)????
“어떤 사람들은 오드라덱이란 말의 어원이 러시아어라고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의 형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어원은 독일어인데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았을 뿐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해석의 애매함으로 미루어보아 그 어느 것도 맞지 않으며 특히 그 어느 해석으로도 이 말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추론인 듯하다.
물론 오드라덱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실제로 없다면, 그 누구도 그런 연구에 골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선 납작한 별 모양의 실패처럼 보이며 실제로도 노끈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노끈이라면야 틀림없이 끊어지고 낡고 가닥가닥 잡아맨 것이겠지만 그 종류와 색깔이 지극히 다양한, 한데 얽힌 노끈들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일 뿐만 아니라 별 모양 한가운데에 조그만 수평봉이 하나 튀어나와 있고 이 작은 봉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져 다시 봉이 한 개 붙어 있다. 한 편은 이 후자의 봉에 기대고 다른 한 편은 별 모양 봉의 뾰족한 한 끝에 의지되어 전체 모양은 두 발로 서기나 한 듯 곧추서 있을 수가 있다.
이 형상이 이전에는 어떤 쓰임새 있는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깨어진 것이라고 믿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으리라.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적어도 그런 낌새는 없으니 그 어디에도 뭔가 그런 것을 암시하는 다른 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부러져 나간 곳이 없고 전체 모양은 비록 뜻없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으로 마무리되어 있어 보인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오드라덱이 쏜살같이 움직이고 있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드라덱은 번갈아가며 다락이나 계단, 복도 마루에 잠깐씩 머무른다. 이따금씩 몇 달이고 보이지 않다가, 그럴 때는 아마 다른 집들로 옮겨가 버린 모양이지만, 그래도 그런 다음에는 틀림없이 우리 집으로 되돌아온다. 간혹 문을 나서다 오드라덱이 마침 계단 난간에 기대 서 있는 것을 보면 말을 걸고 싶어진다. 물론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할 수는 없고, 그를-워낙 작은 생김새부터가 그렇게 하게끔 유혹한다-어린아이처럼 다룬다. ‘너 대체 이름이 뭐냐?’하고 묻는다. 그가 ‘오드라덱이에요.’ 한다. ‘그럼 어디에 사니?’ ‘아무데나요.’ 하면서 그가 웃는데 그것은 폐가 없이 웃는 듯한 웃음일 뿐이다. 그것은 마치 낙엽들 속에서 나는 서걱임처럼 울린다. 그것으로 대화는 대개 끝난다. 아무튼 이런 대답들조차도 늘 들을 수는 없으니 그는 대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뭇토막처럼, 그가 바로 그것인 듯 보이는 나무토막처럼.
쓸데없이 나는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문한다. 대관절 그가 죽을 수 있는 걸까? 죽는 것은 모두가 그 전에 일종의 목표를, 일종의 행위를 가지며, 거기에 부대껴 마모되는 법이거늘 이것은 오드라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훗날 내 아이들과 내 아이들의 아이들의 발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노끈을 끌며 계단을 굴러 내려갈 것이란 말인가? 그는 명백히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죽은 후까지도 그가 살아있으리라는 상상이 나에게는 거의 고통스러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