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⑫]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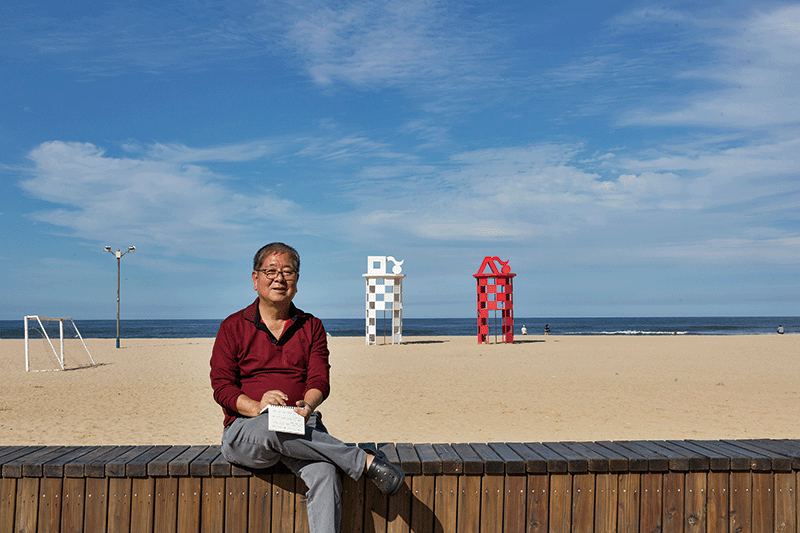
나는 요즈음 바둑을 복기하듯 변호사로서 지난 사건들을 돌이켜 본다. 칠십 고개를 넘으면서 밥벌이를 끝냈다. 그 지겨움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돈이라는 미끼에 아가미를 꿴 물고기 신세가 아니다. 업자가 공무원에게 청탁하듯 이제는 판사에게 잘 봐 달라고 사정하는 을의 입장이 아니다. 나는 서울 생활을 청산했다. 불필요한 모임이나 관계들을 청산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의 시선에서도 자유로워졌다. 바닷가의 집을 구해 살고 있다. 인생의 황혼에 얼마간의 한가와 여유를 즐기며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말이 많았던 ‘대도’라는 도둑을 변호할 때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라 바뀌어 버린 지금의 시각에서 그 일들을 되새김하고 있다. 더 이상 죄인에게 기울어진 변호사의 입장이 아니다. 세상에 대한 비평도 아니다. 그 때 그게 무엇이었던가를 무심히 다시 보는 것이라고 할까, 그냥 그때 장면들이 솟아오른다. 나는 그걸 쓰고 있다. 나의 개인적인 체험과 그때 느꼈던 생각들을 일상을 채우는 글로 기록해 둔다.
대도에 대한 항소심 공판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법원 복도 벽 아래 놓인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길쭉한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언론의 반짝 인심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 인권 소리만 나오면 세상은 흥미가 없어 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재판이 열렸다. 각진 턱의 재판장은 유명한 대법원장의 아들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맞서서 버틴 전설적인 대법원장이었다. 그 아들은 어떤 판사일까. 1심에서 인권을 얘기했다가 무참하게 재판장에게 뭉개졌다. 이상했다. 변호사로 고문받은 걸 여러 번 봤다. 그걸 법정에서 말해도 듣는 판사가 거의 없었다. 불편해했다.
“재판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하시죠” 재판장이 허락했다.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변호인은 그동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해서 수사 및 교정기관의 명예를 해치고 이 재판을 언론의 흥미성 보도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인의 그런 행동들을 단호하게 제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그 말을 듣고 나를 보며 말했다. “검사의 말에 대해 변호인은 어떤 의견입니까?”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검찰의 시각이 있다면 변호사의 시각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변증법적으로 결론으로 향하는 게 재판입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언론의 흥미성 보도자료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수사기관과 교정기관의 명예를 해친다고 매도하는 자체가 변호사의 입을 틀어 막는 검찰의 오만일 것입니다.”
내 말에 재판장이 검사를 보고 물었다. “검사는 변호인의 어떤 말이 법정에서 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교도소 내의 인권 문제와 그 안에서의 의문의 살인, 그리고 경찰의 총기 사용을 거론한 것이 그렇습니다.”
“검사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장이 이번에는 변호사인 나를 향해 말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악성을 입증한다면서 교도소 내에서의 난동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 난동의 원인이 한 재소자의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재판의 대상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한 걸까요? 저는 그 죽음을 얘기하려다가 1심 재판장에 의해 입이 막혔습니다. 재소자의 죽음을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보복이 왔습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상자같은 감방에 가두고 가죽 수갑으로 허리를 묶어 개같이 밥을 핥아먹게 하는 학대였습니다. 검사가 꺼낸 피고인의 교도소 난동과 인과관계가 있는 반론들입니다. 왜 변호사는 검사의 신문에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게 하나요? 변호인으로서 15년 전 총기사용의 남용도 얘기했습니다. 두평 짜리 좁은 화장실에 갇힌 피고인을 형사가 바로 창문 앞에서 경고도 없이 권총으로 이마를 정조준해서 쏜 걸 지적했습니다.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정당했는지 말을 해야 하는 게 변호사의 임무가 아닐까요? 그게 왜 수사기관의 명예를 해친 것이 될까요? 검사가 지금 지키려는 게 정작 무엇인지 그게 진실과 정의인지 의문입니다.”
듣고 있던 재판장이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그런 것들을 들어주는 것이 판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