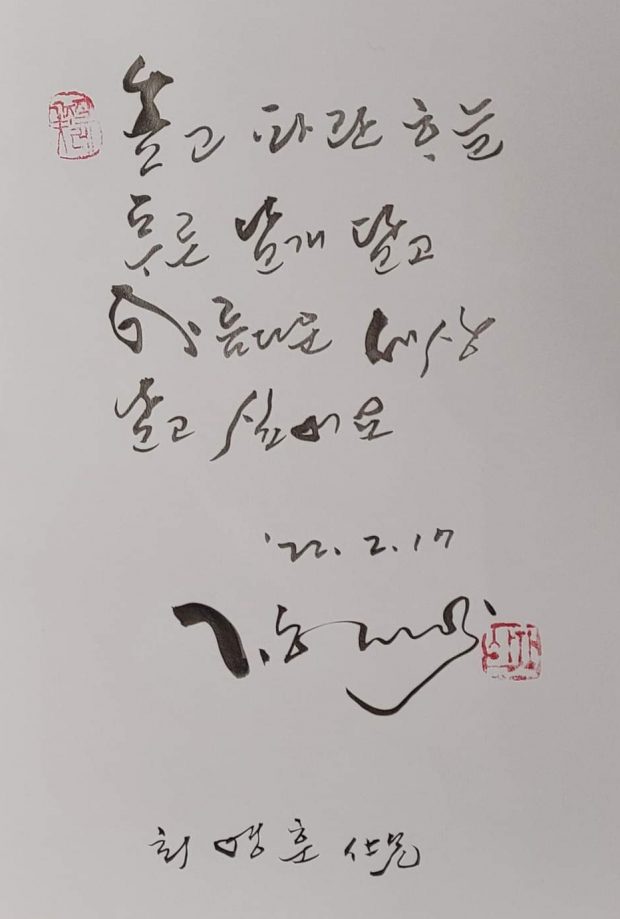[‘찔레꽃’ 소리꾼 장사익③] 2월 26일 KBS2 ‘불멸의 명곡’, 찔레꽃 등 10곡 불러

백수 너머서도 늘 똑같이 좋은 노래를
[아시아엔=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사익 형도 쳐죽일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스탭들도 많은데 2년 가깝게 제대로 공연도 못했으니…그래도 어제 정월 대보름 인사를 전화로 건네자 쾌활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봄이 와 따듯해지면 한 번 봐유~! 그러면서 불후의 명곡 본방사수를 하라”고 말했다. 사익 형은 늘 웃는 얼굴이다. 공연 때 무대에 올라서도 웃는다. 너스레를 떨다가도 감정 잡을 때만 심각한 얼굴이지 늘 웃는다. “저는 많이 웃어서 주름살이 많이 생긴 거예요. 주름 예쁘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죠. 세상 살아가는 마음가짐에 따라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애기들 네댓 명이 있는데 사탕을 선물로 주려 한다 생각해보세요. 생글생글 웃는 놈. 인상 쓰고 있는 놈, 누구
한테 주겠어요. 그게 복인 것이죠. 주름은 원래 흉한 것인데 나이 들어 ‘저 주름 아름답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방송 나갈 때 언니들이 화장해준다고 덤벼도 도망가지, 절대 안 해요. 자연 그대로가 최고예요.”
사익 형의 소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많다. 가슴을 적시는 아름다운 노랫말도 그중 하나일 거다. 그가 부른 노래 30여 곡은 전부 시를 가사로 옮긴 것들이다. 대표곡 ‘찔레꽃’과 ‘하늘 가는 길’, ‘꿈꾸는 세상’,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는 그가 직접 썼다. “나머지는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를 훔친 것(웃음)”이라고 그는 고백한다.
사익 형은 빼어난 우리말로 갈무리한 시들을 읊조리면서 곡을 만든다. 예를 들어 ‘아버지’라는 노래는 시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뮤지컬 한 편도 같기도 하다. 그 노래는 클래식 곡을 빌었고, ‘아니리’라는 판소리의 사설도 슬쩍 집어넣었다. “솔직히 다 카피죠. 그래서 나는 작곡이라는 말을 안 하고 엮음이라고 해요. 배웠던 국악, 들었던 클래식을 엮는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요.”
시를 좋아하는 것도 그의 성정과 관련이 있다. “원래 진득하니 있지를 못해 소설 같은 거 잘 못 봐요. 그런데 시는 함축성이 있잖아요. 부부 작가인 조정래 소설가와 김초혜 시인을 가끔 함께 만나는데, 조정래 선생이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5분 동안 얘기해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던 김초혜 선생이 ‘이거는 이거 아니야’라고 한마디로 함축시켜버려요.(웃음) 시인들은 단어 하나에 목숨을 건다고 하잖아요. 시에는 아름다운 시어가 있고, 깊고도 넓은 세상과 자연에 대한 체험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익 형이 문학평론을 공부했을 리 없는데 그의 시론은 본질을 꿰뚫는다. 사익 형이 시를 가사로 ‘훔쳐’ 쓰니 그의 노랫말들이 귀에 꽂혀 심장을 얼얼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중음악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클래식은 몇백년을 듣고 즐기고 있잖아요. 뭔가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를 위안해주고 즐겁게 해주니 오륙백 년의 생명력을 갖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중음악은 유행가라고 하는데 특히 아이돌 노래는 거의 생명력이 없어요. 가사 보면 뼈가 타는 이 밤이 어쩌고 그러잖아요.(웃음) ‘이 맑은 가을 햇살 속에 누구도 어쩔 수 없다. 저 빨간 감처럼 철이 들 수밖에는.’ 이 얼마나 계산 없이 단순해요. 이런 것이 기막힌 것이에요. 아이돌 스타들, 애기들 다 얼굴도 예쁘고 춤도 잘 추고 코리아 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수 이름은 알아도 무슨 노래인지는 몰라요. 본질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죠.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르고 잘 못 만들더라도 노랫말은 좋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시를 100% 차용했어요. 몇년 전 미국 가수 밥 딜런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감히 동지를 만난 것처럼 기뻤어요. 가곡들도 시를 노랫말로 많이 하지만 대중성 없이 발표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도 노래예요. 아무리 좋은 시라도 덮어놓으면 끝이죠. 시로 만든 음악이 널리 알려지고 많이 불려져야죠.”
이현주의 시를 ‘훔쳐’ 사익 형이 만든 노래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다.
바다 그리워 깊은 바다 그리워
남한강은 남에서 흐르고 북한강은 북에서 흐르다
흐르다가 두물머리 너른 들에서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아 두물머리 너른 들에서 한강 되어 흐르네
아름다운 사람아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는 이현주 목사라고 ‘도사 같은 분’이 지었다. 교회도 없이 산속에서 공부만 하며 산다. “남한강, 북한강에서 ‘남’ 자 버리고 ‘북’ 자를 버리니까 큰 한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결혼할 때 돈 보고 배경 보고 그건 백전백패잖아요. 그러나 서로의 마음만 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면 백이 되고 이백이 되고 엄청나게 크게 된단 말이죠.”
사익 형은 자신 같이 늦깎기라도 열심히 정진하면 쌓이고 쌓여 뭔가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변변치 않은 직장들을 전전하면서도 웅변을 하고 노래를 배우고 국악도 배우고 클래식을 들으니, 이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쌓였죠. 나이 마흔여섯에 노래를 하게 된 게 기적 아니에요? 집 앞부터 100m 아래까지 365일 매일 쓸고 닦아봐요. 그러면 뭔가가 나와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누가 칭찬을 하건 욕을 하건 내가 하고 싶어 한 일이니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꽃 피는 거예요.”
대기만성의 소리꾼 장사익, 그의 영원한 스승은 재즈 음악가 고 흑우 김대환이다. 내가 편집국장일 때 나는 흑우 김대환을 추모하는 소리공연(2013년 3월 1일)을 2개면을 털어 소개한 바 있다.
임희윤 기자가 빼어난 글솜씨로 한국-일본 재즈음악가들과 국악인, 춤꾼들이 한판 질펀하게 노는 것을 그렸다. 코로나로 흑우 추모공연은 3년째 불발이다. 매년 삼일절에 맞춰 13회를 진행했다.
사익 형의 의리와 인간성이 모든 출연자들에게 전파돼 재능 기부로 이들을 공연에 모이게 했다. 사익 형, 100살 너머까지 좋은 소리로 목말라 지치고 시름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소릴 불러주소! “목 놓아 울었지!”를 노래하며 소리꾼으로의 삶을 원 없이 이어가길 바라오.
오늘 신새벽, 그의 얼굴이, 고운 주름이 새겨진 형의 얼굴이 참 그리웁구나. 그의 노래 제목인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처럼 나는 사익 형을 보면 언제나 그런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