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스페셜티 인스턴트커피’와 권모술수
[아시아엔=박영순 <아시아엔> 칼럼니스트] ‘스페셜티 인스턴트커피’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단어 하나하나는 이해가 가는데 모아 놓으니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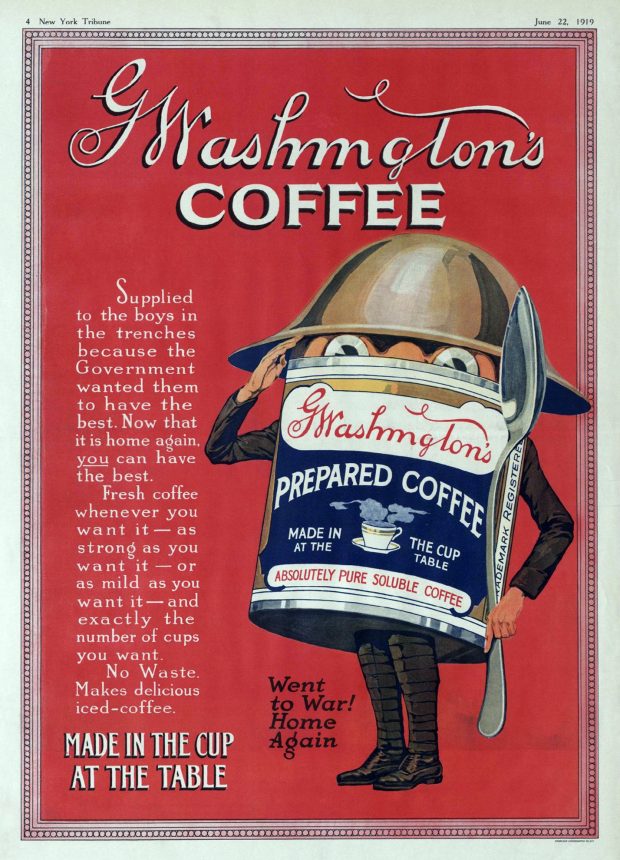
스페셜티(specialty)는 ‘스페셜티 커피’에서 따왔다. 만들어 파는 업체들도 ‘싱글 오리진’(single origin)이라는 고급스런 인상을 풍기는 단어까지 동원하며 이를 부각시킨다.
‘스페셜티’는 명사로서 독립적인 뜻을 지닌다. 이를 형용사로 보고 ‘스페셜티 커피’를 ‘특별한 커피’(special coffee)로 해석해 퍼트리는 것은 모호함만 부추기는 꼴이다. ‘스페셜티’의 정체성, 그 본질과 가치는 명료하다. 에르나 크누젠 여사가 일찍이 “재배지의 특별한 지정학적 미세기후‘(special geographic microclimates)라고 외친 바 있다.

커피나무가 자란 곳의 고유한 떼루아(terroir)를 품지 못하면 스페셜티 커피의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이런 사정은 커피를 아끼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약속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다. 그러다 보니 자격이 없는 커피들이 스페셜티란 가면을 쓰고 행세하는 권모술수가 판을 친다. 이 유령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인스턴트커피(instant coffee)는 흔히 ‘향미를 두 번 죽인 커피’에 비유된다. 국내에 시판되는 커피들은 식품공전(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4가지 중 하나에 속한다. 인스턴트커피는 추출된 커피용액을 다시 가열하거나 냉동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물에 녹는 성분만을 가려낸 것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향미가 손실됐기 때문에 ‘향미를 두 번 죽인 커피’로 풍자된다.

열에 강한 카페인은 거의 그대로 인스턴트 커피에 남아 있기 때문에 크림과 설탕을 넣어 인위적인 맛을 내 마시게 된다. 가공과정에서 향미 전구체들을 되도록 온전한 모양으로 남기기 위해 추출 온도와 시간, 수율, 압력을 섬세하게 조율하지만 맛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탓에 값싼 로부스타 품종이 인스턴트커피에 사용된다. 로부스타는 아라비카 종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2배나 많으면서도 훨씬 싸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일거양득이다. 어차피 날아갈 향인데 질 좋은 아라비카를 쓰면 가격만 올라갈 뿐이라는 소비자들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 ‘스페셜티 인스턴트커피’가 나타나 원두커피보다 비싼 값을 받겠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스페셜티 인스턴트커피가 엄청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2년 전부터 미국에서 몇 개 업체들이 만들어 팔았지만 시장이 신통치 않다. 일부 업체는 스스로 민망했는지 포장에서 ‘스페셜티’를 지우고 ‘인스턴트커피’란 글자만 남겼다. 이들 업체는 스페셜티 인스턴트커피의 향미가 원두커피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15초면 타 마실 수 있는 편리함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점을 호소했다. 반면 국내에 떠돌고 있는 유령들은 엄청난 비법이 있어 스페셜티 커피의 품격이 그대로 인스턴트커피에 담기는 것처럼 떠든다.
인스턴트커피가 원두커피가 되고 싶은 욕망은 2009년 스타벅스가 로부스타 원두만을 사용하던 전통을 깨고 아라비카 원두를 조금 갈아 넣은 비아(VIA)를 출시할 때 표출됐다. 국내에서도 비아를 따라한 인스턴트커피들이 나왔는데, 커피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로부스타 등 값싼 커피로 만든 인스턴트커피 가루를 95~97% 담고, 여기에 아라비카 원두가루 3~5%를 첨가하고는 ‘인스턴트 원두커피’라는 묘한 이름으로 10년째 내다팔고 있다.
원두커피인 척하지만 국가통계에는 인스턴트커피로 잡힌다. 명백히 인스턴트커피인 것이다. 이런 상술이 먹히는 듯 보이니까 고급화라는 미명 아래 스페셜티 인스턴트커피가 잉태됐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같은 인스턴트커피라도 품질 좋은 생두로 만들면 더 좋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스페셜티라는 명칭을 붙이겠다면 법적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심에 따라 밝혀야 할 게 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코체레(Kochere)라고 표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13만여명이 종족과 종파에 따라 여러 문화를 형성한 코체레의 커피들은 다양한 떼루아를 자랑한다.
동네나 농장명을 밝히지 않으면 애매모호해 스페셜티라 할 수 없다. 케냐 응다로이니(Ndaroin) 역시 품종만 표기한 채 AA, AB란 등급조차 적지 않는 것은 괜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응다로이니가 커피밭이 있는 땅인지, 커피를 가공하는 방앗간이 있는 곳인지, 커피를 모아 판매하는 조합을 넌지시 함축한 용어인 것이지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으면 스페셜티라는 글자를 포장지에서 지워야 한다.
사용한 커피가 수확한 지 1년 이내 것인지, 2년이 지난 패스트크롭인지, 3년이 지난 올드크롭인지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면 수확한 당해 연도의 뉴크롭이어야 하는 것은 예의이기 전에 커피를 하는 사람들의 양심이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신뢰가 떠난 자리에 문화와 예술, 지성이 꽃피울 수 없다. 커피업계에서 ‘스페셜티’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해괴한 일들이 누구 탓인지 꼬집어 밝히긴 힘들지만 모두 피해자임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