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익 칼럼] 합병된 회사의 직원과 주권 잃는 나라의 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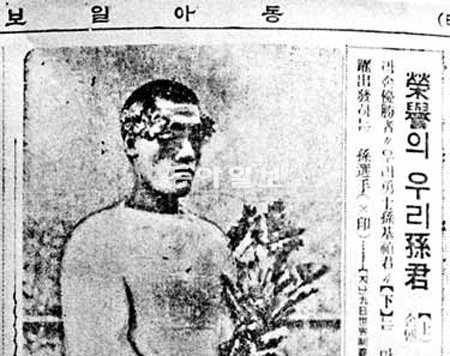
나라끼리의 합병이 되면 어떨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주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과거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못 사는 조선이 잘사는 일본과 합병이 됐었다. 가난한 조선의 여성들은 일본 집의 식모가 되는 일이 많았다. 내가 본 자료 중에 그 시대의 생생한 한 장면이 담긴 이런 내용이 있었다.
사쿠라이마치(인현동) 일본인 동네의 골목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집을 찾는 영감이 있었다. 누렇게 때에 찌든 옷에서는 독한 담배 냄새가 나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어느 일본식 목조가옥 앞에서 문패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찾았구나”
그는 경성에서 식모로 일하는 손녀를 보러 힘든 길을 올라온 것이다. 순간 영감은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영감은 문 옆의 담 아래 쭈그리고 앉아 먼발치에서라도 손녀를 보기를 기다렸다. 피곤했던 그는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다. 그 때 외출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던 일본인 여자가 웅크리고 있는 영감을 보며 불쾌한 듯 얼굴을 찡그리며 내뱉었다.
“기다나이와네(더럽구나)”
그때 동네 가게에 가서 정종을 사오던 식모가 그 광경을 봤다.
“기다와이나네”
일본인 여자는 코를 손으로 막으면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조선인 식모 아이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눈치챘다. 식모는 영감을 흔들어 깨우면서 다른 데로 가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물을 한 바께스 가져다 영감이 있던 자리에 끼얹고 솔로 쓸고 닦았다. 그걸 확인한 후에야 일본인 여자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잠시 후 쫓겨갔던 영감과 그를 쫓았던 식모아이가 동시에 달려들어 와락 얼싸안고 울부짖었다.
“순이야”
“할아버지”
합병된 조선의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조선이나 만주로 이주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엽전은 때려야 한다’는 말이 돌았다. 그 시대의 풍경이다. 일본인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배경에는 ‘조센징’이 있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점점 차별이 심해진 것 같다.
“피고인 최린은 한일합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이 힘이 없어 일본의 땅이 되어 버린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병 당시 조선의 정치는 혹심한 악정이었습니다. 조정은 도저히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일합병에는 반대였지만 한편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일합병 후의 일본제국에 대한 불만이 뭔가?”
“일본 정치가는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것과 다릅니다. 일본을 높이고 조선을 천대하는 주의입니다. 조선을 위압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경제상으로 보더라도 일본에 이롭고 조선에는 해롭습니다. 우리 조선사람은 4000년 역사를 가지고 독립된 말과 글이 있는 문화인으로 다른 민족에게 통치를 받을 만큼 뒤떨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시의 재판기록을 보면서 그의 법정 발언이 당시 현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나라를 잃은 것을 통탄하지만 무능한 조선이 없어진 것은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40여년 전 변호사 실무 수습을 받을 때였다. 나를 지도하는 아버지 또래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일본군에 징집되어 중국의 소주 항주까지 끌려 갔었어요. 해방이 되고 그곳에서 서울까지 걸어왔어요. 옷이 없어 일본군복을 그대로 입은 채 고시장에 갔었죠. 못났더라도 자기 나라가 있는 게 좋아요.”
그가 몸으로 체험한 나라의 필요성이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먼 훗날의 독자들을 위해 글로 남겨두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