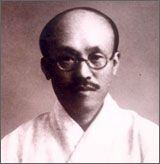[엄상익 칼럼] 구한말 홍명희·김성수·김연수의 사랑방 정국담
나는 몇년 동안 역사를 공부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학자나 전문가들이 정한 레시피로 만든 역사요리가 식성에 맞지 않았다. 나는 원재료를 구해 일단 있는 그대로 보고 싶었다.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가서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자서전도 많이 대출받아 읽었다. 지하서고에 있던 이광수의 자서전은 만지면 오래된 종이가 바스러질 정도였다. 홍명희, 송진우, 김성수 등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읽었다. 오늘은 이런 단편적인 장면을 들여다 봤다.
1907년경 일본의 대성중학에 다니는 홍명희가 금산군수인 아버지 홍범식과 함께 줄포에 사는 고창갑부 김경중의 집으로 놀러갔다. 가까이 지내는 집안이었다. 아버지 끼리 사랑채에서 주안상을 앞에 놓고 말하는 사이에 홍명희는 세살 아래인 그 집 아들 김성수와 동생 김연수 형제에게 한양과 일본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먼저 아버지들이 있는 방의 광경을 들여다 본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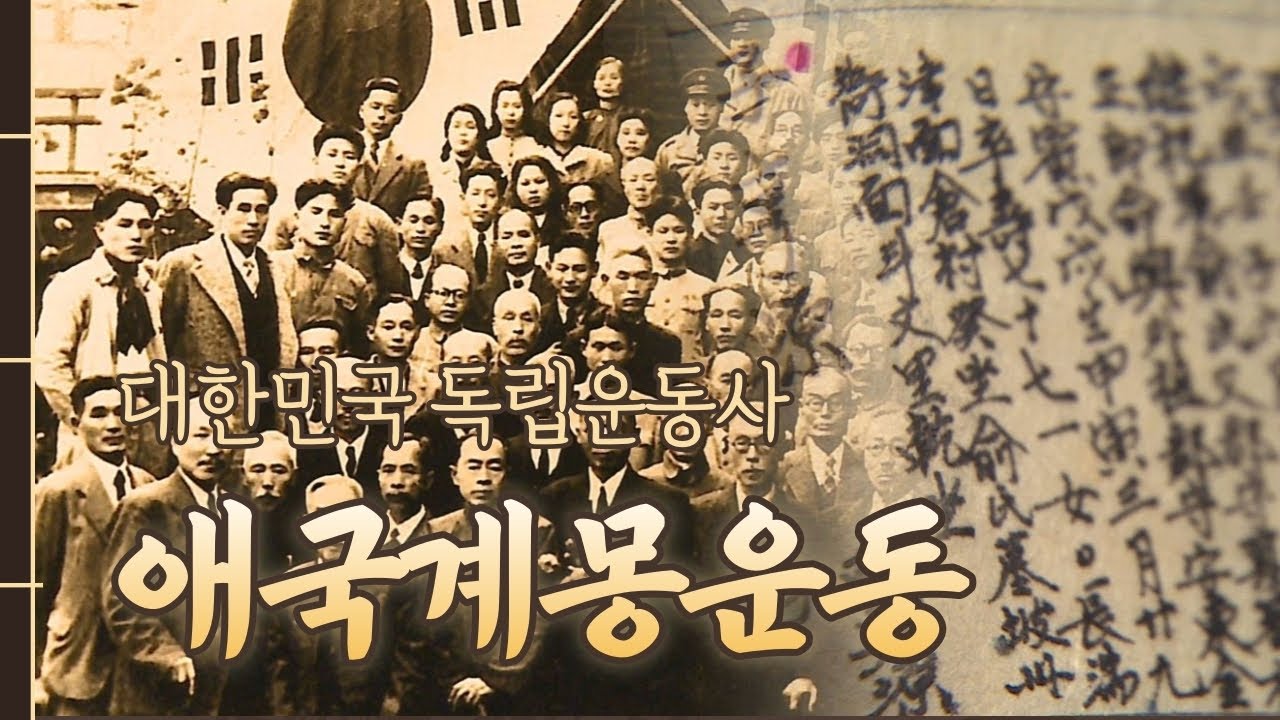
고창갑부 김경중이 금산군수 홍범식에게 물었다. 두 사람 다 시대적인 자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김경중은 호남학회의 재정을 지원하고 영신학교를 세워 애국계몽운동에 동참하는 입장이었다.
“아들 명희가 이번 방학에 돌아오더니 하는 소리가 일본에서는 대한제국을 명목상 존속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병합해야 하느냐에 대해 정치인들이 의견이 갈리고 있답니다.”
“남의 나라를 놓고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고종황제께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냈지만 어느 나라도 일본의 지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랍니다. 게다가 우리를 도울 줄 알았던 러시아도 등을 돌리구요.”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일본의 관심을 북쪽으로만 돌려 미국 식민지인 필리핀으로 남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군요.”
“그러면 곧 일본과 한국의 병합이 이루어질 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글쎄올시다. 독립협회 일부와 동학의 일파를 합쳐 송병준이 일진회를 만들었는데 일진회는 연방제 형태의 합방을 주장한다고 그러더군요. 조선을 미국처럼 일본의 한 주가 되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토 통감은 합방보다는 청나라가 우리를 조공국으로 했듯이 보호국 정도로 하자는 입장을 취하면서 일진회와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소문으로는 완전 병합을 주장하는 일본 군부가 뒤에서 일진회를 조정한다는 말도 들립니다만.”
“한양에는 활동사진이 있는데 원숭이가 물장난을 하는 것도 있고 춤추는 여자도 있어. 동대문 전기회사 마당에 있는 목재 적치장에 앉아서 그 회사에서 틀어주는 활동사진을 봤어. 한양의 길가에는 훤하게 등불이 있어서 밤도 낮 같아. 한강에 철다리도 있고 신식 군악대도 있어.”
김성수 형제는 넋을 잃고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중학생 홍명희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 집에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가 들어있는 병풍이 있어. 거기 보면 조그만 땅이 일본이고 큰 덩어리가 중국이야. 그 병풍에 어려서부터 먹칠을 하면서 놀았어. 세상에는 조선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지. 아버지는 일찍부터 서양문물을 배워야 한다면서 나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셨지. 김성수 김연수 너희들은 <사서삼경>이 전부인 줄 알지만 동경의 서점가에 가면 러시아 문학작품도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의 작품도 있어. 일본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글도 있고 무정부주의자 크로포트킨의 <빵의 약탈>도 있었어. 아무튼 거기에는 서양소설이 많아. 나 말고도 그런 서양소설을 아주 많이 읽는 친구가 있어. 하숙집 근처 공중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난 이광수야. 어린시절 고아가 되어 우여곡절 끝에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된 친구야. 내가 사서 다 읽은 책은 전부 그 친구에게 줬어. 참, 나하고 친한 최남선이도 1904년 유학을 왔어.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잔 건 최남선 집이 처음이야. 아주 좋은 친구야. 내가 이광수를 최남선에게 소개했어. 앞으로 우리 세 사람이 습작한 작품들을 모아 문집을 낼 거야.”
기록 속에서 나는 순수한 시대적 질감을 음미했다.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 있는 그대로 한번 보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