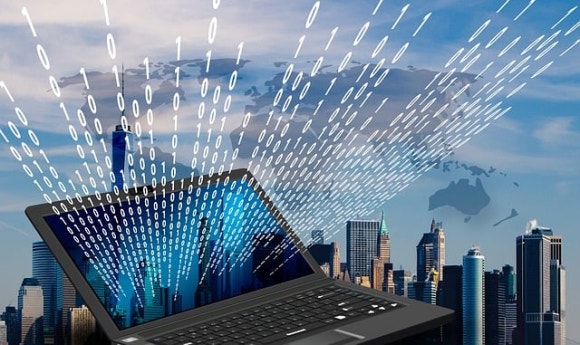[대도 조세형22] 언론에 뜨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로…

아직 젊던 40대 시절 나는 대도사건을 처리하면서 언론의 속성을 조금은 알아차렸다. 감옥 안의 학대와 죽음을 고발해도 일부의 따뜻한 기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얼음처럼 찼다. 그들은 세상의 폭우를 흠뻑 맞은 나와 대도를 재미있어 하는 것 같기도 했다.
‘거지와 도둑’으로 살아온 대도는 다른 우주에 살던 외계인이었다. 그는 도덕과 상식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그가 석방되자 세상은 갑자기 그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강한 스폿라이트를 비치면서 성인군자의 모습으로 연출하려는 것 같았다.
그가 석방되는 날 밤 그가 묵는 노숙자시설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촬영팀이 들이닥쳤다. 그 시설이 갑자기 영화촬영장으로 바뀐 느낌이었다. 조명이 설치되고 카메라의 검은 렌즈가 대도를 따르고 있었다. 여러 명의 스탭을 지휘하는 피디가 마치 점령군 장군 같은 느낌이었다.
“이 시설을 촬영해서 그림을 만들고 말이야. 대도가 첫날 밤 창을 통해 밖을 보는 광경을 찍어” 피디가 카메라맨에게 명령했다. 그는 대도에게 몇 번씩 창문 밖을 보도록 요구했다.
“다음에는 석방된 첫날 밤 자기 전 장면이야. 대도를 바닥에 앉히고 그걸 찍어.” 피디의 명령에 스탭들이 이불을 깔고 대도를 그 위에 앉게 했다.
“야, 어디서 성경 좀 가져와라” 피디가 다시 말했다. 스탭진이 낡은 성경을 가져와서 대도의 손에 쥐어 주었다. 피디가 대도에게 지시하듯 말했다.
“성경을 몇 페이지 읽다가 잠자리에 들어가쇼. 참 돋보기를 쓰고 보는 게 그림이 좋겠네. 누가 돋보기 구해와라.”
스탭진이 돋보기를 구해와 대도에게 씌웠다. 그렇게 밤이 늦어지고 있었다. 대도가 혼란스럽고 피곤할 것 같았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캇, 엔지” 피디가 소리쳤다. 피디가 대도를 보면서 짜증을 냈다. “이봐, 눈꺼풀이 움직이면 안되잖아? 다시 해”
나는 불쾌해 지기 시작했다. 내가 피디에게 말했다.
“15년 동안 징역을 살고 오늘 나온 사람입니다. 다음에 촬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방송 일정이 있고 내가 편집을 해야 하니까 안돼요.”
피디가 그렇게 말하면서 대도에게 내일은 구치소쪽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다. 그곳 그림이 몇 장 필요해서 찍는다고 했다. 나는 자신의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명령조인 피디를 보면서 오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과연 고통에 공감하고 인권에 관해 가슴에 스며드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그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나는 촬영을 단호히 거절했다.
며칠 후 방송국의 작가가 내게 전화를 걸어 저주 같은 말을 했다.
그 며칠 후 한 시사잡지의 기자가 내게 전화를 했다. “대도 인터뷰 해드릴게 한번 데리고 나와요.”
봐준다는 말투 같아서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봐줄래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해줘야 맞았다. 이제는 안봐줘도 됐다.
“안 하겠습니다.” 내가 거절했다.
“왜요? 우리 매체의 영향력보다 더 큰 데가 있습니까?” 그 기자는 납득할 수 없다는 어조였다.
“하여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언론이 보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늘에 묻힌 한 재소자의 한 서린 죽음이었다.
나는 그걸 자세히 써서 시사잡지 <신동아>에 이미 기고했다. 그게 불이 붙지를 않고 있었다. 대도가 애초에 내게 요구했던 것도 자신의 자유보다 그것이었다. 그런데 세상은 대도가 석방되자 엉뚱한 오락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다. 언론이 오히려 그를 오염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