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근 칼럼] “보수가 진보를 낳고, 진보에서 새로운 보수가 태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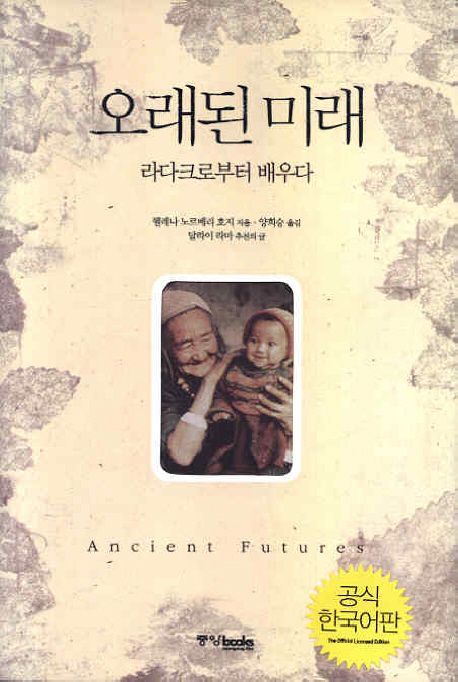
“라다크(Ladakh) 사람들은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많이 늙었네요’라는 말을 예사로이 주고받는다. 그들은 나이 드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마치 겨울이 봄으로 이어지듯, 삶의 모든 단계는 각기 나름대로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여성 인류학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가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s)라는 책에 쓴 글이다.
히말라야 고원의 원시 마을 라다크에서 16년 동안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한 노르베리-호지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문명의 허상을 깊숙이 해부, 비판하면서 인류사회의 미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오래된 미래>는 ‘생태환경의 바이블’로 불린다.
?머나먼 과거(ancient)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future)는 서로 만날 수 없는 단어들이다. 그 어울리지 않는 두 낱말을 노르베리-호지는 놀랍게도 ‘오래된 미래’라는 하나의 세계 안에 묶어냈다. ??
“보다 영적(靈的)인 삶을 추구하는 노력은 자연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 우리들 서로의, 우리와 지구 사이의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생명의 상호연관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이다… 나는 라다크에서 삶의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르베리-호지의 초(超)시간적 통찰은 ‘작은 티베트’라고 불리는 라다크의 원시적인 삶에서 태어났다. 밖에서 들어온 현대문명이 아닌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으로 소박하게 이어온 라다크의 자연친화적 삶에서 노르베리-호지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오래된 미래’의 역설을 마치 계시(啓示)처럼 깨달았다. ‘옛것의 창조적 회복’에 담긴 희망의 미래를…
서양인만이 아니다. “만나는 것마다 옛것이 아니니, 어찌 빨리 늙지 않으랴(所遇無故物 焉得不速老)” <세설신어(世說新語)>에 실린 왕효백(王孝伯)의 정신 아찔한 글귀다. 옛것이 아니라 새것이 사람을 늙게 만든다는 뜻이라면, 상식을 송두리째 뒤엎는 당착(撞着)이 아닐 수 없다. 역설의 비의(秘義)가 날카롭기 그지없다.
?헤브라이즘에서 잉태된 성서도 “해 아래 새것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서구 문명의 뿌리인 헬레니즘의 본거지 아테네를 향해 “가장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는 일 말고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통렬히 꾸짖는다(사도행전 17장).
“인간이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철학자 헤겔의 탄식이다. 시간의 흐름은 역사를 이루지만, 인간은 시간성보다 공간성에 더 민감한 편이다. 근원의 옛 자리를 돌아보지 않고 늘 비어있는 공간을, 새로운 자리를 찾으려고 허둥댄다.
?그래서 역사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조차도 공간적인 개념을 빌려 쓰곤 한다. 어느 인문학자의 책에서 읽은 예(例)인데, 영어의 thereafter는 ‘그다음’, always는 ‘언제나’라는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데도 there(거기), way(길)라는 공간적인 용어를 끼워넣고 있다. 역사의식의 빈곤을 나타내는 징표 아닐까.
중세의 암흑을 걷어낸 종교개혁자들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Ad Fontes)을 목표로 삼았다. 21세기의 우리는 아직도 수백 수천 년 전의 고전들에서 퍼내고 또 퍼내도 다함이 없는 지혜와 소망의 맑은 샘물을 길어 올린다. 우리의 미래는 그 미래에 달려 있지 않다. 저 오래 묵혀진 옛것의 창조적 회복에 달려 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 넘어져 그 상처 입은 몸을 햇빛에 드러내면, 우리는 이윽고 묘비처럼 찬연한 그 본래의 그루터기에서 나무의 전 생애를 읽어낼 수 있다.” 헤르만 헤세가 읊은 <나무들>(Baume)이다.
늙어 베인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지난해 가을에 담가둔 김장김치가 새봄의 식탁에 오르듯, 오랜 삶을 겪어온 옛것에서 새로움이 움터온다. 구닥다리 낡은 것에서 ‘오래된 미래’의 싹이 돋아난다. 지나간 시대의 빛나는 정신을 오랜 세월에 걸쳐 묵히고 삭힌 ‘옛것의 창조적 회복’이 미래의 희망을 펼쳐간다.
?온 나라가 보혁(保革)의 두 쪽으로 갈라져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보수나 진보의 진정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보수를 외치는가? 옛 거인들의 어깨에 매달려 자생력(自牲力)을 잃어버리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온실 속 여린 꽃’이어서는 안 된다. 역사와 전통의 밑거름 위에 피어난 보수는 칼바람 맞으며 황야를 뒤덮어가는 야생화가 되어야 한다. 그 선구적(先驅的) 모범에 보수의 가치가 달려있다.?
진보를 부르짖는가? 미래를 내다보되 역사의 광채에 담긴 교훈, 전통의 빛이 밝히는 지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변화와 혁신을 외치면서도 역사적 책임과 공동체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는 상생(相生)의 윤리가 진정한 진보의 가치다.
?보수의 가치를 망각하면 수구(守舊)의 나락에 떨어지고, 진보의 가치를 저버리면 윤리적 파탄에 이르게 된다.? 보수든 진보든, 공공선(公共善)을 위한 희생의 각오와 치열한 반성이 없다면 모두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해 아래 새것이 없으니, 이미 있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다…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전도서 1:9, 3:15) 옛 유대의 현인이 깨우친 역사의 비밀이다.
?평생 풀만 뜯어먹는 소가 어떻게 큰 힘을 지니는가? 반추(反芻)하기 때문이다. 그 되새김질이 보수를 보수답게, 진보를 진보답게 만드는 열쇠다. 진보는 세상에 없는 가치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옛것의 지혜에 새로운 눈을 뜨는 것이다.
보수가 진보를 낳고, 진보에서 새로운 보수가 태어난다. ‘오래된 새로움’의 탄생이다. 오래 묵은 옛것의 되새김’ 속에 참다운 새로움이 있다. 이것이 옛것과 새것의 변증법이다.
?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