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익 칼럼] 계층상승 사다리와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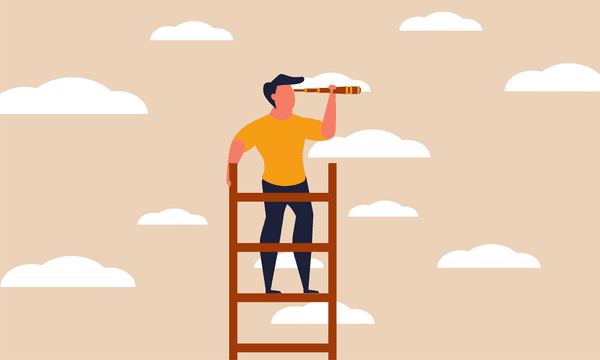
얼마 전 시청율이 높았던 학폭 드라마가 있었다. 부자집 아이들이 특정한 아이에게 집단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내가 학교를 다니던 1960년대도 다르지 않았다. 재벌집 아들 중에는 좋은 아이도 많지만 일탈한 존재들이 더 눈에 띄었다. 드라마처럼 나는 칼에 맞은 피해자였다. 선생들은 재벌집에 맥을 추지 못했다. 재벌집 아이를 덮어주기 위해 사실을 조작해 피해자인 나까지 무기정학에 처했다.
나는 불공정과 불의를 일찍 몸으로 체험했다. 복수하고 싶었다. 청계천 어두운 뒷골목에서 파는 사상서적을 사다가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은 자본주의는 카스트보다 더 심한 계급사회라고 알려주었다. 부자 위에 재벌이 있고 부자도 수많은 급이 있었다. 사상서적이 말하는 혁명은 내가 가담하기에는 모래알 하나를 주워 성에 던지는 것 같이 너무 무모한 것 같았다. 내 능력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고시제도가 있었다.
합격을 하면 재벌 앞에서도 당당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다. 한 인간에 대한 국가적 인증이기 때문이다. 핏줄과 상속으로 지위를 얻은 그들보다 나을 것 같았다. 산 속 암자에서 고시공부를 시작했다. 고시는 자격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문이 열려 있었다.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노동자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그 누구나 시험에 합격하면 20대에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로또같은 제도였다. 합격을 하고 권력을 잡으면 재벌 회장들도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가 죽었다. 재벌이 큰소리 쳐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관리가 된 사람들 앞에서 눈치를 봤다. 지독히도 가난한 집 아들들의 고시도전을 옆에서 봤다.
넝마주이를 하다가 검사가 된 사람을 봤다. 폐지를 주으러 다니면서도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했다. 막노동이나 학원강사로 생활비를 벌면서 고시공부를 하기도 했다. 집 뒤의 토굴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개천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한계선을 넘은 사람들은 응집했다. 행시, 사시 기수별로 조선의 사림같은 조직이 형성됐다. 그들은 뇌물이나 출세로 움직여지는 그룹이 아니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적과 사명감이 있었다. 대통령과 대재벌에게도 조직적으로 맞설 수 있었다.
친한 선배가 높은 법대 위에서 정주영 회장을 재판하는 장면을 봤다. 그의 아버지는 양철 도시락을 싸들고 고무신 신고 출근하던 분이었다. 세상은 그렇게 변화해야 사는 맛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대리만족을 하기도 했다.
그래도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것 같았다. 돈에 의해 의회가 지배되는 걸 봤다. 한 재벌 회장은 내게 아들이 하도 말썽을 피워서 전국구 의원 자리 하나를 사줬더니 조용하더라고 했다. 그들에게 금뱃지는 그런 장난감인지도 모른다. 학교 시절 스포츠카에 여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던 재벌 2세가 박수를 받는 화려한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한 재벌회장은 국회의원 한명 당 몇십억씩 주고 사모아서 당을 하나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아예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될 뻔했다. 그들의 잔치에 전혀 다른 이질적 세력이 섞여들기도 했다.
상고 출신 노무현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인 홍준표와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후보가 되기도 했다. 고시 낭인이던 윤석열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됐다. 고시제도가 없었으면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기가 죽은 가난한 집 아들들의 희망이었던 게 고시제도이다. 그게 지금은 없어졌다. 고시 낭인을 없애기 위해 제도를 없앴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한 줌의 시샘이나 배 아픔이 없었을까. 이제 인터넷신문에서 ‘사시 출신에게 수모 안 당한 재벌총수 없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재벌들은 누구에게도 수모를 준 적이 없을까. 세상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른 것 같다.
일방적으로 한 계급만이 독주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가난으로 졸업장이 없어 주눅들어 사는 사람도 숨통이 트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나는 그게 없어진 고시제도였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