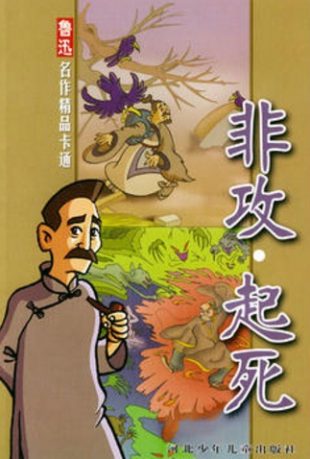[석혜탁의 독서칼럼] 장자의 호루라기, 루쉰의 호루라기
루쉰의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起死)>
非攻, 起死 모두 <고사신편(故事新編)>에 수록되어 있다 ?河北少年?童出版社
[아시아엔=석혜탁 <아시아엔> 트렌드 전문기자] 루쉰의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起死)>는 희곡형식을 차용하여 전개되는 짤막한 작품이다. 약 오백 년 만에 되살아난 사내는 자신의 보따리와 우산이 없어졌고, 심지어 옷도 없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임을 알게 된다. 친척을 찾아가야 했기에 옷과 보따리가 꼭 필요했던 그는 장자에게 자신의 짐을 돌려달라고 한다.
당장 제 몸을 가릴 옷도 없는 사내에게 장자는 “죽어 마땅한 어리석은 자”, “정말 철저한 이기주의자”, “철리(哲理)도 모르는 야만인”이라고 외려 면박을 준다.
민중의 ‘지금 여기’에는 무관심한 장자(莊子)
발가벗겨진 상태라서 친척집에 가야 하는 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내에게 장자는 당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캐묻고, 잠시 앉아서 주왕(紂王) 시절 이야기나 좀 해달라고 한다. 참 한가하기 그지없다. 이 대목에서 한국 위정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민중의 갈급한 요구에 둔감한 엘리트 지배계층의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가 보다.
장자를 포함하여 중국이 전 세계에 당당히 자랑하는 대사상가들과 아시아의 지식인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었던 중국의 인문철학이 정작 민중의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자신의 몸도 못 가려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에게 장자는 다시 한 번 한가롭기만 한 소리를 되풀이한다. “옷이란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게야. 옷이 있는 게 옳을 수도 있고, 옷이 없는 게 옳을 수도 있지. 새에겐 깃털이 있고, 짐승에겐 털이 있지만 오이나 가지는 벌거숭이잖아. 이것이 이른바 ‘저것도 하나의 시비(是非)요, 이것도 하나의 시비’라는 거지. 물론 옷이 없는 것을 옳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옷이 있어야만 옳다고 당신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이게 배운 사람이 할 소리인가? 이 글을 읽고 필자가 느낀 감정을 사내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다.
“(화를 내며) 니에미 나발 불고 있네!”
루쉰은 이른바 장자 사상의 ‘무시비관(無是非觀)’에 비판적이었다. 1930년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자주 운위됐던 무시비관은 루쉰의 입장에서는 냉철한 이성주의적 사고와 명료한 과학정신에 반하는 것이었다.
작품을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되지만, 장자는 “오이나 가지”가 될 마음은 없어 보인다. 또한 “옷이란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옷이 있어야만 옳다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장자는 “옷이란 본래 내 것이랄 것도 없는 법”이라면서도 초왕을 알현하러 가는 길이라서 사내에게 벗어줄 수 없다고 냉정하게 되받아친다. 자신이 내뱉은 말을 너무도 태연하게 배반하는 지독한 자기모순이다.
민중에 고통을 가하고 기성논리에 복무한 보수적 이데올로기
민중의 현실과 담을 쌓은 채 고답적인 논리를 주문처럼 반복하고, 현실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도가적 관념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동시에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린 것이라는 허무한 논리는 현실순응인 동시에 현실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부조리한 현실은 회피하고, 부당한 현실권력에는 얌전히 순응하는 것. 이런 무책임한 관념론은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고, 개혁과 저항을 차단하며, 비판과 성찰을 실종시킨다. 결국 지배층의 기존질서에 철저히 복무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것이다.
권력을 호출하는 도구: 호루라기
사내가 장자의 옷이라도 벗겨 지금의 상황을 모면해보고자 장자에게 달려드니, 장자는 호루라기를 꺼내 세 번을 분다. 그것도 “미친 듯이” 불어댄다. 참 “장자의 꼴이 말이 아니다.”(중문학자?유세종 교수의 평)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자 순경이 출동하고, 장자가 치위안(漆園)의 관리라는 사실을 알고는 장자를 깍듯이 대한다. 순경은 사내에게 시끄럽다며, 더 이상 귀찮게 하면 서로 끌고 갈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는다. “대추 두 근에 설탕 반 근”을 꼭 찾아야 하는 사내가 이젠 순경에게 달려들자, 순경은 직전의 장자마냥 호루라기를 또 다시 “미친 듯이”불어댄다.
여기서 작품은 끝나지만, 호루라기 소리로 인해 또 다른 권력이 호출될 것이다. 이 권력은 전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분명 사내를 ‘진압’하는 데 더욱 애를 쓸 것이다.
민중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안위를 지켜내라고 부여된 ‘권력’은 이렇듯 너무도 자주 그리고 거칠게 오용되곤 한다. 권력의 맨얼굴과 생리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 루쉰은 호루라기를 “미친 듯이” 불어댔으리라.
필자가 상하이에 위치한 루쉰기념관에서 찍은 사진 ?석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