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혜탁의 리테일 트렌드-센트마케팅②] 핸드메이드 화장품 ‘러쉬’, 향수의 ‘매혹’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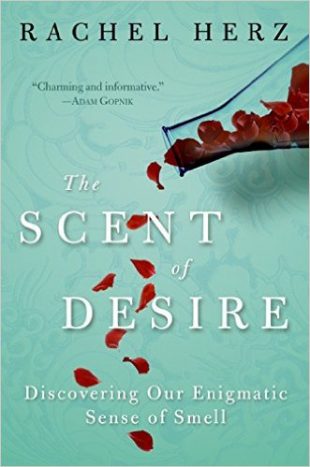
러쉬의 고위 관계자가 2014년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에 한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향기는 고객을 매장 안으로 이끌고, 이는 우리 브랜드의 주요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는 향기가 고객을 압도하는 것(overwhelm the customers)은 원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은은하고 자연스레 스며드는 향을 만들어야지, 본말이 전도되면 되레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 ‘절제의 미학’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의 지적처럼 올바른 향기(correct smell)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각 브랜드 컨셉에 어울리는 향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욕망의 향기>(The Scent of Desire, 국내에는 ‘욕망을 부르는 향기’로 번역되었음)의 저자인 심리학자 레이첼 허즈(Rachel Herz) 브라운대 교수는 맞지 않는(어울리지 않는) 향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예 향기가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일갈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블룸버그 비즈니스>(Bloomberg Business)는 “향기가 기억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판매도 증진시키기에 전통적인 산업군에서 센트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은 이젠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은행을 위시한 금융산업에서도 향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센트 마케팅은 이제 산업과 업태를 가리지 않고 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Patrick Suskind)의 소설 <향수>의 주인공 장 바티스트 그루누이의 예민한 후각이 마케팅 담당자에게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루누이가 자신의 천재적인 후각으로 존재증명을 하려고 치열하게 애썼던 것처럼 기업도 자신들만의 매혹적인 ‘향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어법을 빌리자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이끌어 내는 힘”이 있는 기업만이 소비자에게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