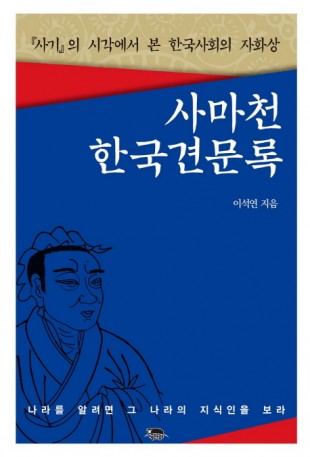‘사기’로 진단한 대한민국···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연재를 시작하며
<아시아엔>은 우리 시대 대표적인 행동하는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사마천 한국견문록>을 연재합니다. 이 책은 위대한 역사서이자 문학서인 <사기>를 텍스트로 해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재물은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 아래 원문을 대부분 그대로 옮겼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조선의 성종成宗은 학문을 장려한 군주였다. 유능한 관료들을 골라 공무에서 벗어나 초야에 묻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적이 있다. 그 혜택을 받은 선비였던 유호인兪好仁은 몇몇 동료들과 송도 개성기행을 떠난다. 그때 행장에 가장 먼저 챙긴 책이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였다. 고려 인종때 학자로 강좌칠현江左七賢의 한 사람으로 불렸던 임춘林椿은 강원도 동해안을 유람하면서 사마천을 닮고 싶은 심정을 글로 남긴다. “옛날 사마천은 천하를 두루 주유함으로써 생각이 더욱 옹골차고 문장이 활달하게 되었다. 이렇듯 무릇 대장부라면 널리 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주름잡는다면 가슴 속 큰 뜻을 넓히게 되리라.”
조선의 천재 문장가인 연암 박지원 문장의 기운이 그렇게 활달하고 웅혼했던 것은 바로 사마천의 <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박종채 <나의 아버지 박지원 과정록過庭錄>)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이끌던 정조正祖는 정약용 박제가 등에게 명하여 <사기>의 내용 가운데 통치와 백성의 교화에 귀감이 될 만한 부분을 발췌하여 <사기영선>史記英選을 편찬하였다.
세월을 훌쩍 넘어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은 고백한다. “온 생의 무게를 펜 하나에 의지한 채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이웃 중국 일본에서도 각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들의 <사기>에 관련된 일화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사기>는 시공을 초월하여 지식인들에게 영감과 의욕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지금도 인류의 지적정신사에 유무형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부터 2100년 전 사마천에 의해서 복원된 <사기>에는 인간으로서 경험 가능한 것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이 담겨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사기>는 위대한 역사서이기에 앞서 뛰어난 문학서이고 사마천은 역사가이기에 앞서 탁월한 문장가다. 절대권력 앞에서 바른 말을 한 죄로 황제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 생식기를 절단당하는 궁형宮刑에 처해지는 치욕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살아남아 <사기>의 집필을 끝내고 홀연히 사라진 사나이다. 그의 기구한 인생역정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나를 매료시키고 있다. 오늘도 나는 <사기>의 한 부분을 펼치고 있다.
사마천은 역사는 언제나 정의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의 기구한 처지에 빗대어 갈파하고 있다. <사기> 전편 본기本記 표表 서書 세가世家 열전列傳 등 130편, 52만6500자에 사마천의 인간에 대한 고뇌가 묻어있다. 내가 삶의 역경과 선택의 순간에 사마천을 생각하고 그에게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래 전부터 나는 사마천이 한국사회를 본다면 어떻게 기록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기>의 내용을 새로이 반추해봤다.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에 이르기까지 <사기>의 시각에서 본, 즉 사마천의 눈으로 본 한국사회의 자화상이 궁금했던 것이다. 이 책 <사마천 한국견문록>은 바로 그러한 시각에서 본 사유의 산물이다. 하지만 집필하는 과정에서는 사마천뿐만 아니라 때로는 동서고금 인물들의 시각에서도 한국사회를 조명하였다.
궁극적으로 비록 지난한 일이기는 하지만 공정함과 정의가 국민적 삶의 올바른 가치로 정립되고 그리하여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뚜벅뚜벅 정도를 걷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대접받는 한국사회를 꿈꾸면서 이 책을 썼다고 말하고 싶다.
사마천의 <사기>는 깊은 숲과 같다. <사기>에 담긴 사상의 원칙을 한글자로 요약하라면 나는 ‘직直’이라고 말하겠다. 한자 ‘直’은 ‘곧다 바르다’를 뜻한다. ‘直’은 ‘十열 십’과 ‘目눈 목’과 ‘?숨을 은’의 합자合字로 열 개의 눈으로 숨어 있는 것을 바르게 본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 ‘열개의 눈’이란 어느 한 곳에 고착된 편벽한 시선이 아닌 만물의 변화와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폭넓은 시선에 대한 은유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명한 물처럼 모든 것을 비추고 있지 않다.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어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직直’의 정신은 허위를 찌르는 ‘창槍’과 같다. 바른 것을 바르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일격一擊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다. 내가 ‘거짓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악을 숨기지 않는다’(不虛美不隱惡)는 사마천의 <사기> 집필의 정신을 견지하려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헛된 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악을 용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직直’의 혜안이며 사마천이 <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세계관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의 숲은 넓고 깊었다. 그 숲에 깃든 한 마리 새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전전긍긍할 때 나는 연암 박지원의 글에서 힘을 얻었다. 연암은 사마천이 <사기> 를 쓸 때의 마음을 ‘나비를 잡는 아이’에 비유했다. 연암은 “앞무릎을 반쯤 구부리고 뒤꿈치는 까치발을 하고 두 손가락은 집게 모양으로 내민 채 살금살금 다가간다. 손끝이 나비를 의심하게 하는 순간 나비는 그만 싹 날아가 버린다. 사방을 돌아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자 아이는 웃고 간다. 부끄럽고 한편 속상한 마음인 것이 바로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의 마음”이라고 했다.
사마천이 놓친 나비는 바로 <사기>다. 그 나비가 연암에게로 날아왔을 때 연암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사마천이 살던 때와는 다르니 “반고班固나 사마천이 만약에 다시 살아나온다 하더라도 결코 반고나 사마천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연암은 사마천의 정신을 읽지 않고 그의 문장만을 흉내내는 당시의 세태를 ‘사마천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비판을 했다.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다면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연암의 생각이다. 연암은 사마천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마천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마천이 지금 한국사회에 살아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그래서 책의 제목을 <사마천 한국견문록>이라고 정했다. 미지의 깊은 숲처럼 펼쳐진 <사기>의 세계를 탐방하고 그것을 현실의 세계에 적용하려는 나의 의지를 ‘견문록’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독서란 저자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마천이 일군 <사기>의 영토를 ‘탈脫영토화’ 해서 나의 영토로 만드는 것이 <사기>의 바른 독법이라 생각한다. 내가 사마천이 되는 것 그 동화同化가 비록 미흡할 지라도 그러한 노력이 사마천의 정신을 현실 속에서 온전히 살려내는 길이다.
<사마천 한국견문록>은 <사기>라는 텍스트를 통해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제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작은 출발의 일환이기도 하다. ‘악惡의 평범성’의 만연과 세월호사건, 직언이 없는 정치, 곡학아세하는 지식인, 대권쟁취자들의 고질병, 존경할만한 원로가 없는 사회, 변절이 미화되는 세태, 일관성이 없는 법치 등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는 제반현상을 <사기>의 원문을 토대로 그 해법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 <사마천 한국견문록>을 출간하게 된 또 다른 의도다.
<사기>를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용해서 책을 한번 써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대가 된다는 말과 함께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던 주변지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사기> 번역과 연구의 전문가들로서 오랫동안 교분을 나누어 온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김원중 교수님과 100여 차례 가까이 중국을 오가면서 중국과 사마천을 연구하고 있는 김영수 전교수님의 후의와 도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한편 이 책에서 인용한 <사기> 번역문의 경우 주로 김원중 교수의 <사기> 완역본을 토대로 하였음을 밝히면서 동 교수께 거듭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은 각장마다 독립된 내용이므로 어느 장부터 읽어도 무방하다는 점을 부기한다.
나의 일천日淺과 부족이 독자들의 혜안慧眼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2015년 초여름 서초동 ‘동림각東林閣’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