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일의 시선, 시인 이동순의 ‘나직이 불러보는 이름들’에 머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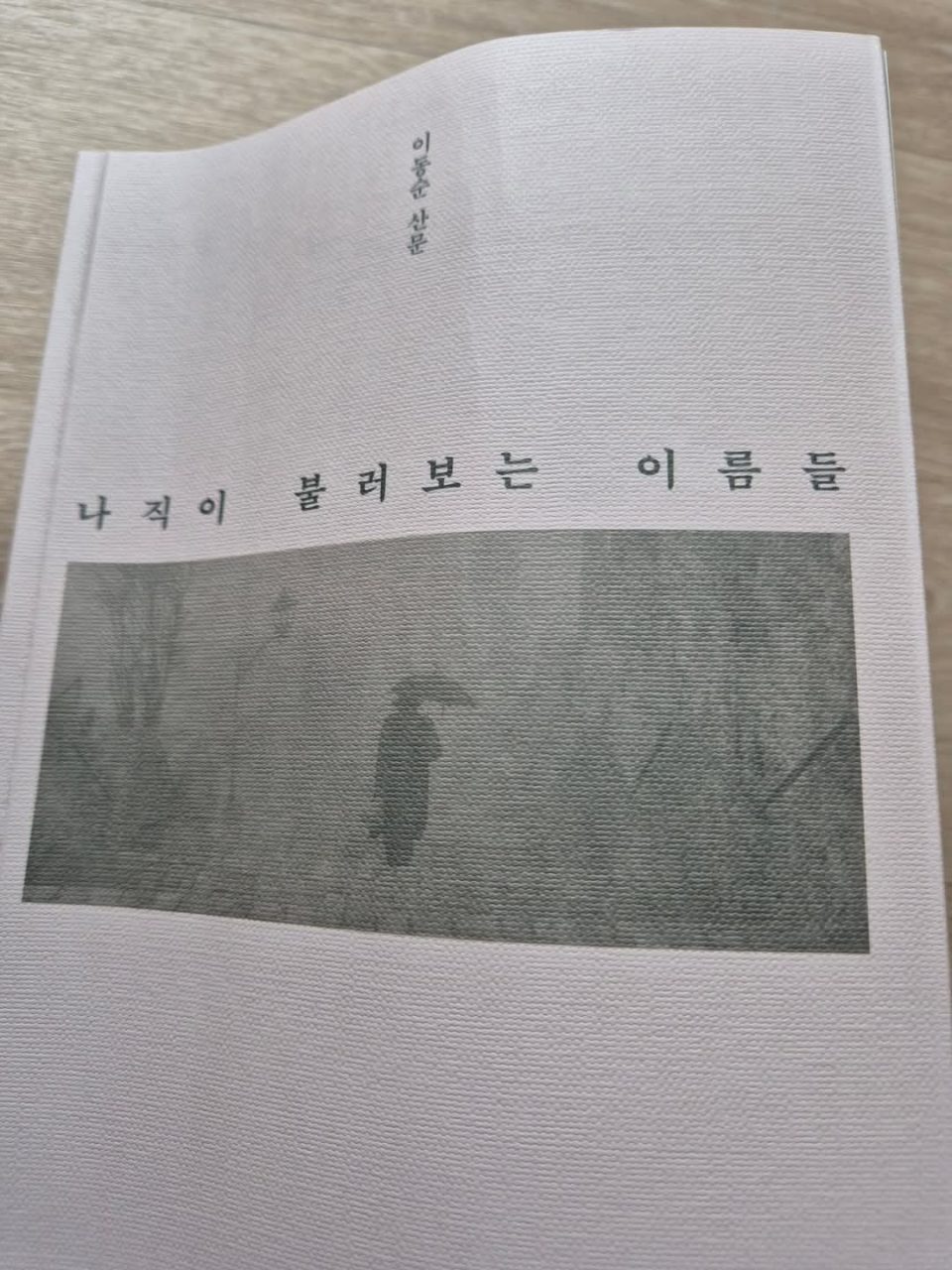
”내 가슴속에는 살아온 시간만큼의 온갖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 때 아무렇게나 꺼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 속에는 차마 남에게 드러내기 힘든 아프고 부끄러운 부분, 슬프고 당당하지 못한 요소들이 있고, 이를 노출하는 것을 삶의 치부로 여긴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동순 시인의 산문집 <나직이 불러보는 이름들>을 받고 첫 페이지를 읽으며 동병상련의 슬픔을 느끼는 것은 비단 나뿐이 아닐 것이다. “이해의 기쁨은 슬픔이고, 슬픔은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이 아니라도 지나간 시절을 뒤돌아보면 차마 내놓지 못한 이야기와 사연들이 노적가리처럼 쌓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FM에서 영화 <시네마 천국>의 주제음악이 나오면 나는 하던 일-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을 멈추고 가만히 귀 기울이고 음악을 듣는다. 그 음악을 들을 때면 지나간 추억들이 물 안개 피어오르듯, 스멀스멀 떠올라, 어떤 때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지나간 추억들에 내 정신과 육체를 내주는 것이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전환기의 두 갈래 길을 마주칠 때마다 과연 어느 길로 가야 맞는 것인가, 이 길이 과연 나의 길인가 하고 수없이 고민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내가 의심하면서 걸었고 고통 속에 걸었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든, 모두 나의 길이었음을 깨달았다.
1950년대 중반, 진안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60년대의 궁핍하고 외로운 생활을 살다가 70년대에는 오로지 책과 군대와 건설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독재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던 1980년대 초에는 영광스럽게도 ‘간첩혐의자’로 안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은 뒤 풀려났고, ‘불순분자’로 낙인찍혀 1992년까지 ‘요시찰 인물’로 감시의 대상으로 살았다.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나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날의 그 상처로 인해 더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분명한 것은 시고니 위버의 <진실>(원래 제목은 ‘죽음과 소녀’)은 허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지만 내가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7일은 ‘진실眞實’이었다.
그 고난의 숲을 헤치고 나온 뒤에 나는 문화운동을 시작했고, 틈 날 때마다 이 나라 산천을 걷고 또 걸었다. 수많은 길을 걸으면서 내가 나를 만나게 되고, 진정한 나를 조금씩 조금씩 찾고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와 달리 이동순 시인은 일찍감치 시인이 되어 문명을 날렸고, 재미난 일들을 벌였으니, 축복받은 삶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에 나온 문학동네 출판사의 <나직이 불러보는 이름들> 서평을 보자.
“시인이자 문학 연구자, 가요 연구가 이동순의 신작 산문집이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었다. 작가는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로 당선된 이래 스무 권 넘는 시집을 출간하며 한국 시단에 선명한 족적을 남겨온 것은 물론, 분단 이후 최초로 백석의 시 전집을 발간함으로써 시인을 민족문학사에 복원시키며 백석 연구의 길을 열었다. 그뿐 아니라 근대 가요에도 관심을 할애하며 잊힌 가수와 노래들을 발굴하고 이를 어엿한 문화사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시 쓰기를 비롯하여 백석, 홍범도, 고려인 강제이주사, 향토문화사, 근대가요사에 이르기까지 50년 넘는 세월 동안 전방위적 집필을 펼쳐온 그의 이력이 다채롭게 느껴지는 한편, 이 다종다양한 업적이 한데 수렴하는 지점을 따라가본다면, 그곳엔 필시 ‘그리움’이라는 감정과 ‘복원’이라는 사명이 포개어져 있을 것이다. <나직이 불러보는 이름들>은 이 ‘그리움’을 씨실로 ‘복원’을 날실로 삼아 직조해낸, 이동순의 전 생애에 걸친 문학적 발자취를 집대성한 산문집이다. 회고록이자 자서전으로 불리기에도 손색 없는 이번 저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린 시절을 더듬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망팔을 바라보는 오늘날까지의 생을 촘촘히 묶어냈다. 장강대하와 같은 긴 세월이 담겨 있지만 짧고 간결한 단장 형식으로 쓰였기에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권의 사진 앨범으로 화한 소회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이번 산문집은 한 작가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과 일화들을 써내려간 듯 보이지만, 조금만 떨어져 보노라면 한 시인이 탄생하고 우뚝 서기 위해 거의 필연적으로 추동되고 있는 개인사와 역사의 결속이 함께 읽힌다는 데서 또 다른 의미와 여흥이 발생한다. 그를 시인이자 연구자로 만든 시대와 사람, 그리고 그가 시인이자 연구자가 되어 만들어낸 인물과 삶 <나직이 불러보는 이름들>은 작가 이동순이 문학으로 만난 지난 반세기의 인연들을 총망라한 글이자, 지난 세월 만나온 사물, 작품, 지명, 노래 등의 고유명사들을 하나씩 재생(再生)하는 애틋한 복원 작업에 다름 아니다. 그들은 모두 내 가까이에 있었다. 그 이름들은 생각할수록 그립고 애잔하다. 그런데 왜 먼 곳으로 떠나갔는가. 왜 좀더 머물러서 정을 나누지 않고 서둘러 떠나갔나. 가만히 생각해 보노라면 그들이 떠났기에 그리움이 내 가슴속에 이슬처럼 고였다. (…) 그들의 육신은 이승에 있지 않지만 종이와 기억에 끼쳐놓은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서 설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이승을 떠난 것이 아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나에게 이런저런 말이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

생각해보니 이동순 선생님과의 인연이 오래 되었다. 대구문화방송과 낙동강을 주제로 한 방송 차 만났고, 김지하 시인 문학관 때문에 이런저런 인연을 맺고 살았는데, 더 좋은 글 많이 쓰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 내 가슴 속 판도라 상자를 열어 오래도록 제작한 목선을 바다로 진수하듯이 세상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내 보낸다.“
이 책의 책머리에 실린 글을 읽으며, 다시 <나직이 불러보는 이름들> 속으로 천천히 빠져든다.
2025년 1월 9일 온전한 고을 전주에서 신정일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