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의 행복한 도전 57] “가끔은 손자들과 같이 노래방도 간다”
[아시아엔=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 회장, 이해찬 국무총리 비서실장 역임] 요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뜻하는 ‘워라밸’이란 말이 유행이다. 워라밸 개념은 원래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한정되어 사용되었다. 지금은 노동관의 변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발전했다.
워라밸은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만족감, 충성심, 사기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중요한 관리 요소가 되었다. 특히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저녁 있는 삶’이 강조되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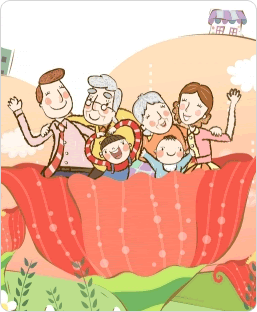
워라밸이란 말이 자주 회자되다 보니 가끔 이런 질문을 받
는다. “도대체 개인 생활은 어떻게 보내세요?” 아마도 바쁘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나머지 가정에서 나는 어떤 남편이고 아버지냐는 질문인 것 같다. 내 또래의 한국 남자들은 대체로 가족 내 대소사라든지 자식 교육은 아내에게 모두 맡기고 사회생활에 총력을 기울여야 겨우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
우리도 잘살아 보자고 외치던 고도성장 시대에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그러면서도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 무척 강조되었다.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담되어 직장은 남편이 책임지고, 가정은 아내가 책임지는 영역이 확실하게 인식되었던 시절이기도 했다.
솔직히 말해 38년 공무원 생활 초기에는 집에 전혀 신경 쓸 새가 없었다. 이사하는 날 아침에 아내에게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녁에는 새로 이사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일이었다. 요즘에야 포장 이사라는 것이 있어서 짐을 다 싸 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이사는 모두 아내의 몫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 일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아내를 배려해 주고 아내에게 봉사하는 쪽으로 많이 변화되었다. 일례로 분리수거는 지난 15년 동안 온전히 내 몫이었다. 우리 아파트에서 최초로 분리수거 다녔던 남편이 바로 나이다. 처음에는 정말 쑥스러웠다. 가끔 분리수거함 앞에서 얼굴이 익은 이웃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다.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나머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쪽에서 먼저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고 할까. 그러나 차츰 남자들이 분리수거하는 일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당당하게 분리수거 주머니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 가끔 나 스스로 내가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을 잘하고 있나 자문해 볼 때가 있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나는 무엇보다 가족과 대화를 많이 나눈다. 아들이 셋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두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다. 그러면 나는 가장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 조언을 해준다.
언제든 답답하게 얽힌 난맥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많이 해 왔기에 나에게 생긴 능력을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아들들이 나에게 “아버지는 늘 든든한 멘토예요!”라고 말해 줄 때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든다.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것은 손자 녀석들이다. 장남에게서 난 큰손자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이다. 둘째 아들한테서 난 손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다. 특히 막내 손자 하윤이는 내 피로회복제이다. 제일 힘들 때 이 녀석들을 떠올리면 이상하게 피로가 싹 사라진다. 아들 며느리 내외와 손자들과 함께 한 달에 한두 번씩 식사할 때가 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가끔은 손자들과 같이 노래방도 간다.
나는 절대 어디 가서 직책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혼자 있을 때는 기사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다. 혼자서도 충분히 밥을 잘 먹고 다닌다. 택시 기사들 옆에서 맛있게 밥을 먹는다. 가끔은 학교 앞 순댓국집에 갈 때도 있다. 국물이 깊고 맛있어서 입에 잘 맞는다. 일요일마다 사우나에 가는데 다녀 오는 길에 동네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 온다. 우리 집에서는 그걸 일요일의 외식이라고 부른다.
아내가 해 주는 밥을 먹을 때는 나는 항상 말한다. “당신이 해 주는 밥이 정말 맛있어. 잘 먹었어, 여보.” 나는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아버지요리대학 1기 과정을 마쳤다. 실제로 요리를 배우면서 그동안 아내가 음식을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헤아려 보며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대학 총장으로 사는 시간이 많지만 집에서는 나 역시 평범한 아버지이고 남편이다.
나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박한 꿈을 간직하고 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조그만 식당을 하나 열어 보는 것이다. 맛있는 메뉴도 개발하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도 하면서 손님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식당을 말이다. 아버지요리대학 과정을 마친 것은 내 꿈을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또 하나의 꿈은 사진을 찍어 보는 일이다. 지금 내 작은아들이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다. 아들과 함께 전시회도 열어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