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시인의 뜨락] 담양 출신 고재종의 ‘면면함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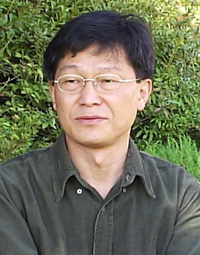
[아시아엔=김창수 시인] 고재종은 전남 담양 출생으로 1984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하였다. 토속어와 절제된 언어, 음악성을 드러내는 시를 주로 쓴다.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시집으로는 <바람 부는 솔숲에 사랑은 머물고> 등이 있다.
옛날 농경사회 때 마을 어귀에는 느티나무 한두 그루가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회의를 하거나 잔치를 하고 땀을 식히기도 하였다. 몇백년 된 나무들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일하고 놀고 죽는 것을 목격한 마을의 역사책이었고 마을의 수호자였다.
그런 나무들이, 산업문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 쇠락해진 마을을 지켜보게 된다. 느티나무는 면면綿綿히 이어져 내려온 마을의 역사가 끊기어 가는 것을 보고는 푸르른 울음소리를 내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新농업문명 사회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인조인간이 기존 태생(胎生) 인간이 하던 일들을 대부분 소화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기계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중·소농의 역할에 대해 주목한다. 인간만이 할 수 있고 보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사람들이 농촌으로 회귀할 것이라 확신한다.
아래 고재종의 시 ‘면면함에 대하여’에서 시인은 삭풍을 이겨 내고 봄을 맞이한 느티나무처럼, 사람들이 떠나 후락한 마을이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운 현실도 미래에는 희망차게 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에서 면면함이란 이농현상으로 피폐한 농촌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를 의미한다.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가 ‘생생한 초록의 광휘’로 드러날 때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리겠니” 라는 말로 면면함을 강조한다.
겨울을 이겨 낸 느티나무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할 일이다.
綿綿함에 대하여
너 들어 보았니
저 동구 밖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 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리겠니
고재종, <앞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 문학동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