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산책] 좋은 인연도 때론 슬프다···성수동 김주필 산부인과 원장의 ‘무영등 아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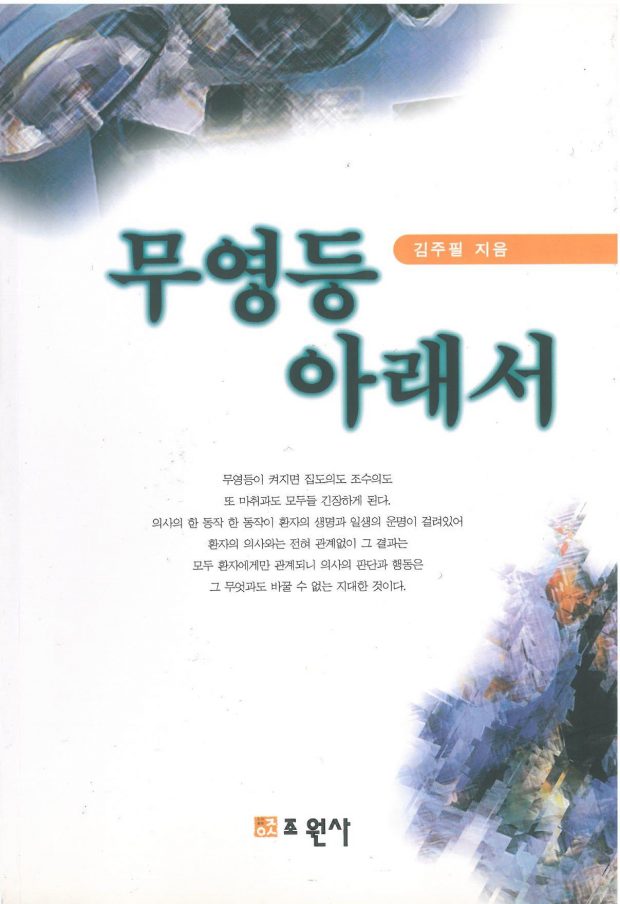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이럴 때 ‘인연’이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을 듯하다.
서울 성수동에서 산부인과의원을 30년 이상 하는 김주필 원장과의 만남은 책 한권에서 비롯됐다. 지난 2월17일 금요일 저녁이었다.
작년 3월 어느날 정성스레 포장된 책 한권이 배달됐다.
<인간의 비극, 비운의 한반도>(미디어21) 제목 아래 ‘의사 김주필의 인류 미래·한반도 운명 진단’이란 부제가 붙어있었다.
전혀 낯선 분한테서 온 것인 데다 의사가 남북관계에 대해 낸 소설인 터라 후딱 읽은 뒤 병원으로 전화해 “책 잘 읽었고 의사선생님께서 이런 책을 지었다는 게 놀랍고 반갑다”고 했다.
<인간의 비극, 비운의 한반도>는 1부 인간의 비극, 2부 비운의 한반도(식물공화국) 신과의 대화 등 16편으로 구성됐다. 1부에는 ‘인간이 신을 이길 수 있을까?’ ‘최신 무기와 핵무기’ ‘암에 걸린 지구’ 등 12편, 2부에는 ‘우리가 신탁통치합시다’ ‘다시 신과의 대화’ 등이 실려 있다.
책을 받고 서너 차례 통화한 끝에 지난 2월 중순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첫 만남이었다. 인근 횟집으로 옮겨 김주필 원장과 나는 세시간 가까이 반주를 들며 얘기를 나눴다. 김 원장은 전혀 의사냄새가 전혀 없이 푸근한 그야말로 ‘동네의사’였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나는 뜨끔하면서도 다소 안도했다. “나는 책을 낼 때마다 각계 저명인사로 알려진 1000명 정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받았다고 연락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한 열명이나 될까···. 근데 이 기자는 답을 주어서 기뻤고 만나고 싶었지요.”
그는 자신이 산부인과 의사를 택하게 된 동기, 성수동에 자리잡게 된 연유, 정치언저리에 가려다 유턴한 얘기 등을 재밌게 풀어냈다. 거의 띠동갑에 가까운 나이차이는 우리 대화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김주필 원장은 대화 중 “산부인과 의사로서 자신의 소소한 생각들을 적은 책을 1999년 낸 게 있다”며 “<무영등 아래서>라는 책인데 찾는 대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무영등(無影燈)은 그림자가 지지 않아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등이다. 김주필 원장은 “최소한 내 손을 거쳐 세상에 나간 애들만이라도 바르고 훌륭하게 자라라고 태어나는 순간 바르게, 성실하게, 훌륭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엉덩이를 세 번씩 때려줬다”며 “산모들에게 나눠주고 애들 키우다 힘들면 참고하라고 썼다”고 말했다.
<무영등 아래서>에 다음 대목이 내게 특히 와닿았다. “새벽 일찍 5시쯤 일어나 별을 보면서 아들과 둘이서 해동검도 도장으로 가기를 삼년. 그 길에서 부자간의 대화가 지금도 생각하면 꽤 유익했던 것 같다. 최근 외신에 보면 운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성범죄 확률이 낮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운동 한가지씩은 찾아주어서 열중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44~45쪽)
3년간 아들과 새벽길을 하루같이 거니는 父情이 몹시 부럽고 부끄러웠다.
그리고 김주필 원장과의 자리가 파할 무렵, 그에게 물었다. “원장님, 김방철 선생님 혹시 아시는지요?” “나 하고 절친인데 어떻게 아시죠, 이 기자?” “저희 두 아들을 받아주셨지요. 길동과 수유리에서 각각.” “그 친구 지금 말기암이예요. 빨리 나아야 하는데···”
김주필 원장의 대학동창이자 친구인 김방철 원장은 1985년 봄 길동에서 김방철산부인과에서 처음 만나 나의 큰 아들을 받아준 분이다. 이태 뒤 수유리로 이전하여 둘째도 받아준 참 따뜻하고 고마운 분으로 내겐 남아있다. 김주필 원장은 “전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자라도 보내라”며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다.
이튿날 오전 김방철 원장께 문자를 보냈다.
“원장님 쾌유 기원합니다. 길동과 수유리서 주형·동형 두 아들 받아주신 감사함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드림. 저는 한겨레 퇴직 후 아시아엔이란 매체를 창간·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필 원장과 만난 지 한달여 지난 3월 중순 <무영등 아래서>(조원사 발행)가 도착하고 나는 감사전화를 드렸다. “잘 도착했군요. 부족하지만 읽어주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그 친구 김방철 박사 우리가 만난 다음날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참 좋은 친구였는데···”
한동안 나는 멍한 채 전화를 끊지 못했다. 김방철 원장께 드린 처음이자 마지막 문자메시지는 그분이 천국에서라도 읽으셨길 바란다.
이런 게 인연인가 싶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지만, 잇는 것도 맘대로 안 되는 그런 것, 그게 인연이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