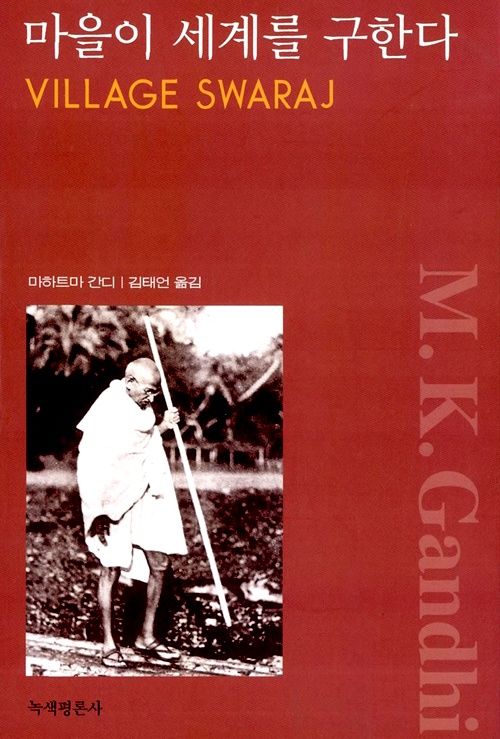[서평] 인간의 미래, 다시 ‘마을’이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마하트마 간디 지음, 녹색평론사)
20세기 말, 자본주의로 맞이한 지구촌의 21세기는 화려했다. 금방이라도 인간의 모든 희망이 현실로 피어날 듯 사람들은 들떴다. 그래선지 실망은 더 컸다. 그 밀레니엄 맞이의 총 지휘자였던 미국은 지금 석양의 무법자 신세다. 지구촌의 모든 공포가 그의 연주다. 승자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지는 해가 뿌리는 황혼의 쓸쓸함이 역력하다. 그를 따르는 무리 또한 지친 기색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세기의 희망이 그렇게 꺾어지자 다시 마르크스의 이름을 거론하는 청년도 있지만 흘러간 물이 연자방아를 돌릴 순 없다. 하여간 분명한 건 무한경쟁이라는 장바닥에서 날로 지쳐가는 지구촌의 만백성들을 이대로 그냥 놔두고 구경만 하기엔 현실은 너무나 절박하다.
이제 우리는 다 눈치챘다. 이성이 주관하던 중세의 화려한 담론도 홉스가 제안한 리바이던 민주주의도 동양의 왕도정치나 유교도 또 방금 자본주의에 넉아웃 된 사회주의는 물론 그를 지구촌 마당에 보기 좋게 패대기 친 위대한 승리자 자본주의도 더 이상 희망의 불씨를 살려 낼 풀무가 아님은 자명해졌다.
그래서일 것이다. 여기 저기서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린다. 스스로 지구촌의 주인임을 천명했던 세계의 지성들이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제안은 오던 길을 그대로 가되 속도를 더 내거나 아래와 위 또는 좌우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아니라고 하는 자본주의에 새 옷을 갈아 입혀 거듭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간헐적으로 악마의 본성을 드러내기까지 하는 녀석이 화려하게 치장해 준다고 해서 천사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어느 생물학자는 이미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경험한 이 지구촌에서 여섯 번째의 대멸종이 인간에 의해 재촉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닥쳐오는 이 엄청난 재앙을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 그렇다. 우리 스스로 ‘인간’이라는 간판을 걸고 만물의 영장임을 자처해 왔다. 창조주인 신의 지위에 버금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이제야말로 지구촌을 위해 뭔가 보여줄 때가 됐다.
때 맞춰 일고 있는 인간에 대한 거대 담론에 꽤 촌스러운 주장이 회자되고 있다. 바로 ‘마을’ 담론이다. 우리 인간이 오래 전에 버리고 떠나왔던 까마득한 세상이다. 그 오래된 인간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떠나왔던 그 고향이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 가던 걸음을 우뚝 멈추고 180도 방향을 바꿔 그 걸어 왔던 길로 가자는 것이 아닌가, 이게 웬 말인가.
그 중 우리의 주목을 받는 마을 담론은 ‘마을 스와라지’다. 인류의 스승 간디는 이미 반세기 이전에 ‘마을 스와라지’를 통해 ‘마을’의 독립과 자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안전을 확보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도시로 내몰아 욕망을 부채질을 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면서 ‘마을’의 자치와 독립이야말로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제 도시화와 문명을 내려 놓고 인간의 고향 ‘마을’로 돌아가 ‘마을회의체를 구성하고 마을 자치기구를 건설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간디는 이 ‘마을 스와라지’가 인도는 물론 세계의 희망이라고까지 단정적으로 선언했다.
간디는 서양의 근대화와 문명 그리고 도시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기계화는 인류에게 큰 화근 덩어리다. 반드시 인류에게 저주가 되어 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도시화는 자립, 독립, 자치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구나 사람들의 일거리를 빼앗아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내몰 것”이라면서 “이제 농촌마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으로 돌아가 자치와 자립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마을을 중심으로 서양의 근대화를 거부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무지한 듯하고 어떻게 보면 소박한 촌노의 옹고집 같은 이 간디의 사상을 그간 우리는 물론 세계의 지성조차 ‘중세적 보수주의’로 치부하면서 무시하거나 경시했었다. 그러나 20세기를 거치며 도시적 삶이 최고조에 오르고 농촌의 피폐와 생태위기에 따른 먹거리의 불안에 겹쳐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는 등 반 세기 이전에 우려했던 간디의 주장이 현실로 고스란히 드러나자 간디의 주장이 강한 호소력을 얻고 대안으로 거론되었다. 세계의 석학들을 필두로 간디의 ‘마을 스와라지’ 즉 마을 자치가 세계를 살린다는 오래된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경제학자는 물론 정치학자나 사회학자까지 동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을’은 우리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을 스와라지는 한마디로 ‘마을’이라는 공동체이지만 그 의미는 아주 작은 자치국가다. 사상과 이념에서 이성을 바탕으로 한 부성적 논리와 윤리와 가치관이 힘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모성애가 구성원 간의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세상이다. 법과 권력 그리고 군인과 경찰 그리고 지위의 높고 낮음은 물론 벌과 감옥이 존재하는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숲의 나무나 풀이나 꽃처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태적 사회가 ‘마을’이라는 국가다.
때 마침, 우리 사회도 마을이란 화두와 함께 도시농업 또는 귀농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거론 되곤 한다. 이미 우리의 현실도 도시화와 문명에 대한 반감이 생각보다 깊이 있게 퍼져 있는 것이다. 취업이 힘든 젊은이를 필두로 탈도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와 문명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끝이 보이는 것은 싫증이 내면에서 끓어 오르고 있는 현실의 결과다. 자본주의라는 공간에서 인간의 욕망이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폭발 직전의 성찰과 반성이 귀촌 귀농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통해 자연으로의 귀향을 서두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허기야 갈브레이드 교수는 대량생산에 의한 풍요보다 ‘완전고용’에 바탕을 둔 복지를 선택하자고 했고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작은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조아드 교수는 탈 중심화를 현대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국가를 작게 나누고 기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의 지성이 입을 모아서 귀촌과 귀농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