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지구촌의 천재, 기생충과의 만남은 악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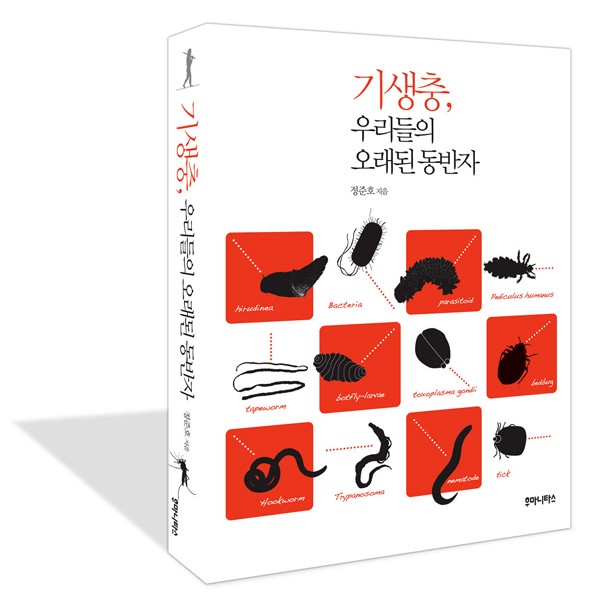
‘기생충, 우리들의 오래된 동반자’ (정준호 지음, 후마니타스)
언듯 지구촌은 평화롭다. 수많은 생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인 듯하다. 그러나 그건 겉모습이다. 그 어우러짐의 안쪽에선 너를 속이지 않으면 내가 속는다. 자칫 목숨까지 위태롭다. 사기꾼들의 경연장이 따로 없다. 그렇다 보니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구촌 생명체들의 최대 고민은 ‘사기치기’다. 사랑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 인간도 이 사기 판에서 예외가 아님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이 지구촌에서 그 첫 손은 누구일까? 인간! 잘못 짚었다. 어림도 없단다. 글쎄 우리 인간이 지극정성으로 받들어 모시는 ‘신’은 어떨까, 역시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 또는 신조차 흉내 낼 수 없는 신출귀몰의 기술을 발휘하는 존재는 놀라지 말라, 기생충이란다. 그 어떤 존재가 있어 감히 우리 인간에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는 제법 갸륵한 이 있어 인류의 자긍심을 아직도 유지하고 싶다면 이 <기생충, 우리들의 영원한 동반자>를 읽어라.
꾀 많은 여우며 사나운 늑대, 덩치 큰 코끼리 뭇 짐승의 제왕 호랑이나 사자까지도 모조리 무릎을 꿇린 우리 인간이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기생충학자가 발표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논문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신조차도 기생충의 사기술 앞에서는 손발을 번쩍 들어야 한다는 기막힌 주장뿐이다. 그러니 그 신을 모시는 인간의 수법쯤은 기생충의 근처에도 미치지 못할 건 뻔한 이치.
어쨌건 우리 인간의 손재주와 꾀는 문명이란 걸 창조했고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모름지기 휘둘러 호령하면서 자칭 만물의 영장이 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이라는 것이다.
이 지구촌의 천재 기생충 앞에서는 인간이 자랑하는 총검이나 폭탄이나 미사일 같은 건 무용지물이고 딴장 치기다. 번지가 틀리는 근본 원인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저 앉아서 기생충의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벌써 다 잊었는가 뭐 조류독감이니 구제역이니 하면서 우리가 사육하는 수 백 수 천만의 새들과 소와 돼지를 하릴없이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저들 앞에 바치고 피눈물을 흘렸던 지난해 저 지난 해의 그 처절했던 기억을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약육강식의 지구촌에서 모든 생명의 주체가 고민하는 핵심은 ‘공짜로 살아 가는 재주’다. 놀면서 살아가자는 것이다. 뭇 생명의 고민은 우리가 늘 그리워하듯이 도깨비처럼 놀고 먹으면서도 신바람 나게 사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진실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싸워서 전리품을 챙기는 인간의 방식은 고달프다.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나 입이 편할 날이 없고 성할 날이 없다. 머리는 터질 지경이다.
기생충은 주인의 허락을 받는 그런 위인이 아니다. 허락을 청하거나 득함이 없이 그저 맘 먹은대로 불쑥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알을 낳고 그 새끼를 키운다. 거기가 바로 제 세상이다. 그 분량이 만만치 않다. 천문학적이다. 나 하나의 몸 속에 지구촌 인류의 수를 능가하고 그 무게는 2kg쯤이라니…… 이 무법자들이 진짜 밉고 괘씸하다.
허기야 누구랄 것도 없이 살 빼기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때 그 몸뚱아리를 사정없이 파먹고 뜯어 먹는 이 녀석들이 뭐 그렇게 미워할 일만은 아니지만 말이다. 과학자가 얼쑹덜쑹 계산해 보니 우리 월급의 20%를 기생충이 먹어 치우고 있을 거라니 이 소리 없는 도적떼를 몰아내야 할지 고맙다고 해야 할지…….
그런데 아서라. 기생충학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미워하기는커녕 사랑해 줘야 한단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정상미생물총’을 나의 장에서 몰아내면 바로 그날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나의 가족이 나의 제삿밥을 차려 먹는 때라는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진짜 아군이다.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병원성 세균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싸워주는 나의 군대라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기생충학자들은 기생충이란 말을 함부로 써선 안 된단다. 기생의 주체와 객체는 그렇게 상식적인 기준으로 구분할 수 없단다. 기생과 숙주의 관계를 명확하게 가리고자 수 많은 학자들이 씨름을 했지만 현대 기생충학은 이제 두 손을 번짝 들고 말았다고 하니 말이다.?
하여간 기생충은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생명체보다 위대하다. 브렌던 르헤인은 말한다. “네로와 쿠불라이칸, 나폴레옹과 히틀러, 모든 교황과 파라오 그리고 저 오토만 왕좌에 앉아있던 지배자들의 영향력을 모두 합친다 해도 단 한 마리의 벼룩이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인간에게 입혀온 피해에 비하면 한낱 연기에 불과할 뿐이다.”
더 믿기지 않고 더 충격적이고 더 소름이 끼치는 생물학자들의 절규 한마디를 들어보자. “지금까지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겪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의 대멸종이 가까워지고 있다.”
분수를 넘는 평자의 의견이지만, 저 위대한 지구촌의 천재 기생충 앞에서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문자니 문명이니 과학이니 의학이니 이념이니 지성이니 하는 이 눈부신 인간의 자랑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허무하기 짝이 없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자신의 몸 안으로 생존과 삶의 방식을 축적해 가는 사이 우리 인간은 오로지 몸의 바깥만을 지향했고 그래서 문명이라는 도구로 지구의 지표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겉일 뿐 인간 자체는 아니지 않은가, 이제 문명을 내려놓고 자연이라는 지구촌의 어머니가 허용하는 인간의 좌표로 돌아가야 할 때다. 그 먼 거리를 건너가는 돌다리를 기생충학이 놓고 있다. 인간의 종말을 준비해야 하거나 자연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