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칼럼] 에릭 홉스봄…역사학자들을 가르친 역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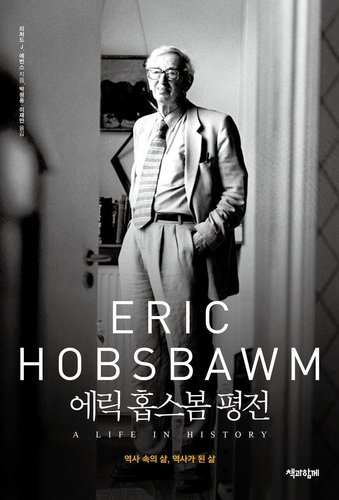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그가 나타났다. 불편한 몸으로 낡아 겉이 헤진 커다란 가방을 들고 그는 긴 타원형 책상 가장자리에 앉았다. 참석자 모두가 그의 고정 좌석으로 인정하는 자리였다. 그가 착석해서 한 숨을 돌리고 가방에서 메모지 파일을 꺼낸 후 펜을 들면 비로소 사회자가 회의의 시작을 선언했다. 그것이 모임의 전통처럼 느껴졌다.
학기 중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런던대학 중앙도서관이 위치한 Senate House 4층에서는 런던대학 역사연구소(Institute of Historical Research)가 주관하는 ‘현대 영국사(Contemporary British History)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영국 현대사 세미나라곤 하지만 산업혁명의 등장과 대영제국의 형성 같이 국제사회에서 과거 영국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데다 현재도 유엔은 물론 미국, 영연방, 유럽에서의 입지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니만큼 영국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적 이슈들이 세미나 주제로 등장했다. 모임에는 학자들과 정부의 현직 각료들이 참석해서 약 두 시간에 걸친 발표와 토론 등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세미나 주제는 다양했는데 영국 현대사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hip)’, 전통적인 영-불-독 관계, 영-아일랜드 관계, 영국과 유럽연합(EU), 영연방(The Commonwealth), 영-러시아 및 영-중국 관계, 영국과 아프리카, 영국과 중동지역 관계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역사적 사실의 바탕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면서 미래 관계를 논하는 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석유, 농업, 환경, 기후문제 등 영국이 당면하고 또 헤쳐 나가야 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의도 논의의 장에 수시로 올라오곤 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외에서 명성을 떨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현대사연구소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를 내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더 배우려는 열정을 갖고 참석했다. 나는 영국정치를 공부하는 박사과정 학생이라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원탁 테이블 뒤편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위대한 인물들의 소박한 논의의 장을 참관하고 학습하는 광경을 매주 목격할 수 있었다.
저녁시간에 진행되는 모임이지만 식사는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샌드위치를 가지고 온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한입 떼어 입을 오물거리면서 허기를 채웠다. 모임에서 유일하게 제공되는 게 타원형 쟁반에 적당히 담긴 작은 비스킷이었는데 토론 도중에 이 쟁반이 큰 원탁테이블에 앉은 참석자들 앞으로 전달되면 대개 두세 조각씩을 꺼내 자기 앞에 놓인 메모지나 노트 위에 올려놓고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먹는 장면이 이채로웠다. 작은 쟁반을 먼저 받은 사람이 비스킷을 한 움큼 집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욕심을 내면 다른 사람에게 빈 쟁반이 갈 수 있으므로 가끔씩은 곁눈질을 해가며 비스킷을 집는 걸 고민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는 광경이었다. 이들이 국제정치와 역사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학자들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세미나 참석을 위해 1층 계단 앞에 서는 시간도 4시 45분으로 거의 일정했다. 승강기가 없는 오래된 건물인 탓에 4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가끔씩 2층이나 3층 계단에서 만나는 노학자가 있었다. (영국에서는 1층을 Ground Floor, 우리가 통상 2층으로 부르는 것을 1st Floor라고 부른다. 따라서 영국에서 4층은 우리의 5층에 해당된다). 어느 날은 내가 가방을 들어드리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 또 어느 날인가는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는 그에게 부축이 필요하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는 또 싱긋 웃으며 거절했다. 그는 색이 바랜 질겨 보이는 오래된 상의를 즐겨 입었고 낡고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세미나를 종료할 무렵이면 늘 사회자가 그에게 마지막 코멘트를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는 불편해 보이는 한 쪽 눈을 찡그려 가며 작은 목소리로 그리 길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내겐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중간이나 혹은 말을 다 마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의미의 눈길을 보내곤 했는데 세미나 참석 초기에 나는 그가 누군지 정말 궁금했다. 얼마 지난 후 나는 힘겹게 계단을 오르내리며 누구의 도움도 원치 않던, 또 세미나 중에 그리 크지 않은 손으로 바구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스킷을 움켜쥐던, 그리고 늘 마지막 코멘트를 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하던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옆에 앉아있던 같이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동료 학생에게 내가 물었다. “저 분은 도대체 누구야?” 그가 조금 놀라는 얼굴로 다시 내게 물어 왔다. “저 사람이 누군지 진짜 몰라?” “응. 모르겠는데” “에릭이야. 에릭 홉스봄” 대답을 듣고는 오히려 내가 놀랐다. 그가 바로 흔히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에릭 홉스봄이었다.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전문가를 두고 요란을 떤다고 비웃어도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아마추어 청소년 축구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직접 만나거나,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생전의 스티브 잡스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될까. 외국 어느 나라의 영화전공 학생이 눈앞에서 봉준호 감독을 직접 만나 잠깐이나마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도 좋겠다.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누구인가?
홈스봄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이며, 그가 ‘역사학자들을 가르친 역사교수’라는 점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전 세계 역사학자 중 그의 방대한 지식과 논리에 영향 받지 않은 학자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연구는 단지 역사학 분야를 뛰어 넘어 사회과학 영역은 물론 영국, 유럽과 미주 대륙을 포함해 광범위했으며 폭넓은 시각으로 인류사 전 영역에 걸쳐 철저한 사료 분석을 통해 역사 연구에 한 획을 그었다. 따라서 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그의 공적은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1917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영국인 아버지와 오스트리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오스트리아 빈과 독일의 베를린에서 성장 후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 런던으로 이주하여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한다. 1936년 대학시절인 19살 나이에 영국 공산당에 가입한 이래 제2차 세계대전 후 헝가리 침공을 포함해서 동유럽국가의 공산화를 추구한 구소련에 실망한 좌파 지식인들이 잇달아 전향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당적을 유지한다. 따라서 학자로서 그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1950년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공산당원의 자격이 문제가 되어 197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런던대학 버백 컬리지(Birkbeck College)의 정교수가 되었다. 역사학 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전력과 신념으로 인해 평생을 영국 정보기관인 보안정보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그가 공산당원으로서 당적을 떨어버리지 못한 배경으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당을 버리는 것이 다른 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거나, “한때 공산주의자였다가 광신적인 반공주의자로 돌아선 무리들과 같은 부류가 된다는 사실은 역겨운 일”이라는 고백을 그가 했다는 등의 견해가 존재한다. 하지만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거침없이 비판하거나, 터무니없는 파업을 주도한 영국 내의 비타협적인 강경노조를 비판하기도 하였고, 현실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맹목적인 운동권에 대해서도 비난을 서슴지 않던 그는 좌파진영 내에서도 강경한 반골로 명성이 높았다. 인류사회의 진리와 상식에 대한 견고한 신념이 홈스봄의 속에 있었다.
역사에 대한 그의 해석은 현대인류가 직접 체험하며 겪어온 정치와 경제적 요인은 물론, 사회와 문화, 예술과 종교 등 다양한 방면에 걸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도로 그 가치를 발한다. 그는 이런 연구의 바탕 아래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산업혁명 이후 국제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추적하여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역사서들을 연작으로 발간하였다.
그는 1962년 <혁명의 시대, the Age of Revolution; 1789-1848> 발간을 시작으로 <산업과 제국; Industry and Empire>(1968년), <자본의 시대, the Age of Capital; 1848-1875>(1975년), <제국의 시대, the Age of Empire; 1875-1914>(1987년)에 이어 제1차 세계대전부터 갑작스러운 소련제국의 붕괴가 이루어진 1991년까지를 배경으로 <극단의 시대, the Age of Extreme, 1914-1991>(1994년), <역사론, On History>(1997) 등을 저술하면서 학자로서 세계적 명성을 갖게 된다.
어느 역사학자가 이렇듯 현대사를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종합할 수 있을까. 그의 연구는 은퇴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빛을 발했다. <제국의 시대>와 <극단의 시대>는 은퇴 이후에 저술한 작업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영국 아카데미와 미국 아카데미의 특별회원과 런던대학의 명예교수로 오랜 기간 연구와 강연 활동을 지속했다. 94세인 2011년에 마르크스주의를 회고하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How to Change the World; Tales of Marx and Marxism>라는 에세이집을 출간한 후 이듬해인 2012년 95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평생을 신념과 이상을 추구한 성실한 학자로서의 면모를 유지했다.
그가 영면에 든 지 11년이 지났다. 그는 생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사회는 종종 그를 외면했고 오해했으며 축이 기울어진 한 쪽에서의 생활만 허락했다. 학문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견해를 추종한 후학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의 학문적 업적에 빚을 지지 않은 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가 일생을 헌신한 인류 역사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에 대한 연구는 종합적이든 혹은 미시적이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비록 몸과 마음의 허기 속에 힘든 시기였지만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기간 에릭 홉스봄이라는 지성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에서 커다란 행운이었다. 겸손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국가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석학들의 모임에서 홉스봄이 보여주었던 학문적 열정과 진지한 자세는 영국사회의 학문적 전통과 올바른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좌표가 아닌가 한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가 특별히 좋아하는 비스킷이 무엇인지를 목격한 유일한 동양 학생이었다는 것도 내겐 소소한 자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