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익 칼럼] 내 믿음은 위선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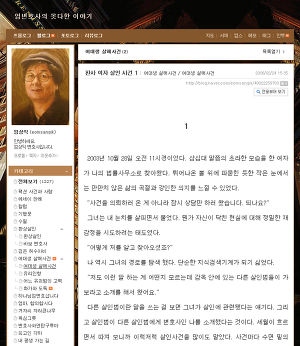
얼마 전 본 댓글 두 개가 마음에 남았다. 그중 하나는 내 글이 신학적 이론의 틀에 나의 경험과 생각을 끼워 넣고 그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하면서 너무 평면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인적으로 보이려는 가장적 모습이거나 내면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오만함을 드러내려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댓글은 약간 다른 입장이었다. 진리와 믿음 종교에 대해 쓰다가 요즈음은 흥미 거리의 글을 쓰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을 해주고 있었다.
댓글의 비판들은 더러 나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약이 되기도 한다. 매일 아침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으로 스며드는 성경귀절이나 현자들의 신학적 해석이 있다. 그게 매일 쓰는 글의 기둥내지 대들보라고 할까. 그걸 중심으로 언어의 집을 지을 건축자재들을 기억의 창고에서 끌어낸다. 그날의 화두들을 직접 노출시키는 게 마치 시멘트 건물의 철근 골조가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평면적이라는 지적이 그게 아닐까.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발견한 작은 빛 내지 향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다. 요즈음은 그런 주제를 직접 노출 시키지 않고 글 속에 녹아있게 하면 어떨까 하고 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한다.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녹아 있어야 더 입체적일 것 같아서다. 그런 경우 호흡이 더 길어지기도 한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왜 진리나 믿음의 세계에서 멀어지는 글을 쓰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하다. 능력부족 때문인지도 모른다. 더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우회적인 지적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떤 때는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그 분’에 대해 내가 정말 확신이 있나 하고 회의가 드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초인이 되려고 하고 오만함을 드러낸다는 말은 동의가 되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나쁜 놈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나는 명예욕이 강하고 허세부리기 좋아했다. 남 위에 서고 싶었고 경쟁자의 실패를 보면 기뻐했다. 화를 잘 내고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불쌍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고 신앙이 조금은 나를 바꾸었다는 생각이다. 사실 믿음과 기도는 논리나 종교가 아니고 내게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었다.
처음 변호사를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한 흉악범을 만나기 위해 영등포교도소로 갔었다. 때가 탄 거무스름한 콘크리트 건물 구석의 우중충한 접견실에서 살인범과 마주 앉아 있었다. 접견실이라고 하지만 짐승우리 같이 철창으로 되어 있고 나는 그 안에서 흉악범과 둘이서 갇혀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 그는 여러 명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은 악마급이었다. 그의 눈에서 섬뜩한 푸른 기운이 흘러나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기가 죽고 몸에서 소름이 돋았다. 나는 순간이지만 겁먹지 않게 해 달라고 속으로 기도했다. 그가 마네킹같이 표정 없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여덟 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죽였어. 그중 몇 명은 쓰레기장 바닥에 몰래 묻어뒀는데 그것까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 변호사 양반.”
그 순간이었다. 나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튀어 나갔다.
“강도가, 그것도 연쇄 살인범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았다. 내 안에서 뭔가가 내 입술을 빌린 것 같았다. 내 입을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뭐? 내가 아무리 강도라도 직접 대놓고 강도라고 하다니.”
그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당장 내 목을 비틀어 버릴 것 같았다.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겁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다행히 나는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짐승같은 살인범들을 많이 만났다. 실제로 당하는 변호사들도 많았다. 막 변호사개업을 한 부장판사 출신이 집행유예로 의뢰인을 석방시켰다. 감옥에서 나온 의뢰인이 며칠 후 그 변호사의 허벅지에 칼을 쑤셔 박았다. 무죄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웃빌딩의 변호사는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10년 전 승소한 사건의 의뢰인이 찾아와서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갔다. 그 변호사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상식이나 논리를 벗어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공포를 극복하는 수단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살인범을 마주하면 눈을 감고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했다. 그 순간은 간절함이 있다. 그리고 눈을 뜬다. 그럴 때면 갑자기 앞에 있는 흉악범이 아이같이 작아 보였다. 그리고 흉악범의 겁먹은 눈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다. 그게 내가 체험한 기도의 힘이었다. 소심했던 나의 마음이 갑자기 담대해지기도 했다. 그건 논리나 신학적 이론이 아니고 팩트였다.
구조적인 거대한 악과 마주할 때가 있었다. 예를 들면 고문으로 죽어 암매장당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싸울 때라고 할까. 혼자 떠들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나를 지원해 줄 조직도 없다. 제도적인 법은 내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공명심에 들떴다고 하고 오만하다고 욕을 먹기도 했다. 걸어가야 할 길은 알면서도 걸어가기가 힘겨웠다. 그럴 때 나 이상의 힘에 의지하고 싶었다.

그게 믿음이 아닐까. 그 분이 안에 계셔서 일을 할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힘을 주시기를 빌었다.
돌이켜 보면 내가 살아온 순간순간이 그분의 섭리 아니었을까. 현실은 그분의 가르침이었고 실패는 방향을 바꾸라고 때리는 그 분의 막대기였다. 슬픔은 마음의 정화인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내 삶에 녹아있는 소금 같은 믿음을 입체적으로 써 보려고 마음먹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