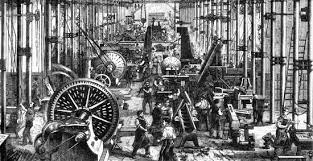‘훔치는 권리’ 양산했던 산업화 초기 유럽의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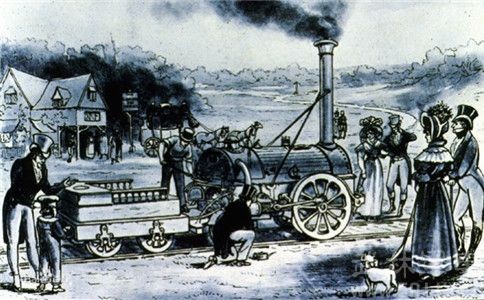
농민-뿌리는 있었다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농업사회는 비록 영주와 지주에게 얽매인 삶으로 노예 같은 처지였어도 땅에 뿌리박고 살았다. 기아와 흉년으로 유랑민 신세가 되는 경우 제외하고는 붙박이 인생이었다.
백성 조이는 질곡은 18세기까지 여전했다. 정상참작이 있기는 했다. 정상참작은 사정 살펴준다는 뜻이니까 경감輕減이 많아야 한다. 가중加重이 오히려 더 많았다. 책임 물어야 할 측면만 보고 무거운 형벌로 다스렸다.
도둑이 교수형에 해당할 경우 가중되면 수레바퀴로 쳐죽였다. 형차刑車다. 자백 받기 위해 고문전문가도 임용했다.
노동자-뿌리 뽑힌 자
공업사회의 기계 돌리는 작업은 농촌 떠나 도회지로 온 사람들이 맡았다. 농민에서 노동자로 변신하면서 생활리듬이 달라졌다.
농촌은 해 뜨면 일하러 나가고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두 끼 먹었다. 일터로 나가기 전과 집에 돌아온 후에 식사를 했다. 동네술집과 우물가 빨래터에서 세상소식 듣는 여유도 있었다.
도시는 하루 12시간 일하기는 보통, 초과근무도 일쑤였다. 느긋했던 농민시절의 두끼로는 허기져 일 못했다. 점심이 생겼다. 하루 세끼가 정착됐다.
도시환경은 이제껏 살아왔던 농사짓던 곳과는 달랐다. 뜨내기들이니까 인정으로 서로 거저 주고받는 일 없어졌다. 대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졌다.
술집은 노동의 피로 푸는 장소였다. 한두 잔 걸치는 사이 노동정보 교환했다. 돈 더 많이 주는 새로운 일자리를 귀에 담고 귀가했다.
훔침
폭력-상해의 경우 19세기에는 발생빈도가 하강곡선 그렸다. 흘러가는 옛 시대의 전근대적 범죄는 농촌범죄였다. 반면 절도가 급상승했다. 새롭게 전개된 공업화시대의 근대적 범죄 바로 도시범죄다. 농민이 몰려들면서 늘어난 탓이다.
체사레 롬브로소는 “범죄자는 원래 타고난다”는 ‘생래적生來的 범죄자설’ 주장했다. 신체에 일정한 특징 있으면 범죄자 될 숙명이라 했다.
그럴까? 계급차별이다. 배고프면 훔치고 싶지 않아도 집어 들고 내뺀다.
물가 특히 농산물가격이 앙등하면 절도가 늘어난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고정돼 있다. 그 돈으로 먹을거리 사지 못한다. 자식새끼 굶어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결할까? 자식들을 길거리 걸인으로 내몬다?
절도하는 권리
1835년 하일리겐슈타트에서 73건의 절도가 기소됐다. 이 가운데 53건이 도시지역에서 발생했다. 66건은 농산물이었는데, 감자·방울양배추·당근·완두·토끼풀 등을 훔친 죄였다. 피고인은 모두 가난한 민중이었다. 14세 이하가 14건이나 됐다. 빈곤은 범죄로 전화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농민과 영주는 비록 예속관계지만 공생했다. 하지만 노동자와 공장주는 인격적 결합이 아니었다. 계약에 의한 인공人工 관계로 공생이 아니다. 따라서 상호의존하지 않고 대결-대립하는 독립개체로 존재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불경기 닥치면? 적자 생기면? 대책은 구조조정 즉 인력감축이다. 어떤 사람 줄일까? 자본가도 주주도 아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자른다.
하루 임금으로 하루 식량 사기도 빠듯하다. 남편 해고되면 처자가 길거리 나선다. 구걸과 도둑질이 뒤따른다. 감옥은 먹을거리 훔친 사람으로 꽉 찬다.
1845년~47년 3년 사이 프로이센엔 절도범이 3만5457명에서 5만864명으로 급증했다. 부자의 수익은 빈자의 적빈赤貧이 원천을 말해주듯 빈부차가 절도권竊盜權의 원인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