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나그네 43년 안병준④] 한국기자협회장 첫 경선에 도전하다

[아시아엔=안병준 한국기자협회 전 회장, <서울신문> 정치부장, <내일신문> 편집국장 등 역임] 노조위원장 이후 편집국으로 돌아온 나는 내 희망과 달리 유랑생활을 시작했다. 선배들은 물론 노조 소속 후배들까지 나를 나무토막처럼 여겼다. 선후배들이나 나나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특히 편집국 간부들의 나에 대한 시선은 싸늘했다. 문화부에서 경제부로, 경제부에서 제2사회부(지방부)로 전전했다. 당시 지방부에는 선배들이 많았다. 김행수(金幸洙) 부장, 송인국(宋寅國) 부장, 박국평(朴國平) 부장, 우상현(禹相鉉) 차장 등 쟁쟁한 선배들이었다. 대부분 지방 주재를 했던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그나마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지방부는 오전 마감만 하면 오후는 사건 데스크 한 명만 자리를 지키면 됐다.
나는 김행수 부장에게 통 사정을 했다.
“경희대 야간대학원에 선발됐는데, 1주일에 이틀만 오후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편집국 안에 앉아만 있어봤자 선배들 눈치만 보이고…. 요즘 추세는 기자도 재충전 차원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장은 너그러운 분이셨다. 나는 주 2회 오후만 되면 나갔다. 부장은 내가 오후만 되면 바람처럼 ‘샥~’ 소리를 내며 사라진다고 ‘안샥’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덕분에 나는 2년 후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모처럼 학구열에 불타 ‘6·29 직선제 선언 이후 신문의 위상 변화 고찰’(<저널리즘>, 한국기자협회, 1989)과 ‘한겨레신문 혁명아인가, 저항아인가’(<신문연구>, 관훈클럽, 1990년 여름호 특집) 등 논문 집필도 나름대로 활발하게 했다.
1991년이 됐다. 나는 한국기자협회장 선거에 나가기로 했다. 1970~1980년대 정치 상황에 따라 탄압 또는 고초만 겪던 기자협회 회장에는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거의 모두가 단독 출마였고 무투표 당선이 됐다. ‘기자협회장 경선’이라는 단어는 독재 시절과 함께 21년째 사어(死語)가 돼 있었다. 그러면서 몇몇 회장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 사람’이 되기도 했다.
1989년부터 기자협회장을 하고 있던 이근성(李根成) 회장은 아주 반듯했다. 서울대 문리대를 거쳐 중앙일보 기자를 하던 친구였다. 최초로 ‘이달의 기자상’도 만들고, 기자들 권익을 위해 아주 열심히 일했다. 또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프로그램과 회원 확충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가 재선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옳지! 이근성 회장을 만나야겠다’
1960년대 후반 회기동 대학 시절, 서울대가 있는 동숭동에 자주 갔던 나는 문리대생 이근성과도 종종 어울렸다. 그보다 선배인 정치학과 신금호가 생각났다. 오랜 친구 신금호는 1970년 청계피복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대학생으로 위장 취업한 1호 노동자였다. <기자협회보> 편집국장인 박인규(朴仁奎, 현 프레시안 발행인) 역시 서울대를 나온 경향신문의 진보적 기자였다. 넷이 만나자고 제안했다. 선거는 3월 말이다.
입춘이 안 된 2월 어느 날. 우리는 무교동 ‘부민옥’에서 만났다. 뜨끈한 국물과 소주가 제격이었다. 4명 모두 애주가로 궁합도 잘 맞았다.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민주화 시대 한국기자협회에 경선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이근성과 나는 즉각 합의했다. 참관자인 2명도 환영했다.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우리 페어플레이합시다.” 우리 4명은 밤늦게까지 기분 좋게 마셨다. 다음날 서울신문 노조 간부들은 나의 출마를 만류하기 시작했다. 의아한 노릇이었다.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당시 출범한 언론노동조합연맹 권영길 위원장이 서울신문 출신인데 기협 회장까지 서울신문 출신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나는 그만큼 당시 친정인 서울신문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러함에도 일부 노조 간부들은 음으로 나를 돕고 용기를 주었다. 그 후배들은 내게 “그동안 서울신문은 정부 기관지로서 사장은 당연직 한국신문협회장을 계속 맡아왔다. 그 때문에 젊은 기자들의 기자협회장 진출도 막아왔다. 이제 그런 관행을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라며 부추겼다.
실제로 1980년 4월 ‘서울의 봄’ 때, 제20대 한국기자협회장 선거에 서울신문 정치부 차장이던 김호준(金好俊) 선배가 경선에 나서려 했다. 그러나 회사측의 거센 반대에 막혀 포기, 한국일보·연합뉴스 출신인 김태홍(金泰弘) 선배가 단독 출마로 당선된 바 있다.
나는 서울·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회원사를 다니며 ‘기자협회장 경선’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부각했다. 그 당시 기자협회 회원은 5000명 정도 됐는데, 그나마도 직접선거가 아니라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였다. 선거에 앞서 3월 22일자 <기자협회보>에 나란히 실린 ‘입후보 소견’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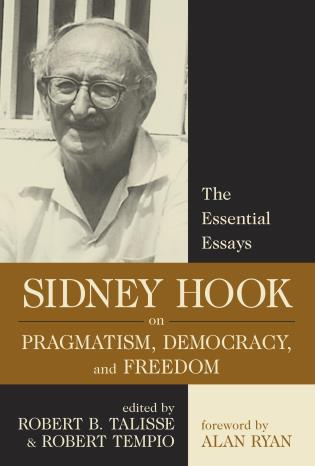
“…출마를 결심했던 날 저는 민둥산이 다된 아버님 산소로 올라갔습니다. 막걸리 한 됫박과 북어포 그리고 <기자협회보> 한 장을 상석(床石)에 올려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기협은 회장이라는 어느 특정 개인의 스타일로서가 아니라, 5,000여명이나 되는 회원들의 생각과 신념에서 공통분모가 뽑혀 나올 때 그것을 구현시키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때 시드니 후크의 ‘어느 시대의 어떤 사람이건 당대에 대한 인식과 사명감을 갖고 행동을 한다면, 그는 이미 시대의 자궁(子宮) 속에 잉태된 다음 세대의 종자(種子)’라는 구절에 감동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자 역시 ‘다음 시대의 종자’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와 조국 통일로 가는 길에 5천여 명의 씨앗은 결코 적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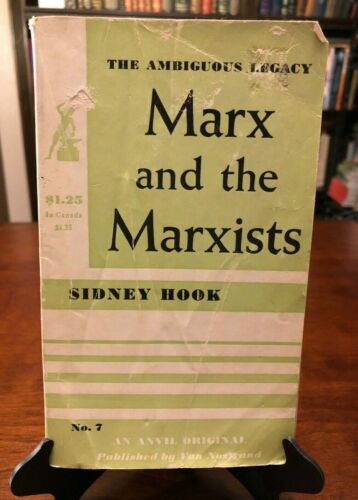
3월 29일 하오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선거에서 나는 89대76, 근소한 표차로 겨우 당선됐다. 당선 즉시 나는 선거 때 약속한 쏘나타 승용차를 기증자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에게 반납했다. 감사패를 만들어 들고 계동 현대그룹 회장실을 방문했다. 정주영 회장은 “왜 차를 반납하는 거냐”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감사패 때문인지 순박한 촌로의 미소를 지은 것을 기억한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8월 17일 당시 군사정권이 추진하던 비민주적 악법인 언론윤리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구심체로 창립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함께 일할 회장단과 집행부를 꾸렸다. 부회장에 KBS 조달훈, MBC 강성주, 국민일보 한석동, 한국경제 박영배, 부산일보 정서환, 광주매일 김용해, (추후) 무등일보 김성 동지를 선임했다. 또한 해직기자원상회복 위원장에 연합뉴스 박영규, 남북기자교류특별위원장에 한국일보 홍의, 국제교류위원장에 코리아타임스 이상석 동지를 각각 선임했다. 우리 31대 회장단 10여명은 30년을 넘게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