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산 김일훈 73] 인류를 병마에서 구제할 ‘신약본초’ 남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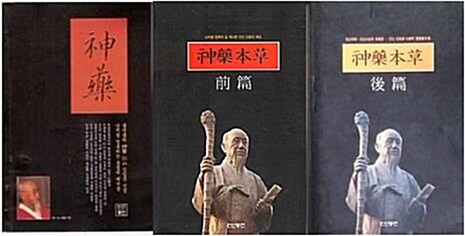
함양에 내려와서 6년 동안 인산은 노구(老軀)를 돌보지 않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했고, 틈틈이 공개 강연회를 열어 자신이 알고 있는 신의학(神醫學)의 비밀을 세상에 알렸다. 이제 자신이 임종의 때를 맞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쇠 현상에 따라 기울어가는 가는 그의 기력을 돋울 방법은 편안한 휴식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인산은 “내 몸 편하기 위해 질병의 고통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며 앉아 있을 수 있는 기력이 소진될 때까지 환자와의 상담을 거르지 않았다.
육신의 노화는 병이 아니다.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꾸어 보기 마련인 ‘불로장생’이란 명제는 가능 영역과 불가능 영역을 아울러 긍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늙지 않을 수는 없지만 더디 늙고 싶다는 것이고, 죽지 않을 수는 없지만 좀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뜻을 내포한 말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성장 과정을 거쳐 늙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우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일일 뿐이다. 그렇기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신의(神醫)도 앓느냐?”
뒤틀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노쇠현상을 보이는 인산에 대해 그렇게 빈정거리기도 했다. 드러난 겉모습을 보고 갖게 되는 자신의 판단 결과에 절대적인 수긍을 하며 그것이 무오(無誤)하다고 믿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면(裏面)에 무궁무진한 진실이 감춰져 있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하릴없이 눈뜬장님의 꼴을 면치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인산이 이뤄낸 갖가지 불가사의한 의료 결과를 두고서도 그저 ‘우연’이 빚은 결과라고 깎아내리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었다고 하니, 거짓일 뿐’이라고 험구(險口)하였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낙원일 수도 있겠지만, 깨달은 이[覺者]에게는 더없이 고달픈 고통의 바다[苦海]”라는 말을 자주 해왔던 인산으로서는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의당 받아야 하는 수모라고 여기고 귓전으로 흘려버리곤 했다.
“인류를 병마로부터 영원히 구제할 우주와 신약의 비밀을 나는 살아생전에 다 밝혀놓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내게서 모두 끝나게 된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대신 지고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난 뒤에야 세상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어떤 위대한 존재가 왔다 갔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만고에 다시 올 수 없는 존재를,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산은 대중들 앞에서 강연회를 할 때 그런 말을 자주 입에 올렸다.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까닭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인산은 83세가 되던 1991년에 들어서는 자리에 누워 있는 시간이 점차 많아졌다.
“아버지, 저희들로서는 미리 빈틈이 없기를 바라 여쭙는 건데…… 혹시 아버지께서 자신의 신후지(身後地)로 염두에 두셨던 곳은 없으신지요?”
자식들로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인산이 세상을 떠날 때를 생각하여 몇 차례 그렇게 물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인산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리도 일관되게 세상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것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는 태도였다.
1992(壬申)년 2월 인산은 그동안 기거하였던 3남 윤수의 집에서 차남 윤세의 집(함양읍 교산리 함양아파트)으로 거처를 옮겼다. 셋째 며느리(최은아)가 셋째(정근, 4월21일생)를 출산할 날이 임박하였기 때문이었다. 인산은 자신이 이제 지구를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만삭인 며느리가 그 힘든 장례를 치르게 할 수 없었다. 그 날 저녁 인산은 3남 부부를 앞에 앉혀 놓고 며느리에게 한없이 자애로운 음성으로 말했다. “네가 힘들테니 난 이제 농장으로 가마.”
84세의 노구에 몇 년을 노환에 시달리며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건만 3남 부부는 아버지의 죽음 준비에 대해서는 꿈에도 모르고 직원들만 있는 농장(죽염공장 사택)에 아버지를 보내 타인의 손에 수발을 들게 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농장은 절대 안돼요. 아버지, 차라리 둘째 형 집에 계시다 이 사람이 출산하면 다시 오시면 되잖아요. 농장에 가신다면 못 보내드립니다.”
직원들만 있는 공장사택에 누가 하루 종일 아버지를 들여다 볼 것이며 퇴근이라도 하는 밤에는 또 숙직 직원이 있긴 하지만 누가 물이라도 제때 떠드릴 수 있으며 무슨 일이 생긴들 누가 바로 알겠는가.
부부는 그저 출산 때문에 아버지가 거처를 옮기는 줄만 알았다. 3남은 인산에게 어떤 존재던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도 한번 못 물려본 채 어미를 잃은 핏덩이를 움막에서 혼자 키워냈다. 내 것이라고는 팔십 평생 땅 한 뼘, 방 한 칸 소유해본 적 없이 셋방만 전전하며 돌아다니는 가난한 살림에 너무 굶겼고 너무 울렸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게 했다.
총명함을 타고 나 인간세상에서 천재 소리도 듣는 아들로 성장했고 이제 사람답게 결혼도 시켰고 집까지 번듯이 한 채 있게 되었지만 3남은 인산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아픈 상처이고 연약한 존재였다. 그로부터 팔십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3남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하여 다른 아기 울음소리만 들려와도 가슴에 동통이 와서 숨이 막히곤 했다. 인산은 세상 물정 모르는 부부의 앞날이 늘 염려되기만 할 뿐 달리 해줄 것이 없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부부의 마음이나 편하게 해주려는 듯 “알았다. 둘째에게 가마” 하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부부는 공장 대신 그나마 한 동네에 있는 형 집에 아버지를 모시게 되자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평소보다 더 자애롭고 부드러운 아버지의 음성 속에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며 낯선 곳으로 마지막 자리를 옮기는지 상상도 못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