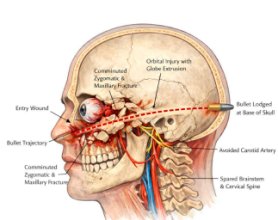본과 3, 4학년 시절, 우리는 부속병원에서 주로 실습을 했지만 때때로 외부 병원으로 나가기도 했다. 남산 아래 H병원 산부인과에서 보낸 3주는 여름 햇살처럼 강렬하게 남아 있다.
얼마 전 문학모임에서 부회장을 함께 맡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그 병원의 의국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닫혀 있던 기억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 시절, 나보다 한 발 앞서 불꽃처럼 살아가던 친구 L군이 떠올랐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곤 했다.
우리를 지도하던 레지던트들 가운데 특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었다. 하얗고 동그란 얼굴, 조곤조곤 이어지는 목소리. 영문으로 또박또박 사인을 남기던 1년차 C선생. 그녀는 분만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라지게 했다. 아이에게 “환영해, 이곳은 살 만한 곳이야”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아직 세상의 무게를 모른 채 생명을 기적이라 믿던 의대생이었다. 어느새 첫 주가 지나고 분만을 기다리며 ‘산박’을 서던 어느 밤, L군이 떨리는 마음을 내게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반해 있었다.
당연히, 가진 것 없는 학생이 자신의 지도 선생님에게 마음을 드러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표현하고 싶어 했다. 나는 그의 설레는 눈빛을 보며 묘책을 떠올렸다. 스테판 츠바이크의 <모르는 여인의 편지> 속표지에 한용운의 시 ‘비밀’을 적어 그 책을 그녀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나의 秘密은 눈물을 거쳐 당신의 시각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秘密은… 소리 없는 메아리와 같아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늘 비밀에서 태어난다. 시선이 먼저 알고, 숨이 뒤따르고, 심장이 마지막으로 고백한다.
<모르는 여인의 편지>의 여인도 그러했다. 평생 사랑했음에도 남자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 여자에게는 삶이었으나, 남자에게는 익명에 가까운 스침이었을 뿐. 죽음을 앞두고서야 남자는 자신 곁에 머물렀던 사랑을 깨닫는다.
그 이야기와 L군의 마음은 어쩐지 닮아 있었다.
실습 마지막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책을 건넸다.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지만 C선생은 감사 인사만 남기고 돌아섰다. 뒷면의 글은 읽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본원으로 복귀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걸로 끝이었다.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나는 가정을 꾸렸고 L군은 오랫동안 홀로 지내다 마흔아홉에야 늦은 결혼을 했다.
그날 모임 후, 문득 마음 한구석이 쿡 찔렸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검색창에 적어보았다. 사진 속 C선생은 여전히 그 여름의 따스함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향했던 조용한 마음이 어떤 이의 청춘을 오래 붙들어 두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기억되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타인에게서 잊혀져도 자기 마음 속에서는 영원히 말을 건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그런 사랑 하나는 살아온 길 어딘가에 숨어 있다. 들키지 않으면서도, 분명 존재했던 마음.
세월 속에서 흐릿해진 그 여름을 나는 가만히 다시 들춰본다. 마치, 가려져 있지만 이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듯. 그것이 젊음의 증거였고 사랑의 형식이었으며 시간이 남긴 가장 은밀한 선물이었다.
흰머리가 늘어갈수록 환자들은 내게 말하지 않고도 묻는다. “시간이 당신을 현명하게 만들었나요?” 나는 속으로 대답한다. 현명함은 때로 후회에서 반짝이는 빛이라는 것을. 놓친 얼굴, 전하지 못한 말, 알지 못한 마음들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여름의 내가 숨 쉬고 있다. 분만실의 숨결 속에서, 환자의 눈빛 속에서, 그때의 열정이 오늘의 나를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나로서 오래전의 나에게 편지를 써 본다. “너는 몰랐지만, 그 모든 순간이 너를 의사로 만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