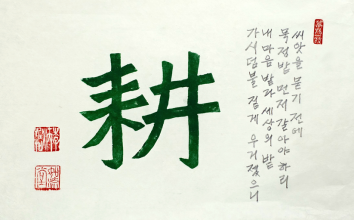경허 스님의 세 달이라고 하는 ‘수월, 혜월, 만공 스님’ 가운데 맏상좌라고도 할 수 있는 수월 스님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는 오래전에 계룡산의 자허 선생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선생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자주 가던 절에, 선생을 유난히 귀여워하며 업어 주거나 무등을 태워 주시면서 어린 자허 선생에게 수월 스님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다는 것이다. 그 스님이 바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크게 다쳐 수월 스님의 치료로 목숨을 구한 뒤, 스님께 감복하여 그 말씀을 따라 몽골로 가서 그곳에서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티베트 불교 승려였던 혜양(慧陽) 스님이셨기 때문이다.
그때 수월 스님이 독립운동을 하던 그 젊은이에게 하셨던 말씀이, 세상에 알려진 마지막 법문처럼 전해진다. 그림자 없는 성자로 불렸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머슴살이를 하다가 뒤늦게 출가하여, 불철주야 오직 “대자비 다라니경” 하나에만 혼신으로 전념했던 스님. 숱한 이적을 행했음에도 어디에 머물든 철저히 모습을 감추고, 낮에는 땔나무를 하고 밤에는 짚신을 삼아 말없이 나누어 주기만 하셨던 스님.
스승 경허 스님이 신분을 감추고 비승·비속으로 살아갈 때, 스승의 자취를 따라 북쪽으로 갔다가 말년에 간도로 넘어가 일제에 내몰려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넘어온 조선 유랑민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3년 동안 주먹밥과 짚신을 나누어 주셨던 분. 범처럼 사나운 만주개들이 밤중에도 스님이 지나는 길이면 얌전히 뒤따르거나, 스님이 앉아 쉴 때는 함께 엎드려 있었고, 그 지역에 살던 조선 사람들이 근처 송림산 중턱에 흙벽으로 작은 절을 지어 스님을 모셨을 때는 호랑이도 내려와 스님 곁을 지켰다고 전해지는 분이다.
스님은 이 절, 화엄사에서 열반에 들었을 때의 이야기 또한 전설처럼 전해진다. 책, <물속을 걸어가는 달>은 절 집안에서조차 제대로 그 행적을 알지 못한 채 전설처럼 전해 오고 있는 수월 스님의 행적을 좇아 기록한 책이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이 책 이야기를 들었다. 수월 스님의 행장에 대해 쓴 그런 책이 있다는 소식에 반가워 찾아보았더니 이미 절판된 지 오래였고, 우리 지역 도서관에는 그 책이 없어 상호대차를 요청했더니 다행히 다른 지역 도서관에 그 책이 있어 빌려볼 수 있었다.
나는 최근 들어 거의 책을 읽지 않고 지내고 있다. 갈수록 눈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남의 이야기만 읽고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계속 내게 필요하고 좋다고 남의 책만 읽다가는 끝이 없겠다는 생각과 함께 모자라고 어설프더라도 남은 날들은 내가 살아온 이야기에 더 주목했으면 싶은 마음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책만은 우선적으로 읽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읽고 나서 줄곧 드는 한 생각은 수행과 수행자의 삶에 대한 의미였다. 수월 스님의 모습에서 육조 혜능 스님과 동학의 해월 선생의 모습이 겹쳐졌고, 스승 무위당 선생과 자허 선생도 함께 떠올랐다. 앞선 세 분은 내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분들이고, 스승 무위당과 자허 선생은 나를 많이 일깨워 주신 분들이었다. 나는 무위당을 통해 해월 선생을 만났고, 자허 선생을 통해 수월 스님의 이야기와 그런 스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런 인연이 뒤늦게 이 책을 통해 수월 스님을 만나게 된 까닭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깊은 고마움으로 읽었다. 대자비심, 사무량심이라 하는 자·비·희·사. 수월 스님의 한 생은 그런 삶의 화신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종교적 설화로서가 아니라, 수행의 의미와 수행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는 이야기로 나에게 다가왔다. 수행이 깊어진 뒤로는 한 번도 잠자리에 누운 적 없이 밤새 짚신을 삼았고, 날이 밝으면 종일 들이나 산에 나가 말없이 일만 했으며, 주먹밥과 짚신을 들판과 길목에 내다주는 일이 한결같았던 분.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세상을 섬기며 살다 가신 성자가 그리 멀지 않은 시간대에 우리 곁에 계셨다는 사실이 참 고맙고 깊은 위로가 된다.
이 무너지는 세상에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는 까닭이다. 경허 스님이 승복을 벗고 홀연히 저잣거리에 숨어들어 마지막으로 박난주라는 이름으로 갑산의 깊은 산골 마을 도하리 서당에 계실 때, 수월 스님이 찾아갔다가 섬돌 위에 짚신 한 켤레를 올려놓고 삼배한 후 돌아온 이야기 또한 감동적이다. 스승의 마지막 입적 소식을 만공 스님에게 알린 분도 수월 스님이었다.
수월 스님은 간도의 송림산 화엄사에서 여덟 해를 머무시다가 그곳에서 열반에 드셨다고 한다. 간도 땅에 버려진 조선 사람들의 한과 눈물을 닦아 주던, 간도의 관음보살이었던 수월 스님. 죽음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일. 그 죽음 또한 온전히 이루었다는 수월 스님의 열반 소식은 이채롭다.
1928년, 여름 안거(결제)가 끝난 다음 날, 개울가에서 몸을 씻고 오겠다고 나섰던 길에 목욕을 마친 수월 스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개울가 바위 위에 단정히 앉아, 머리 위에 잘 접어 갠 바지저고리와 새로 삼은 짚신 한 켤레를 올려놓고 결가부좌한 채 생시와 같은 모습으로 고요히 열반에 드셨다고 한다.
수월 스님은 당신의 다비식에 쓸 땔감도 다른 이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했다.
책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편집 겸 발행인으로 있던 <불교> 1929년 1월 호에 실린 사고(社告)를 통해 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전수월 대선사께서는 경신(1928)년 7월 16일(음력)에 열반에 드셨고, 닷새 뒤 다비식을 봉행함에 칠 일 동안 대방광(大放光)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 책의 마무리 글은 이렇게 적고 있다. “수월 음관, 그는 중생의 일꾼으로 태어나 중생의 일꾼으로 죽은 보살의 화신이었다. 그는 삼매의 열매였고 자비의 빛이었으며 보현의 메아리였고 문수의 꽃이었다. 수월이야말로 참으로 죽음을 온전히 이룬 성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두고 ‘달이 되신 달’이라고 끝없이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책의 한 부분으로, 수월 스님이 갑산의 깊은 산골에 몸을 숨긴 스승 경허를 찾아갔을 때를 묘사한 글 한 대목을 옮긴다. 섬돌 위에 새로 삼은 짚신 한 켤레를 올려놓은 뒤, 닫힌 방문을 향해 삼배를 올렸던 그 풍경을.
경허가 수월을 향해 내뱉은 “모르오”라는 말에는, 경허가 그의 사납고 험한 수행 회랑(廻廊)을 통해 이루어낸 모든 수행의 무게가 남김없이 실려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 말은 모름의 세계를 알고, 모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수월에게 영원한 울림을 안겨 주는 신비의 만다라였다.
‘모르오.’
참으로 수월은 스승으로부터 이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해 그 멀고 험한 길을 걸어온 것이다. 수월은 더는 할 말이 없었다. 그 한마디는 경허의 결론이었고 수월의 바다였다. 이제 수월이 할 일은 이 모름의 바다가 되어 끝없이 출렁이고 끝없이 노래하는 일뿐이었다. 옛 선지식은 ‘열심히 정진해라. 나는 자네 수행에 대해 말해도 알고, 말 안 해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선의 달인이 된 경허와 수월 또한 그러했다. 경허는 문을 여는 일도, 문을 닫지 않는 일도 하지 않았고, 수월은 말을 듣는 일도, 말을 듣지 않는 일도 하지 않았다.
메아리는 골짜기에 따라 울림이 달라진다. 메아리 소리를 들어 보면 그 골짜기의 생김새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메아리 속에는 그 메아리의 골짜기가 함께 누워 있는 셈이다. 경허와 수월이 만들어 낸 끝없는 메아리 속에 숨어 있는 그들의 골짜기를 헤아릴 수 있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은산철벽(銀山鐵壁)처럼 달려 있는 방문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이 한바탕의 법연(法宴)을 마을 사람들의 평범한 들 이야기쯤으로 풀이한다면, 이는 경허와 수월을 한꺼번에 죽이는 참으로 잔인한 짓이 되고 말 것이다.
수월은 엎드려 스승께 절했다. 그것이 스승께 올리는 마지막 절임을, 수월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수월과 경허의 마지막 만남이 이렇듯 저 소림굴(少林窟)의 옛 일을 떠올리게 함은, 참으로 가슴 저미는 불연(佛緣)이 아닐는지.-<물속을 걸어가는 달>, 187쪽
이 책을 쓴 저자와, 함께 수월스님을 행적을 찾기 위해 애썼던 분들께도 감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