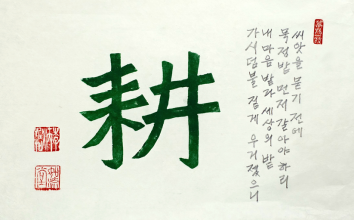며칠 사이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갔다. 아랫녘인 이곳도 어제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어제(12월 6일) 시월 열이레가 우리 집안 시제날인데, 제각이 따로 없어 묘전에서 지내야 하기에 아래위로 내복까지 챙겨 입었다.
내가 갑작스레 내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군대 시절에 내복을 입었던 이후로 지금까지 내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몸이 건강하고 추위를 잘 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복을 입으면 왠지 갑갑해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겨울마다 움츠리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정원님은 늘 내복 좀 입으라고 성화를 했지만, 나는 조금 춥더라도 갑갑함을 견딜 수 없어 여태 버텨 왔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 탓인지, 몸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의 느낌이 예전과 같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 이기는 척하며 새로 산 두툼한 내의를 위아래로 껴입었더니 추위에 대한 몸의 감각이 한결 달라졌다. 따뜻하고 좋았다. 아내의 말을 듣기로 한 것이 역시 잘했다 싶었다. 이번 겨울부터는 계속 내복을 입게 될 것 같다. 앞으로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늙어 갈수록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고향 10대조 묘사부터는 우리 집안 재종(再從)들이 함께 모시는 시제(時祭)이다. 대개 10월 중순경에 모시는 이 시제는 윗대를 차례로 지내오다가 11대조까지는 문중이 함께 모시고, 10대조부터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주관하여 모시고 있다.
<주자가례>에 따르면 ‘3대 봉제사’라 하지만, 부친께서는 후손들에게 그 번거로움이 이어지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당신 조부(祖父)대까지 과감히 시제로 올리셨고, 어머니께서는 일 년에 열 차례 가까이 힘겹게 모셨던 윗대 제사를 부모님 두 위만 모시는 것으로 간소화하셨다.

조부님 기일이 마침 시월 대보름이었다. 제사를 모신 뒤 밤하늘의 달빛은 더욱 시리고도 눈부셨다. 자정을 넘긴 시간, 깊은 적막 속에 대낮처럼 밝던 시월 상달. 옛사람들이 이 달빛의 밝음을 두고 ‘바늘귀를 꿸 수 있다’고 한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할 만큼 달빛은 밝고 눈부셨다. 아마도 시월 보름달을 ‘상달’이라 부른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 시절, 큰 제사를 모신 뒤에는 제사 음식을 이웃에 나누었다. 아침에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대접하기도 했지만, 몇 집은 자정을 넘긴 시각에도 제사 음식을 이고 가서 나누어 드렸다. 객지를 떠돌다 새롭게 자리 잡은 고향집은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그 깊은 시각 어머니를 따라 길을 나섰을 때의 기억이 선연하다.
등에 와 닿던 그 새벽 찬 기운, 사위가 고요히 잠든 마을 위로 쏟아지던 시월 상달의 시린 달빛. 가난 속에서 평생을 힘겹게 살아내신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그 달빛이 새삼 떠올랐다. 그때 내가 올려다본 달빛을 가로지르며, 잠들지 못한 기러기 몇 마리가 날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다.
지금도 시월 보름 무렵이면 할아버지 기제사를 우리 대에서 시제로 올린다. 할아버지의 사형제 모두가 그렇게 시제로 올리게 되어 재종들과 함께 모시고 있는 것이다.
이번 묘사에는 서울 사는 재종들이 일이 생겨 오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도 강원도에서 구순을 넘기신 숙부님과 사촌들이 함께해 스무여 명 가까이 모여 묘사를 지낼 수 있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내가 집안 일을 맡으면서, 묘사에 참석하는 이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참배하도록 하고 있다.
묘사를 모시는 형태도 최대한 간소화하고 축문도 한글로 바꾸었다. 해마다 축문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집안 대소가 내가 무탈한 것은 하느님의 가호와 조상님의 크신 음덕임을 항상 고해 올리고 있다.
이번 묘사 자리에서는, 앞으로 이런 제례 방식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런 형태가 이어지는 동안엔 우리 집안은 시월 묘사 때를 ‘집안의 날’로 삼아 함께 만나는 기쁨을 나누자고 이야기했다.
객지에 흩어져 사는 집안 식구들이 해마다 이날만큼은 ‘홈커밍데이’처럼 고향으로 돌아와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근황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자는 제안이었다. 조카들에게도 앞으로 집안 일을 맡을 차례가 되면 이어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형편과 시류에 따라 편하게 하라고 미리 이야기해 두었다.
비록 우리 집안이 한미하여 내세울 것도, 문중 재산이라 할 것도 따로 없지만 선친께서 생전에 종손인 우리 집안을 위해 정식 장학재단을 만들어 비록 큰돈은 아니어도 해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은 작은 집안으로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그렇게 작은 힘이나마 후손들에게 건네는 마음이 조상의 제사만큼이나 소중한 유산이 되어 앞 세대와 뒤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태 외면하려고만 했던 이런 일에 요즘에 와서 새삼스레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은 이 또한 이번 생에서 내가 경험하고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