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나그네 43년 안병준⑨] 정치부 시절 만나 40년 인연 ‘윤홍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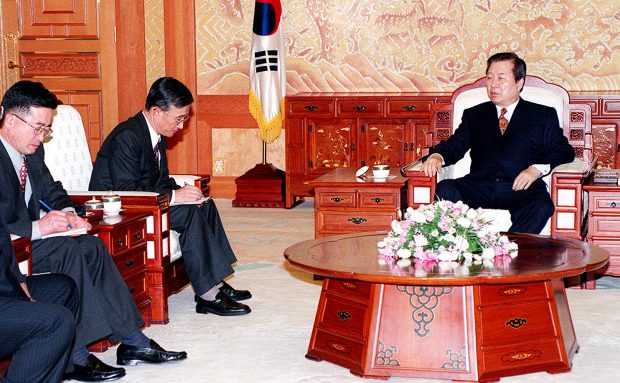
[아시아엔=안병준 한국기자협회 전 회장, <서울신문> 정치부장, <내일신문> 편집국장 등 역임] 총리실 출입 3년여 동안 거쳐간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많았지만, 모두 흘러갔다. 다만 사무관 출신인 한 명의 친구(차관 퇴직)만 남아 있다.
당시 출입기자 대부분은 ‘높은 사람’들만 좋아했지 사무관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시절이었다. 그는 소탈한 성품에 넉살이 좋아 몇몇 3~4진 기자들은 그와 퇴근길 소주도 나누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다. 그는 가난한 시절, 부두 노동자와 서울 명동의 술집 경영 등의 경력도 있다.

그는 독학으로 공무원의 길에 들어섰고, 재직 중인 1982년에는 <현대문학> 추천을 받아 시인이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4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윤홍선(尹弘善)의 시는 그가 모셨던(1975~1998년) 23명의 총리 중 한 분인 이회창 총리가 애송할 정도로 유명하다. 이 총리는 윤홍선 시인을 한국일보에도 소개(1995. 7. 30자 이 주일의 추천시 ‘뒤늦게 알아본 진주 윤 시인’) 한 바 있다.
인연 맺은 지 4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서로 만나고 있다. 2004년 7월 내일신문에서 정년퇴직할 당시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정년을 위로하고자 그는 나를 초청, 열흘 동안 자카르타 그의 집에서 느긋한 휴양을 누리기도 했다.

총리실 출입 이후 나는 국회 출입을 하게 됐다. 국회반장은 김호준 선배였고, 2진 이경형(李慶衡) 선배, 3진 이상철(李相哲) 선배, 나는 4진 막내였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밤낮 국회의원들을 상대해야만 했다.
훌륭한 선량(選良)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러하질 못했다. 그들은 늘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민을 위해 평생을 몸 바치겠다’고 노래한다. 그러나 밤에는 여야 없이 소위 ‘밀실 정치’로 야합과 매관매직에 바쁘다. 그리고 언제나 ‘언더 테이블 머니’로 배를 불린다. 그들이 혐오스러울 지경이었다.
예산 국회 때는 그들과 함께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편두통으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국회 회기가 끝난 어느 휴일,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 운전 중인데 갑자기 오른쪽 손발이 마비돼 갓길에 차를 세워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병원의 진단은 명료했다. “업무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뇌졸중 전단계입니다.”
나는 부장에게 정치부를 떠나 문화부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한수 국장과 상의한 뒤 부장은 내게 경제부로 가라고 말했다. 국장이 “그래도 발로 뛰는 녀석이니, 문화부보다는 경제부가 나을 거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는 “경제원론도 읽은 적이 없다”며 저항(?)했으나 발령이 나버렸다. 경제부에서 나는 ‘비경제부적 부처’라는 건설부(당시 이규호 장관)와 상공부(당시 한승수 장관)를 4년여 출입했다.
그 후 문화부로 옮겨 당시 유승삼(劉承三) 부장을 모시고, 학술·미술·종교 등 짧은 2년 동안 문화부 맛만 보았다. 박람강기(博覽强記)의 유승삼 부장은 ‘무식한 안병준’을 교육하느라 무던히 애쓰셨다.
황규호(黃圭鎬)·김정열(金正悅)·정일성·박강문(朴康文)·임영숙(任英淑)·조남진(趙南珍) 등 ‘문화전문기자’인 베테랑 선배들은 나를 잘 이 끌어 주었다.
애리조나주립대 월터 크롱카이트 저널리즘스쿨 연수 떠나
1994년 5월부터 만 1년 동안 나는 해외연수라는 행운을 잡았다. 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 회장이 설립한 서울언론재단의 선발시험을 어렵사리 통 과한 것이다. 당시 면접관이던 신동호 이사장(申東澔, 스포츠조선 초대 사장)과 이한수 이사(서울신문 사장) 두 분의 내게 대한 짓궂은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그분들은 “서울신문에서 노동운동이나 계속하시지 무얼 하러 외국에 나가려 하느냐?”고 말했다. 나 역시 낙방을 각오하고 농담처럼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네. 미국 언론사의 노동운동은 어떠한가 살펴보려 지원했습니다.”

크롱카이트스쿨(학장 더글러스 앤더슨)에서의 1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다만 학기 중 염규호 교수가 발표 기회를 만들어 원고를 영문으로 작성하는 데 애를 먹었다. 염 박사는 미국 언론학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명한 언론법 학자다. 그는 언론법 연구를 위해 예일대 로스쿨까지 졸업한 열정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발표문, 앞서 말한 ‘서울신문의 반란’을 영역할 실력이 되지 않아 한국의 경희대 후배에게 부탁해 겨우 작성했다. 애리조나의 뜨거운 더위는 유명하다. 뜨거운 날, 못하는 영어 실력과 발음으로 2시간여 발표하느라 뜨거운 땀을 흘렸다. 이에 더해 염 교수는 발표가 끝나자마자 질의 응답시간을 유도, 더듬더듬하는 영어로 듣고 답변하느라 애를 먹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