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기 시집 ‘첫눈이 내게 왔을 때’ 누가 추천글 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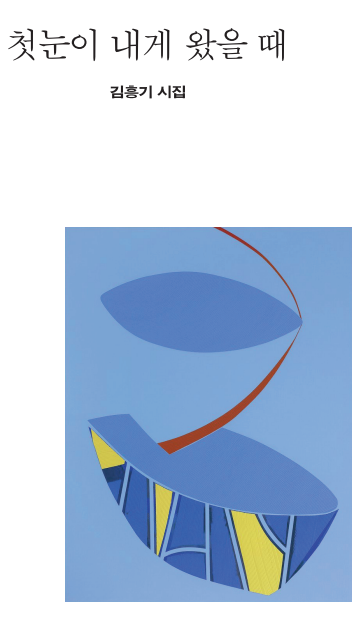
김흥기는 길게 흐르는 강물 같은 사람이다. 그가 흐르는 강물에는 많은 사람들이 발을 담그거나 물장구를 치며 즐겁게 놀다가 이윽고 떠나갔다. 그 강물은 고향에서 발원해서 청계천을 지나고 신촌역에서 출렁대기도 한다. 광야에서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외치는 목자의 마음과 허풍쟁이 광고쟁이 사이에서 오늘도 그는 분열하고 통합하며 시를 짓는다. 그의 시는 지금까지 고여 있지 않았다. 퍼올려서 들여다보면 그의 시는 숨겨놓은 오래된 사랑이다.― 오은주 소설가

김흥기 시인에게는 태생적으로 선한 목자의 피가 흐른다. 바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시적 오마주(Hommage)와 패러디(Parody), 연대기와 같은 내러티브(Narrative)로, 바로 지금을 사는 이들을 기억의 강가로 인도한다. 시인의 이름에 기대지 않고 시를 쓰며 살아온 김흥기 시인은 결코 폼 잡지 않는다. 동대문운동장에 야간 경기가 있던 날의 체육 시간이 가장 반가웠던 중학교 3학년 학급 동기. 겸손하고 선한 인간, 김흥기의 첫 시집이 반갑고 기쁘고 즐겁다. ― 김재룡 시인

1980년대 초, 이대 후문 근처 다락방 채플에서 다락방문학동인으로 만났다. 서슬 퍼렇던 그 시대에 카타콤 같던 그곳에서 문학이라는 종교 아래 순교자의 영혼으로 펜촉을 벼리던 새파란 문청(文靑)이었다. 그 시절의 시인은 젊고 날씬하고 선하고 유머도 있는 ‘교회오빠’의 이미지가 컸다. 그가 평생 쓴 시들을 모아 첫 시집을 낸다. 어떻게 글을 쓸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시에 빵 터졌다. ‘당신, 영혼이나 있어요 썩은 영혼으로 무슨 시를 써.’ 아내의 그런 ‘격려사’(?) 덕에 그의 영혼은 썩지 않고 발효하여 시의 거름이 되어 첫 시집을 꽃피운 게 아닐까. 40년 만에 꽃을 피운 그의 시집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이유다. ― 권지예 소설가

김흥기 시인의 시는 통증에 관한 기록이다. 청계 피복노조, 광주 항쟁. 분단상황, 류관순 만세사건이든 아니면 삶이 연탄불 위 쥐포처럼 졸아드는 할머니 일상이든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악의 린치에 두들겨 맞은 시퍼런 멍에 대한 내러티브이다. 이 멍든 상처들은 연고를 발라 가라 앉힐 수 없다. 그래서 시인은 일회적 선언적 다짐으로 시를 마무리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멍자국에서 독자들의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샘이 자극받게 되길 원할 뿐. 특히 눈물을 솟게 하는 시적 책략은 화자를 어머니로 내세워 당사자로 하여금 어이없는 죽음을 통곡하게 하는 것이다. ― 황훈성 시인, 전 동국대학교 영문과 교수

김흥기는 늘 전복을 꿈꾼다. 그 꿈은 그의 시에서 풍자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존 관념과 질서의 전복을 위한 그의 꿈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숨어있다. 동시에 자신의 삶 역시 그 풍자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 이철 강릉원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그는 유머와 위트의 시인이다. 내가 알고 지낸 40여 년을 언제나 그는 시처럼 경쾌하고 명랑했다. 그의 문학은 장난끼 섞인 시어로 언제나 충분하게 빛나며 언어의 반란을 꿈꾼다. ‘이사’에서의 반전이 그렇고 ‘격려사’에서 그 위트가 절묘하다. ‘추억은 아름다워라’에서 그 웃음 짓게 하는 연애사처럼 역설과 폭소가 그러하다. 찬란하게 빛나는 시의 곳곳에 매복된 그 진지함과 진정성, 한없이 따뜻한 애정과 사랑, 정겨움이 이를 증명한다. 축하한다. 가출하며 고생했던 시의 영혼들아! ― 김종근 미술평론가

시인은 세종로 한복판에서 “한 달이면 해결될/이 나라의 슬픔”(‘교보빌딩 앞을 지나며’), 위악스럽게 나부끼는 ‘근로자 고충중점 처리기간’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본다. “의혹도 없이/아름답게 소멸해 가는” 북악산일지, 그믐달일지 모를 “차마 다 없어질 순 없어”(‘북악산’) 작은 땅덩어리 같은, 시인이 목메고 사는 서울의 모습을 본다. 호텔 신라 숙박계에도 맡기지 못할 상한 몸으로 두 다리 절며 걷는 장충동 유관순을 본다. 그가 걸어 만나는 신평화시장, 청계천, 수유리 4.19 묘지의 지나간 역사와 우리가 써나가고 있는 현실이 맞서 싸우는 서울 한복판의 삶을 보여준다. 그렇게 끝날 것 같다가 부를 거듭할수록 고향을 불러내고 아버지, 어머니, 그가 성장해온 시의 원천들을 불러내는 것은 시인으로서 다시 거듭 사는 공간이기 때문임을. 5월의 봄 햇살이 “하나님이 쏜/화살”(‘5월의 노래Ⅱ’)이거나 바람과 눈보라를 닮은 노래임을,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들어서는 서울 입구에 쓰러져 가마니로 덮어놓은 “시(체)”(‘교정작업’)로 갈아입은 “최첨단 바이오 포스스모더니즘”(‘시인Ⅰ’)의 몸으로 돌아가야 버티는, 그는 천상 시인인 것이다. ― 이종수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