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코멘터리] ‘강철의 무지개’처럼 광야 울리는 이육사·안숙의 절명시(絶命詩)

[아시아엔=안병찬 언론학 박사]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선 시절 서울대학교 언론학부에 출강할 때의 일화이다. 나는 강의 첫 머리에 수강생 중 한 사람을 불러내 시(詩)를 낭송하도록 한다. 빼놓지 않는 시로 이육사의 절명시(絶命詩) ‘광야’가 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하여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친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선 지고
큰 강물이 드디어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신세대 피 끓게 하는 저항의 노래들
젊은이들에게 이 시를 읽은 소감을 물으면 입을 모아 “피가 끓는다”고 대답한다. 어떤 이는 이육사가 “강철로 된 무지개를 그렸던 민족시인”이라고 설명한다. 일제의 감옥을 17번이나 드나든 독립투사 이육사의 이 웅혼(雄渾)한 시는 우주의 탄생과 가난한 현재의 삶과 초인을 목 놓아 부를 천고의 미래를 담아냈으니 감동하지 않을 신세대는 없다.
가끔은 조선 선비인 위당 안숙(安潚)의 애국 ‘절명시(絶命詩)’도 낭송토록 한다.
오호라! 사람의 태어남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진실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면
그 죽음은 도리어 사는 것보다 현명한 것이니,
이는 서슬이 시퍼런 칼날을 밟고서도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던 이유인 것이다
위 한 구절은 대한제국 말 충절의 선비 위당(韋堂) 안숙(安潚)이 지은 절명시의 서두로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위당의 묘비명으로 새겨졌다.
대쪽 같은 ‘선비 정신’
위당은 왜적이 대한제국을 침탈한 1910년 경술국치에 통분하여 자결 보국한 나의 할아버지이다. 젊은이들은 이 절명시 역시 비장하면서도 추상같은 기개가 하늘을 찌르는 격문(檄文)이어서 가슴을 울린다고 말한다. 그런데 유독 사회학과 남학생이 반기를 들었다. 운동권에 속한 그는 양반계급이 지배계급이자 기득권세력이라고 흑백논리를 폈다. 그는 선비와 양반을 구분하지 않고 날을 세운 것이었다.
양반은 고려와 조선 시대에 국왕을 중심으로 동쪽에 문반(文班)이 서고 서쪽에 무반(武班) 서서 두 반열을 만든 데서 비롯했다. 지배계급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문관 관료를 총칭하는 사대부(士大夫)라는 명칭도 붙었다. 양반은 배타적인 특권을 향유했으며 군역(軍役)을 면제받고 노비를 마음대로 부리며 기득권을 누렸다.
그렇지만 선비는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이자 신분계층으로서 양반과 구분한다. ‘선비정신’이라는 말은 명분과 의리를 대쪽처럼 밝혀서 덕치를 실현하려 한다는 뜻을 담고있다. 시종무관장과 대신을 역임한 충정공(忠正公) 민영환(閔泳煥)은 1905년(광무 9년)에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죽음을 고하노라(警告大韓二千萬同胞遺書)”하는 절명시를 쓰고 자결했으니 역시 만고의 의인이거늘 사회학도의 좁은 시야는 그만큼 여물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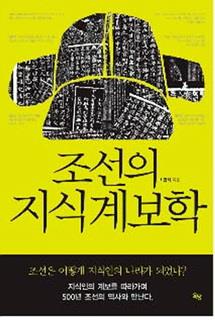
마침 <조선의 지식계보학>(옥당)이 나왔다. 저자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연식 교수(동아시아고전연구소 소장 겸임)는 정치 동학적 시각으로 역사에 접근하여 ‘지식권력의 시대’를 풀어낸다. 그는 조선의 역사는 권력 암투의 역사로서 국가가 힘의 논리에 따라 지식인을 공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조선의 지식인 15명을 문묘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이 조선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고 있어 흥미롭다.
<조선의 지식계보학>을 보고 절명시들을 다시 꺼내 읽는다. 목숨을 걸고 애국하는 것은 의(義)로운 일이다. 정정당당한 애국은 자존과 자주를 수호하는 존엄한 가치로 일컬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