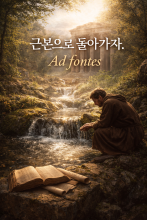[이우근 칼럼] 막장정치 바로잡을 책임은 결국 국민 몫

혼돈이다. 어마어마한 산불이 드넓은 산야(山野)를 삽시간에 집어삼키더니, 칠흑 같은 정치적 혼란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수개월 동안 격렬하게 이어졌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뒤에는 다음 대선(大選)을 앞두고 또다시 시끄러운 혼란이 계속되는 중이다. 아직도 컴컴한 어두움 속이다. 그 어두움의 밑바닥 한 귀퉁이에는 사상전(思想戰)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오랜 혼란과 무질서가 말끔히 정리될지, 아니면 갈등이 오히려 더욱 거세질지 안개 속처럼 불투명하다. 탄핵심판에 대한 비판과 불만의 불길이 물리적‧집단적 저항으로까지 번지지 않기를 바란다.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론으로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려 한 헌재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반대의 소수의견 없는 만장일치 결론은 또 다른 획일주의 탓이 아닌지 궁금하다. 그러나 비록 헌재 판단에 법리적‧정치적으로 마뜩잖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조계와 관련 학계의 엄정한 비평에 맡겨야 한다.
입헌민주국가에서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거스르는 일이다. 자기 쪽에 유리하다고 예상될 때는 심판 승복을 주장하다가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불복과 저항을 외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계엄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것을 대통령이 독단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처사다.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다수가 반대하는 계엄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장차 어떤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
거리와 광장을 시위군중으로 뒤덮은 종교인들, 수십 대의 트랙터를 마치 전차처럼 몰고 도심에 들어온 노동자들도 정치투쟁을 그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은 물론 법률전문가도 수긍하기 어려운 아리송한 판단을 거듭해온 사법부도 맹성(猛省)의 자리에 엎드려야 한다.
단테는 <신곡>(神曲)의 지옥문 위에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는 글귀를 써놓았는데, 일본의 판사였던 세기 히로시(瀬木比呂志)는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는 책에서 일본 사법부의 치부(恥部)를 거침없이 파헤쳤다.
유죄는 유죄로, 무죄는 무죄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면, 법정은 지옥과 다를 바 없는 혼돈의 공간에 불과하다. 법관이 정치 현안의 최종 해결사로 나서거나 군대가 정치판에 끼어드는 것은 모두 정치적 후진성 탓임이 틀림없다.
화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는 사실적으로 그린 담배 파이프 밑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Ceci n’est pas une pipe)라는 글귀를 적어넣었다. 사물과 세계에 대한 인간 의식의 모호성, 불확실성을 드러낸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초현실주의 작품이다. 그림은 파이프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림 속 파이프는 현실의 파이프가 아니다. 초현실의 이미지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글귀는 진실인가, 거짓인가?
다수의 감성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민주주의(democracy)인가, 광민(狂民)의 정치(democrazy)인가? 법의 방망이, 군대의 총칼에 휘둘리는 민주주의는 <이미지의 배반> 같은 포스트-트루스(post-truth, 脫眞實)의 초현실, 그 혼돈의 정치 아닐까?
국회의 줄줄이 탄핵과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이토록 무모하게 충돌한 적이 있었던가? 광장의 시위대가 이처럼 선명하게 두 쪽으로 갈라선 적이, 지지율 1위를 차지한 정치인이 여러 죄목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적이,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적이, 대통령이 두 명이나 파면된 적이 있었던가? 우리 역사에서는 물론 민주정치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초현실적 혼돈의 현실, 막장 정치의 민낯이다.
“민주주의는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작은 양이 저녁식사 때 누구를 잡아먹을까 투표하는 것이다. 입헌공화국 체제에서의 자유는 그 투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잘 무장된 양이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대한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신랄한 분석이다. 다수의 늑대 앞에 움츠린 소수의 양들이 자유의 정신으로 잘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만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Marie de Maistre)의 지적이다.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나타낸다. 품위 있는 국민은 품위 있는 정치를, 분별 없는 국민은 분별 없는 정치를 만나기 마련이다.
힘 가진 쪽의 겸허와 절제, 힘 잃은 쪽의 반성과 인내, 그리고 국민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초현실적 혼돈의 현실 속에서, 막장 정치의 어두움을 밝힐 빛의 책무는 결국 투표권을 가진 주권자, 국민에게 있다. 이번 대선은 빛일까, 또 어두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