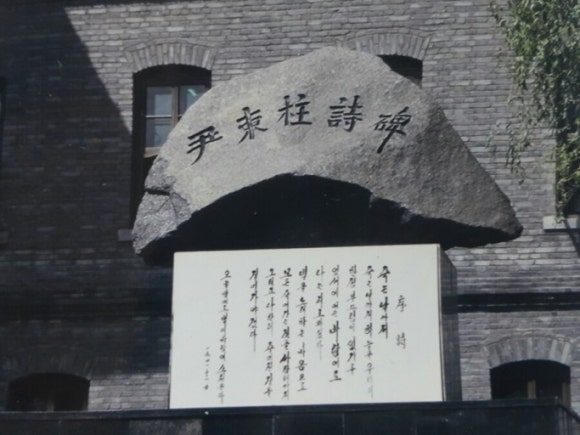[이우근 칼럼]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에 신의 은총이 숨어 있다”

[아시아엔=이우근 변호사, 숙명여대 석좌교수, PEN.KOREA 인권위원장]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명제로 대표되는 주체철학(主體哲學)은 칸트와 헤겔의 이성적 관념철학으로 이어지면서, 사유(思惟)를 철학의 중심에 두고 신체(몸)를 주변부로 내쫓았다. 그런데 니체는 몸을 지워버린 사유를 ‘거세(去勢)된 이성’이라고 비난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씨앗이다.
몸은 세계 안에 있으면서 세계와 거리를 둔다. 인식 주체인 자아(自我)와 인식 대상인 세계, 그 ‘사이에 있는(inter-esse) 몸’은 거울과 같은 존재다. “거울은 내가 알 수 없는 나를 타자의 시선을 통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성이나 관념보다 신체를 우위에 두는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몸 철학’이다.
사르트르와 레지스탕스 동지이자 마르크시스트인 메를로-퐁티는 6.25 한국전쟁을 계기로 자신의 마르크시즘을 수정하고, 스탈린을 옹호하는 사르트르와 친구로서도 사상적으로도 갈라선다. 사르트르는 ‘세계 속에 있는 자아를 무화(無化)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했지만, 메를로-퐁티는 세계 안에 토대를 둔 나의 몸, 나의 집, 내가 속한 사회 안에서 자유를 찾는다.
“머리의 생각보다 몸의 체험이 앞선다.” 메를로-퐁티의 신념이다. 그는 ‘눈이 정신보다 더 먼저 보고, 더 많이 안다’고 말했다. 나와 세계를, 나와 타자(他者)를 연결하는 몸은 정신보다 먼저 세계를 만난다. 몸과 살(flesh)이 철학의 세계 안에 들어온다. 몸의 철학이다.
헬레니즘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영육이원론(靈肉二元論)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는 영과 육의 일치를 가르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요한복음 14:9) 몸의 아들과 영의 아버지는 하나다. 초월과 일상(日常)을 한 품에 지닌 몸이 신앙의 터전에 자리 잡는다. 성육신(成育身)의 신앙, 몸의 신학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자기 낯춤, 자기 비움’(케노시스, ενοσις)이라면, 지극히 작은 이웃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자기 낯춤’일 터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태복음 25:40) 이웃을 향한 작은 행동이 그리스도를 향한 큰 행동으로, 아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동으로 평가된다.
’사랑은 모든 율법과 예언의 본 뜻(綱領)’이라고 단언한 예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다.(마태복음 22:37~39) 문자로 쓰인 사랑의 계명은 몸의 행동으로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행동은 몸에서 나오고, 몸은 마음에 이끌린다. 마음에서 멀어진 몸이 본능•욕망•충동에 휩쓸려 사랑을 잃어버리면 불행에 빠지거나 위선자로 전락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로서는 드물게 크리스천이었던 폴 리쾨르(Paul Ricœur)는 ‘텍스트에서 행동으로’를 외쳤다. 텍스트는 체계•구조•이성의 영역에 있지만, 행동은 몸의 영역, 삶의 자리 안에 있다. 텍스트는 의식의 지배를, 몸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 몸이 정신을 품는다. 몸이 없으면 행동도, 정신도 없다. 몸이 죽으면 텍스트도 무용지물이다.
부활한 예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을 세 번 던진다(요한복음 21:15~17).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음의 사랑은 아가페(ἀγάπη)였고, 세 번째 물음의 사랑은 필리아(φιλία)였다. 아가페는 영적인 사랑, 필리아는 친구의 우정 또는 인간관계의 사랑이다.
세 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모두 ‘필리아’로 대답한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감히 영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는 아가페를 필리아로 낮춘다. 사랑을 영적인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로 낮춘 것이다. 아가페의 자기 낮춤, 사랑의 자기 비움… 사랑의 성육신, 몸의 신앙이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요한1서 1:1) 생명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 몸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 진리는 철학의 개념도, 신학의 명제도, 종교의 교리도 아니다. 진리는 영혼이나 정신 안에 갇혀있지 않다. 욕망•충동•본능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 몸의 일상에로 열려있다.
예수의 생애가 부활과 승천의 과거시제로 끝났다면, 그리스도 신앙은 초월의 무한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再臨)의 미래시제로 이어진다. 두 번째 성육신(The 2nd Incarnation), 새로운 자기 비움, 또 한 번의 자기 낮춤이다.
재림의 미래는 무한에서 새로운 유한으로, 영계에서 새로운 현상계로, 썩지 않고 죽지도 않을(고린도전서 15:53, 44), 신성(神性)이 깃든 새로운 몸으로 다가온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할 영적 예배다.”(로마서 12:1)
사도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몸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라고 믿었다. 설교•기도•찬송•헌금만이 예배가 아니다. 우리 삶이 예배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Homo Adorans) 몸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성(聖)과 속(俗)을 구별하는 종교인은 몸을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들풀처럼 여기지만(이사야 40:6~8),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낙인, στίγματα)을 지닌 신앙인은 그 구별을 알지 못한다(갈라디아서 6:17). 영과 육, 성과 속은 몸의 일상에서 하나로 만나 현실의 삶으로 나타난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린도전서 3:16) 성전은 우뚝 솟은 건물이 아니다. 엄숙하게 차린 제단이 아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몸으로 만나는 영성(靈性)…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Karl Rahner)는 몸의 신앙을 이렇게 풀어낸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삶의 일상에 신의 은총이 숨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