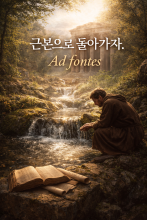지난 2월 16일은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그 순결한 시어(詩語)들을 우리에게 남긴 윤동주 시인이 일제의 감옥에서 숨을 거둔 지 8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일제의 사슬에 얽매인 민족수난기, 윤 시인의 고향 북간도의 동포들은 일황력(日皇曆) 대신 단군기력(檀君紀曆)을 벽에 걸고 은밀히 광복의 소망을 키워가던 사람들이었다.
그 척박한 식민지에서 치열한 성찰과 저항의 시어(詩語)들로 솟아난 윤동주의 시혼(詩魂)은 문학사의 암흑기에 결실한 값진 수확이었다.
혹독한 민족수난기를 살았던 시인은 고뇌하는 지식청년이자 자기성찰에 투철한 크리스천이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십자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序詩’)
첫 시의 첫 구절을 ‘죽는 날’로 시작하다니, 그것도 스물네 살 나이의 젊디젊은 시인이… 첫 구절에서 마지막 구절에 이르기까지 온통 ‘부끄럼, 밤, 괴로움, 죽어가는 것들’로 이어지는 적막한 단조(短調)의 노래는 또래의 젊음으로는 도무지 토해내기 어려운 영혼의 각혈(咯血)이었다.
식민지의 지식 청년에게 저항정신은 운명처럼 거스를 수 없는 실존의 굴레였을 터… 그는 사랑과 괴로움에, 그리고 넘치는 슬픔에마저도 거짓말처럼 저항했다.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바람이 불어’)
그 악몽의 시대를 어찌 슬퍼하지 않았으랴! 일제의 사슬이 몸과 영혼을 통째로 죄어오던 시절, 십자가는 높은 첨탑 꼭대기에 걸려있어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구원의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소망과 현실 사이의 깊은 골짜기에서 좌절하며 방황해야 했던 시인은 아마도 자신이 그 사슬에 질식당할 을 미리 예감했던지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노라’고 다짐한다. 신앙의 정결한 소명(召命)의식과 겨레 사랑의 비장한 각오가 선명히 드러난다.
온 민족이 창씨개명과 강제징용 등 전시 총동원체제의 수렁에 빠져들었던 일제 말기, 고뇌의 시상(詩想)들을 쏟아낸 윤 시인은 십자가의 희생에서 소망의 빛을 찾았던가 보다.
십자가의 희생은 나 혼자만의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허락되어야만 하는 신(神)의 섭리였다.
십자가를 허락받았기에 ‘예수는 괴롭지만 행복했다’고 시인은 읊었다. 광복을 불과 반년 앞두고 숨진 윤동주 시인 역시 스물여덟 해의 짧은 삶을 민족과 시와 신앙의 외로운 혼으로 떠돌다가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피를 흘린, 또 다른 십자가의 희생양이었다. 괴롭지만 행복했던…
“진리를 세우는 또 하나의 길은 본질적 희생이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통찰이다. 일제의 폭력은 자유와 평화, 사랑과 희망, 그 모든 생명 가치를 짓밟는 진실의 적이나 다름없었기에 윤동주의 죽음은 진실을 세우기 위한 본질적 희생이었음에 틀림없다.
그의 민족혼은 독립투사의 심장처럼 뜨거웠고, 그의 저항은 의열단(義烈團)의 전투처럼 처절했으며, 그의 성찰은 철학자의 명상보다 진지했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향한 시인의 사랑은 신앙인의 소망처럼 거룩했다.
십자가는 시인이 살았던 80여 년 전의 높은 첨탑 위에만 걸린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구원의 상징으로 종교의 전당 위에 드높이 걸려있다. 그렇지만 몸소 희생의 피를 흘리는 실존 개개인의 십자가는 찾기 어렵다. 이 어두운 영혼의 시절에 스스로 수난의 길을 걷는 순교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도 그때만이 아니다. 소망의 맑은 종소리가 울리는 자리는 지금도 흔치 않다.
소망은 일제 암흑기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 극심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에 빠져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소망의 빛이 절실히 필요하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를 다시 읽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