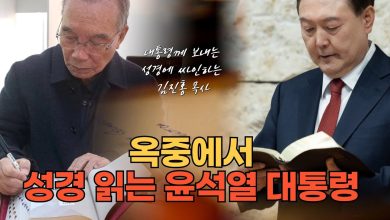[엄상익의 시선] 시골 도시의 다정한 옛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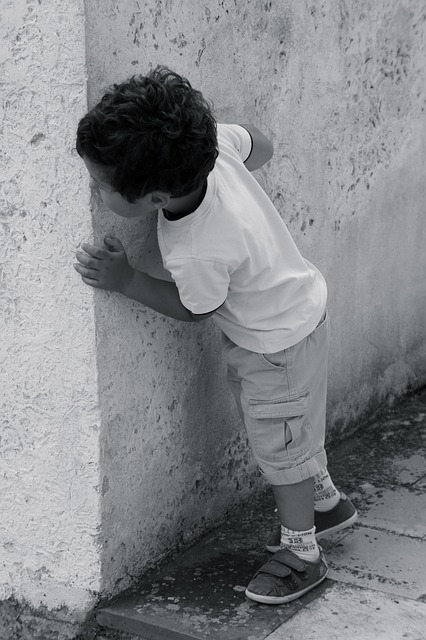
바닷가 작은 음식점 늙은 개의 눈빛에서는 묘한 감정이 느껴진다. 60대 주인 부부를 측은해 하고 사랑하는 그윽한 눈길이라고 할까. 주인 부부와 같이 출근했다가 같이 돌아간다. 단골손님인 내가 가면 뚱뚱한 몸으로 뒤뚱거리며 다가와 옆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조용히 엎드려 있다. 마치 주인 대신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주인 부부는 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안쓰러워 한다. 주인 부부는 그 개가 닭고기로 만든 개 과자를 좋아한다고 했다. 마트의 애견코너에 들려 개 과자 두 봉지를 사두었다가 어제는 그 가게로 가는 길에 가지고 갔다.
내가 ‘옥계신선’이라고 부르는 심 선생과 그 가게에서 만나기로 했었다. 그 개가 보이지 않아서 물었다.
“오늘은 코비가 출근하지 않았나요?”
내가 주인에게 물었다. ‘코비’는 그 개의 이름이었다.
“오늘은 몸이 불편한지 혼자 집에 있겠답니다.”
나는 주인에게 개 과자 봉지를 건네주면서 생각해 봤다. 늙은 개는 마지막에 무엇이 버킷리스트일까.

동해 바닷가에 와서 사니까 다정한 이웃들이 생겼다. 탁자 서너 개 놓인 그 음식점의 주인 부부도 이웃이다. ‘옥계신선’도 따뜻한 이웃이다. 옥계신선은 은행원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옥계 바닷가의 작은 집에서 20년 가까이 산 고참이웃인 셈이다. 나이 팔십을 넘어서면서 지난해에는 아팠다고 했다. 자식들이 큰 병원이 있는 서울로 올라와 살라고 강권했다. 그는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옥계 바닷가로 내려온 것이다. 회 한 접시와 매운탕을 앞에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서울의 친구들은 도대체 늙어서까지 왜 거기서 사느냐고 물어요. 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시간에 따라 수시로 보석 같은 빛깔로 변하는 저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황혼이 질 때 보세요. 그 파스텔톤 같은 신비스런 하늘 아래 해변의 고즈넉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의 말에 동감한다. 그는 사는 집의 이름을 무율제(霧律濟)라고 지었다. 동틀 무렵 바닷가를 거닐다 보니까 사람 같은 모양의 안개가 다가와 같이 춤을 추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 모양을 보고 집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시를 공부하면서 노년을 유유자적 보내고 있다. 원래 부자도 아니고 저축한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바닷가 싼 집을 사서 그 차액으로 팔십이 넘도록 생활비로 쓰고 있다고 한다. 개발 시대의 혜택이라고 할까. 그가 이런 말도 했다.
“서울에 올라가 타워팰리스라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한테서 저녁을 얻어먹었죠. 서너명 한 끼 식대가 90만원이라고 하는데 참 비싸더라구요. 그리고 서울의 강가 아파트 한 평값이 2억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돈이면 여기 동해의 좋은 아파트 한 채 값이죠. 동해에서는 낡은 아파트면 지금도 몇 천만원이면 사잖아요? 바닷가 뒷마을을 가보면 빈집들 천진데 그 비싼 서울에서 왜 오골거리고 사는지 몰라.”
살아보니까 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가 조용히 다음 말을 이었다.
“내가 오랜 만에 도연명 책을 읽었는데요. 죽고 난 뒤의 감상을 상상해서 쓴 게 있어요. 살라고 하니까 문제였지 죽으니까 이해 득실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만만치 않은 내공이 쌓인 것 같았다. 그와 헤어지고 돌아오면서 생각한다. 나는 왜 노년에 바닷가의 시골 도시가 편할까. 바다도 괜찮지만 추억 속 과거의 광경들 속을 다시 거닐 수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시골역 주변에는 ‘다방’이라고 쓴 간판들이 보인다. 그 간판들은 대학 시절 장발로 드나들던 어두침침한 다방을 떠올린다. 과거는 흘러간 노래의 한 소절이나 시골 다방에서 나오는 계란 노른자를 동동 띄운 쌍화차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시골 도시의 오래된 동네는 육칠십년대의 다닥다닥 붙은 주택가와 골목길 그대로다. 나는 다시 까까머리 검정 교복의 학생이 되어 동네길을 걷기도 한다. 이곳에는 오래된 왜식 목조주택들이 간간이 보인다. 그걸 보면 어려서 내가 살던 ‘오시레’가 있는 다다미방의 친숙함이 느껴진다.

인생의 황혼에 그리워지는 것은 이미 살아본 삶, 그래서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다. 새 길이 아니라 친했던 사람들과 걸어서 충만했던 없어진 그 길을 다시 걷고 싶다. 맛보지 못한 것이 아닌 맛보아서 행복했던 그것들을 다시 먹고 싶다. 오래된 시골 도시에는 그런 냄새와 질감들이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