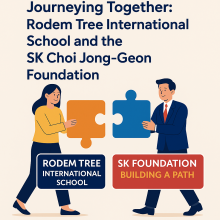코로나19(COVID-19)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매일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가 집계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야 했다. 코로나19는 학교와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학업 중단을 고민한 학생들 가운데 30%가 ‘귀찮아서’라고 답할 정도로 무기력이 확산되었고,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2017년 88.3%에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83%로 5.3%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 최초 고려인학교 설립의 꿈을 꿨던 나에게도 큰 좌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숙소~학교~숙소, 꿈을 나르는 학교버스
좌절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다. 2019년 8월, 학교가 세워지고 12명의 입학생으로 시작했지만 곧바로 2020년 코로나를 맞았다. 학생 수가 두 배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던 나에게 코로나 현실은 믿음을 시험하기에 충분했다. 학생 수가 두 배가 되면 학교 미니버스를 사겠다고 선포하며 불안 속에 새 학기를 기다렸는데, 신입생이 20명이 넘게 등록했다. 코로나 상황에 한국어를 배우러 올까, 대면 수업을 하러 모일까 불안했지만 그것은 믿음 없는 기우였다. 아내는 미니버스를 사겠다는 나의 불안한 선언을 믿음의 선포로 바꾸며 2천만 원을 내 손에 쥐여주었다. 어떻게 마련했는지 묻지 못했다.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학교 버스는 2013년식 25인승, 주행거리 22만 km가 넘은 중고차였다. 매도자에게서 버스를 인수받아 신나게 학교로 몰고 가던 순간, 10년 전 ‘혹시 필요할지 몰라’ 취득한 대형면허증이 하나님의 준비된 한 수였음을 깨달았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 청소년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었다. 바다를 보면 마치 갈매기처럼 훨훨 날고 싶다며 좋아했다. 2019년 아이들에게 어디 가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가장 큰 대답은 “바다요!”였다. 이제 학교에 버스가 생겼으니 내가 직접 운전해 아이들과 소풍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났다. 공부에 지치면 언제든 함께 여행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들떴다. 철이 덜 든 목사였는지 모르겠다. 마냥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니 입이 귀에 걸렸다. 첫 번째 드라이브 코스로 선택한 곳은 아산 삽교천이었다. 놀이시설도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모래사장을 걸을 수는 없는 곳이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버스 안에서 러시아 노래를 부르며 시끌벅적 떠들었고, 운전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그런 소리가 전혀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문제는 내가 실제로 대형버스를 운전해본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다. 중고차였기에 버스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 긴장이 됐지만, 첫 나들이는 왕복 2시간으로 무사히 마쳤다. 아이들은 아쉬움을 가득 품고 다음 나들이를 물었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 잘 나오면 또 가자”고 답했다.
코로나 시기, 수업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
코로나로 인해 수업은 격일제 혹은 오전·오후 분반으로 진행하며 대면을 최소화했다. 논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개조해 만든 교실은 협소했고, 작은 공간에서 마스크와 칸막이를 하고 수업하며 급식도 제공했다. 다행히 학교가 위치한 마을은 50~60가구 정도의 작은 농촌으로, 주로 외출이 드문 노인들이 살아 코로나에 취약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수는 늘 불안했고, 우리는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가정에서 감염 증상이 보이면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아이들은 잘 따라주었고, 나는 그들의 한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다.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를 밖에 나가 실제로 써보는 수업을 구상했다. ‘현장 한국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이들이 외부에서 배운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 시기라 외출은 쉽지 않았지만, 작은 교실에만 머물던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나 역시 운전 부담을 덜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인파가 적은 평일, 바다도 볼 수 있고 안성과 가까운 대부도를 떠올렸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아이들과 바다로 향했다.
출발 전 기도를 하고 핸들을 잡은 내 손에는 땀이 고였다. 멋내려 쓰고 있던 선글라스도 벗었다. 지금은 멋이 아니라 안전이 우선이었다. 버스를 무사히 주차장에 세우자 아이들은 바다로 달려가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저 멀리 수평선 위 파도가 아이들 웃음소리에 더 크게 부서지는 듯했다.

바다 앞에서 되새긴 희망
큰 파도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꿈틀거림처럼 퍼져 나갔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었지만 속으로는 낯선 한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메아리처럼 내게 들려왔다. 아이들은 다이소에서 산 2천 원짜리 선글라스를 내게도 건네며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다. 서현이(리 알리나)는 나에게 포즈를 알려주며 중심에 세웠다. 보이지 않는 몇몇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신경이 쓰였지만, 저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한국에서의 시작을 발자국으로 새기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아내가 준비한 김밥을 함께 나누며 식사 시간을 아껴 수업을 이어갔다. 평일 한적한 상점에서 아이들은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를 사용했고, 나는 그 모습이 짠하면서도 대견스러웠다. 코로나19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었지만, 고려인 청소년들에게는 결코 멈출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기도 했다. 지금은 서툰 한국어로 버벅거리지만, 언젠가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나는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