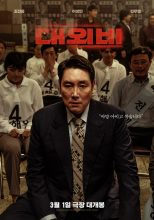동해 바닷가 실버타운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몇십년 살다 다시 돌아온 분들이 더러 눈에 띈다. 고향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라는 소리들을 들었다. 그분들이 변호사인 내게 더러 이런저런 속사정을 얘기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의식은 수십년 전 그들이 한국을 떠날 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일전에는 50여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분을 만났다. 20대에 아메리카로 갔다가 70대 말의 노인이 됐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올까를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2중 국적’으로 살 것인지 F-5 비자로 살 것인지 생각 중이예요. 북한이 쳐들어 왔을 때 다시 도망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중국적자면 한국에 있을 때 한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갈 수 없는 위험성이 있어요. F-5 비자는 한국에서 모든 혜택을 받는데 참정권은 없구요.” 그에게는 아직도 전쟁의 공포가 있는 것 같았다.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니요 군대 면제를 받고 대학 졸업 무렵 바로 미국 유학을 가서 거기서 눌러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젊었던 시절 가장 부러웠던 게 군 면제와 미국 유학이었다. 20대 무렵 주변에서 군대가 면제되는 부잣집 아들을 많이 봤다. 그들은 자랑까지 했다.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먼저 닥치는 벽은 군 복무였다. 스무살이 되면 군대에 가서 3년의 청춘을 국가에 바쳐야 했다. 젊은 날의 3년은 인생이 결정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조선시대도 돈 있는 양반집 자식들은 전쟁에 군인으로 나가지 않았다. 가난한 평민출신 엄마의 넋두리를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자식 귀하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왜 내새끼만 전쟁에 가서 죽어야 하느냐고 했다.
나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다. 6.25전쟁 때 대학에 다니다 병사로 끌려갔다. 원산까지 가서 전투를 하다가 배를 타고 부산에 돌아온 순간 세상을 향해 총을 막 쏴 대고 싶었다고 했다. 누구는 목숨을 던지러 갔는데 힘 있는 집 아들들은 군복무가 면제되고 미국 대학에 유학까지 가 있더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하늘의 별들도 다 크기가 다르듯이 사람도 타고난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 역시 가난하고 힘없는 소시민인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한창 고시공부 중일 때 그걸 포기하고 군대에 갔다. 운명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내가 미국에서 50년을 살았다는 그에게 말했다. 그와 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다.
“저는 미국으로 가셨다는 1970년대 그 시절 최전방 철책선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적의 초소 바로 몇백 미터 앞에서 순찰을 돌았습니다. 적이 침투해 목을 베어간다는 그 시절이었죠. 저는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걸었습니다. 만약 적에게 잡히면 목숨을 끊을 각오였습니다. 두려움은 직접 마주치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대원들 사이에 거꾸로 어떤 오기를 공유하게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사단장인 장군은 만약 적이 쳐들어오면 참호에 엎드려 있는 병사들을 다 같이 체인으로 묶어 단 한 사람도 단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같이 다 죽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지켜야 가족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휴전선에서 적이 총을 한 발 쏘면 이쪽에서는 백발 천발을 쏴버리자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은 벌판에 불을 질러 적들이 묻어놓은 지뢰가 다 터져 버리게도 했습니다. 저는 장기 직업장교로 들어가 남보다 몇 배의 긴 세월을 국가에 바쳤습니다. 뒤늦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아마 수십억은 국가에 세금으로 바쳤을 겁니다. 그 세금이 총을 만들고 탱크를 만드는 국방비에도 사용됐을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왜 북한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도망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부자가 되고 곳곳이 깨끗하고 발전된 이 나라는 70대인 우리 세대가 만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살아서 모르실 수 있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가 내 말을 듣고 움찔하는 표정이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쩌면 그는 나를 약지 못한 미련한 놈이라고 속으로 비웃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흔들림을 이해할 것 같았다. 입장을 바꾸어 보았다. 그 시절 내 앞에 군대 면제와 미국 유학의 행운이 왔다면 어땠을까. 이기주의인 나 역시 덥석 물었을 것이 틀림없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일은 아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70대 여성의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다. “전쟁이 나면 미국에서 평택 미군기지로 수송기를 보낼 텐데 문제는 어떻게 평택까지 가느냐예요. 그걸 확보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타까웠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의 엄청난 물량 공세와 함께 들어온 그들의 문화가 우리의 의식까지 식민지를 만든 면이 있다. 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한국 최상류층 일부에 공통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들의 생명보험이 미국시민권이 아닐까. 백인들에게 종같이 주눅 들어 있으면서 고국 사람들을 보면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내면은 어떤 것일까. 그 영혼들이 깨어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