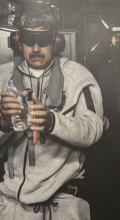광동제약이 유사언론 대응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사내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환기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특정 기업만의 이슈라기보다, 한국 언론사의 수익 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되묻는 신호에 가깝다.
광동제약은 2024년 ‘유사언론심의전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광고·협찬을 미끼로 한 압박성 보도, 취재를 가장한 거래 요구, 보도를 무기로 한 협박성 접근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에도 적잖은 반향이 있었지만, 일부 언론사들의 악습 그 자체를 근절시키지는 못했다. 그 이후에도 이른바 유사언론의 행태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교묘한 형태로 진화했다.
2년이 지난 지금, 광동제약이 다시 이 문제를 공식화한 것은 ‘일회성 선언’이 아니라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정상적인 취재와 보도, 비판과 압박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유사언론의 문제는 단순히 ‘질 낮은 기사’나 ‘과도한 상업성’에 있지 않다. 핵심은 저널리즘의 형식을 빌린 거래다. 이들은 공익을 가장한 기사를 협상 카드로 올린다. 거래에 응하지 않으면 비판이 시작되고, 거래에 응하면 침묵을 지킨다. 이 과정에서 ‘보도’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압박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런 환경이 지속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기업도, 독자도 아닌 ‘정상적으로 일하는 기자들’이다. 취재 요청 자체가 의심받고, 정당한 비판 기사마저 거래의 연장선으로 오해받는다. 기업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언론은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는다. 광동제약이 올해 초 유사언론 대응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악순환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언론이 언론답지 못할 때, 기업은 대응 체계를 만들고 제도적 방어선을 강화한다. 문제는 그 방어선이 두꺼워질수록 정상적인 취재와 비판까지 함께 위축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사언론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상 저널리즘을 구별해내는 감각’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
광동제약이 2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유사언론 대응이 일시적인 특정 시기의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과 신뢰 관리의 일부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기업의 자기 보호 선언이면서 동시에 언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연 취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래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