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칼럼] 안대희와 남기춘, 그리고 전관예우
필자가 오는 10일 35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안대희 대법관을 처음 만난 것은 2006년 7월초였다. 당시는 서울지검 검사장이던 그가 대법관 임명제청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기자들은 취재와 관계없이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가령 홍명보 올림픽 축구감독, 한비야 오지탐험가, 강지원 변호사, 법륜스님, 김근상 성공회주교, 박노해 시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안철수 교수, 법정스님 등등. 이들과는 지금도 만나 세상얘기도 나누고, 인생 선후배로 친분도 유지하고 있다. 꼭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난 분이 있다. ‘빨간 장갑의 야구감독’ 김동엽씨. 고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후 1년에 한 번 정도 안 대법관을 만나 식사를 했다. 매번 취할 정도로 마셨지만, 술집을 옮긴 경우는 없었다. 그가 가장 아끼는 후배 중 하나인 남기춘 검사도 두어 번 같이했다. 안 대법관은 만날수록 극히 절제된 언어와 행동이 느껴졌다. ‘만나고 싶은 사람’ 가운데 괜히 만났다 싶은 경우도 있는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지난 6월7일 퇴임을 한달 쯤 남긴 안 대법관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했다. 그날 아침, 기자를 그만두고 대기업으로 옮긴 한 후배의 문자를 받고서다. “남기춘 검사장이 김앤장 간다는데, 좀 말려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가도 내년 중순 이후에나 가지 모양새 구겨가며 지금 가나요 ㅠㅠ. 정말 돈 없음 몰라도 형수네가 부자라던데.” 그 후배는 남기춘 검사장을 무척 좋아하고 따랐다. 남기춘 검사장은 작년 봄 퇴임 후 로펌 대신 단독 변호사개업을 해 박수를 받아온 터였다. ‘남들 다 그래도 남기춘 만은 로펌 가지 않을 거’라 굳게 기대하고 믿은 그 후배는 몹시 서운했던 모양이다. 필자도 남 검사가 2011년 1월말 서울 서부지검장직을 ‘미련 없이’ 던지고 나왔을 때 ‘역시 남총답다’고 주변에 얘기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필자는 그같은 검사가 검찰총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남총’이라고 불러왔다. 후배의 문자를 받은 필자는 남기춘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 해외로밍중이라는 멘트가 나왔다. 안 대법관에게 전화를 돌렸다. 남 변호사 얘긴 꺼내지 않았다.
“벌써 내달이면 임기가 끝나네요. 퇴임 후 어디로 가시나요?” “오라는 데가 있어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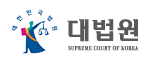 ?그리고 한 달이 흐른 7월7일자 <조선일보>에 안 대법관 인터뷰가 실렸다.
?그리고 한 달이 흐른 7월7일자 <조선일보>에 안 대법관 인터뷰가 실렸다.
그는 9월부터 반년 예정으로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한국을 떠난다고 한다. 귀국해서 뭘 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한다. 인터뷰 말미에 “후배들 부담 주기 싫어 개업을 미루느냐”는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의미심장하다. “제가 전관을 예우해준 적이 없는데, 예우받을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국민검사’ 안대희와 김앤장에 둥지를 튼 ‘당대최고 칼잡이’ 남기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른 이유다.
이상기 기자 winwin0625@theasian.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