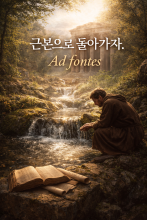그림 중심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란히 서 있다. 플라톤은 우주의 생성과 질서를 다룬 책 <티마이오스>를 들고 검지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손에 든 채 손바닥을 땅으로 향하고 있다. 하늘의 영원하고 유일한 이데아를 바라본 플라톤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감화를 끼쳤고, 땅의 윤리와 학문을 현실의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아리스토텔레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리스철학과 기독교사상의 만남이다.
옛 계명과 새 계명
모세가 하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613개 율법 조항으로 세분한 유대교는 하늘을 바라보되 땅을 소홀히 여긴 종교였다. 예수는 수많은 율법의 계명을 단 한 마디로 요약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예수의 새 계명은 하나, 사랑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다.”(마태복음 22:37~40) 예수는 율법의 억압 너머에서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사랑의 숨결을 계시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사랑은 은총을 드러낸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베드로전서 4:8)
율법·영원·내세의 성육신
플라톤의 손가락이 하늘의 이데아, 사랑의 근원을 가리킨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손바닥은 이웃 사랑이라는 땅의 현실을 향한다고 볼 수 있다. 성서는 성육신을 신앙의 비의(秘義)로 말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면, 그가 밝힌 사랑의 계명 또한 ‘율법의 성육신’이라 부를 수 있다.
광야에 시내가 흐르고 황무지에 꽃이 피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성서의 종말론적 계시다(이사야 35:1, 65:17). 이것은 기존 세계의 근본적인 갱신을 의미하는 내세의 이상향이다(요한계시록 21:1). 그 내세는 단순히 하늘의 세계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다. 시간이 ‘영원의 성육신’이라면, 땅은 ‘내세의 성육신’일 것이다. 내세에도 땅이 있다!
진리의 성육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요한1서 1:1)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리. 이것은 어떤 철학도, 사상도 경험하지 못한 성육신의 신비다. 진리가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일상이 없는 삶은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담기 어렵다. 신앙은 생명의 진리가 인간의 일상적 삶 안에 육신을 입고 현존한다는 믿음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복음 14:6)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의 선언은 곧 ‘진리의 성육신’이다.
아가페
부활한 예수는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다. 다만 세 번의 질문을 던졌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한복음 21:15~17) 이 세 번의 질문은 모두 같은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의미가 다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αγαπαs με)를 사용한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도 이 아가페의 그림자일 뿐이며,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사랑만이 온전한 아가페다.
사랑의 성육신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 세(φιλω σε)”였다. 이는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의미다. 필리아는 형제나 친구 간의 사랑이다. 이에 예수는 세 번째 질문에서 사랑의 단어를 바꾸어 물었다. “필레이스 메(φιλεις με)?” 즉, “네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에서 필리아로 낮춘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사랑의 성육신이다.
아가페가 하늘의 사랑이라면, 필리아는 땅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가 아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필리아를 요구하신다. 그 은총 자체가 사랑이다.
필리아의 손
아가페는 물론, 필리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랑이 에로스(ερος)다. 이는 자기중심적이고 대가를 바라는 이기적 사랑이다. 복을 바라며 헌금을 바치고, 선행의 보상을 기대한다면, 이는 필리아에도 못 미치는 에로스의 사랑일 수 있다.
필리아는 아가페에 이르지 못하지만, 에로스로 떨어지지도 않는다. 예수는 아가페로 물었고,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했다. 이는 정직한 대답이다. 스승은 아가페를 필리아로 낮춘다. 플라톤의 손가락이 하늘을 가리킬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손바닥은 땅을 향한다. 그것은 정직한 손이다. 아가페도, 에로스도 아닌, 필리아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