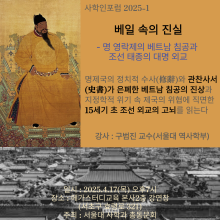오늘은 제주 4.3사건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날을 맞아 제주 출신으로 한겨레신문 스포츠 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양희 기자가 이 신문 뉴스레터에 쓴 글을 본인 승락을 얻어 <아시아엔>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편집자>

할머니는 당시 첫 아이, 그러니까 제 아버지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날, 군경이 보낸 트럭에 실려 가 할아버지는 내천 구덩이 안에서 죽창에 찔리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5개월여 뒤 수소문 끝에 구덩이 안에서 한데 엉킨 여러 주검을 발견했을 때 증조할머니는 단박에 할아버지 주검은 알아봤다고 합니다. 꽃무늬 셔츠에 시계를 차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스물두 살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세상과 작별하셨습니다. 스무살 만삭의 아내를 두고 말이죠. 할아버지의 웨스턴 부츠는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비슷한 시기에 군경에 끌려가서 군사재판을 받고 어머니가 태어나기 한 달 전부터 감옥살이를 하셨습니다. 옥중 편지로 겨울에 너무 춥다고 두꺼운 솜옷을 보내달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광주형무소에 있다가 서대문형무소까지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실종되셨지요.
외가에서 십수년간 찾으려 애썼는데 외할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외가댁은 어느 날부터 외할아버지 생신 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시더군요. “다른 사람들보다 할아버지가 감옥에서 오래 사신 거더라”고요. 아마도, 가족에게 돌아오기 위해 추운 날을, 더운 날을 감옥에서 버티신 것 같습니다. 옆집에 빌려준 농기계를 찾아 놓으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을 보면 감옥에서 곧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으셨던 듯합니다. 스물아홉, 4남매 아버지의 그 처절한 몸부림을 전쟁이 앗아갔지만요.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부모님 두 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국민학교 졸업 뒤 시내 일식당에서 잠깐 일을 하시다가 농부가 되셨습니다. 일식당에서 일한 경험으로 소풍 때마다 우리 4남매의 김밥을 아주 예쁘게 싸주시고는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 제때 치료받지 못한 오른팔이 점점 굳어갔지만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국민학교 때 일등을 놓치지 않던 승부욕은 밭에서 발휘됐지요. 그렇게 과수원을 사고, 세간살이를 늘려가셨습니다. 4남매가 커가면서는 빨간 줄(연좌제)을 걱정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누가 될까 봐서요. 다행히 연좌제는 없었고, 오빠는 할아버지처럼 공무원이 됐습니다.
77년 전 오늘, 4·3이 없었다면 공무원 집안 맏이로 유복하게 자라셨을 아버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땅으로 떠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땀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까지도 무릎 통증을 견디면서 귤 과수원에 온 정성을 기울이십니다. 신농법이 나오면 가장 먼저 시행해보시고는 뿌듯해하시지요. 아버지는 곧으시기에 늘 당당하십니다.
세상에 찢기었으나 어머니는 세상을 향한 밝은 시선을 잃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주위에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께 드린 용돈은 온전히 어머니만을 위해 쓰인 적이 없습니다. 밭일을 도와주신 이웃분들에게 너무 고맙다며 꼭 웃돈을 얹어주시지요. 더불어 살라고, 고치(같이) 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비극의 토양 위에서 자라면서 부모님께 배운 것은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성실과 배려였습니다. 자존감과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처절한 현실에 꺾이지 않고 보란 듯이 이겨냈던 부모님은 다만 이것 하나는 평생의 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것이지요.
저는 가끔 아버지에게 투정을 합니다. 아버지 닮아서 쉬지도 않고 일만 한다고요. 어머니에게는 기부를 할 때마다 자랑을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상을 받을 때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누가 알든, 모르든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핏줄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정말 살고 싶으셨을 두 할아버지가 끝끝내 갖지 못했던 ‘내일’을 저는 당연하듯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들이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 딸을 전 마음껏 안아주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은 희망을 잉태하고 희망은 전혀 다른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을 저는 부모님을 통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두 할아버지가 계신 4·3 평화공원을 찾아가 이렇게 빌었네요. “한 번도 품지 못한 아들, 딸 많이 보고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손자, 손녀 곁에 오랫동안 있다가 할아버지에게로 가게 해주세요.” 이만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