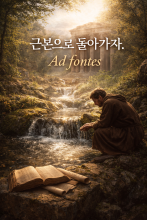[이우근 칼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현실 속에 과연 존재할까?

왕필(王弼)이 주석한 노자 <도덕경> 통행본(通行本) 제1장은 ‘도가도비상도 명가명비상명(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이라는 놀라운 글귀로 시작한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참된 도가 아니고, 사물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면 올바른 이름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영구불변의 도가 아니고, 사물을 부르는 이름도 그 본래의 실체가 아니다. 어떤 원리나 이치를 말과 글로 체계화하고 이름을 붙이면 그 원리나 이치는 개념과 이름 속에 갇혀 생명력을 잃고 만다.
하이데거는 이름을 가진 존재자(Seiende)와 이름 없이 그 근원이 되는 존재(Sein)를 구별했다. 하이데거의 ‘존재’를 노자의 ‘도’와 비교하는 분석은 매우 흥미롭다. 세상 만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흐르는 강물만이 아니다. 사람도, 동식물도, 무생물도 모두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과정 속의 존재’다.
무엇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변화의 과정을 무시한 채 눈앞의 고정된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르트르의 생각을 빌리면, 의식을 지니고 생동하는 대자(對自, pour-soi)를 마치 의식이 없는 즉자(卽自, en-soi)처럼 고착화하는 것일 수 있겠다. 아무 거리낄 것 없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경지에 이르면, 세상의 모든 이름도 사라지고 마는 것을…
그렇지만 세상에 이름 없는 사물은 없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이름이 있다. 하다못해 애완동물도 예쁜 이름을 가진다. 신(神)에게까지도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인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이름을 거부했건만(출애굽기 3:14)…
이름을 붙이려면, 바르게 붙여야 한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을 이루지 못한다.” 2500년 전에 공자가 설파한 정명론(正名論)이다. 이름은 단지 어떤 주체나 사물을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주체를 다른 객체와 구별 지으면서, 그 주체의 성질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지속과 함의(含意)의 기능을 수행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김춘수 ‘꽃’)
모든 사물은 이름을 통해 비로소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적 존재’로 다가온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에덴동산의 사물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인 것은 고립된 존재를 관계적 존재로 이끌어내는 최초의 창조적 언어였다(창세기 2:19). 이름은 주체와 객체를 구별 짓지만, 또한 그 둘을 서로의 관계 속으로 불러들여 연대(連帶)의 삶으로 이끌어간다. 그 연대의 관계가 올바로 서려면 올바른 이름을 붙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민(民)이라는 한자는 원래 ‘뾰족한 꼬챙이로 한쪽 눈을 찔린 사람’을 뜻하는 갑골문의 상형문자로, 고대에는 전쟁포로나 노예 또는 죄수 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포로나 죄수, 노예의 한쪽 눈을 찔러 저항력을 빼앗고 노동력은 남겨둬 강제노역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인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평민(平民)이라는 뜻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 포로, 노예, 죄수를 다스리는 사람이 인(人)이다. 인은 지배자, 민은 피지배자인 셈이다. 어원학적(語源學的)으로 볼 때 ‘인민’은 계급적인 용어다. 계급사회를 무너뜨렸다는 북한이 즐겨 쓰고 있지만, 즐거운 단어가 아니다. 국민이라고 쓰는 것이 옳겠다.
링컨은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의 구호를 인용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명언으로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간결하게 압축해냈다. 여기서 국민이라고 번역된 people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지만, 공산국가에서는 일당 독재의 지배를 받는 인민이다. 봉건군주국에서는 힘없는 백성, 독재체제 아래에서는 저항의 민중, 외세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에서는 수난의 민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거의 모든 정당의 이름에 ‘민’자가 들어 있지만, 그 숨은 뜻은 ‘국민’이라기보다 차라리 ‘군중, 대중’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다. 정당들이 국민의 뜻을 성실히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중선동에 골몰하고 있을 따름이다.
여당이 말하는 국민의 반대편에는 야당이 말하는 국민이 따로 있다. 같은 사안에서도 한쪽은 국민의 이름으로 찬성하고, 다른 쪽은 국민의 이름으로 결사반대한다. 나라와 사회의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 뜻이 그처럼 둘로 딱딱 쪼개지는 것은 아니련만… 어느 한쪽이 내세우는 국민은 거짓 이름 아니겠는가. 정치선동에 국민의 이름이 도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사직은 그다음으로 여겨라(民爲貴 社稷次之).” 맹자의 가르침이다. 사직은 오늘날의 정부 또는 정권이다. 권력자나 정권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봉건시대의 가르침이 그러했거늘, 하물며 국민주권시대인 현대임에랴. 국민의 이름을 아무 데나 함부로 붙이면 거짓 이름이 되고 만다. 바라건대, 거짓 이름을 버려라. 이름을 바르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