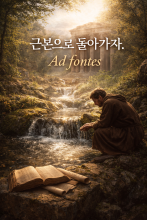[이우근 칼럼]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Amo ergo sum)

[아시아엔=이우근 변호사, 숙명여대 석좌교수, 86 인권위원장] 성서의 장절(章節) 구분이 지금처럼 확정된 것은 중세 이후의 일이다. 열여섯 개의 장 전체가 원래 한 통의 편지인 고린도전서는 12장에서 설교‧교육‧기적‧치유‧방언‧통역 등의 은사(恩賜, 은총의 선물)들을 열거한 뒤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는 권유로 마치고, 그 다음에 저 유명한 ‘사랑 장’인 13장이 이어진다. 13장의 사랑이 없으면, 12장의 놀라운 은사들은 모두 아무 것도 아니다!(고린도전서 13:2)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으뜸은 사랑이다.”(고린도전서 13:13) 믿음의 뿌리는 2천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있고, 소망의 열매는 장차 맞이할 새 하늘 새 땅에 결실한다. 믿음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에 뿌리를 박고, 소망은 다가오는 미래의 열매로 이어진다. 믿음의 뿌리는 어제의 들숨, 소망의 열매는 내일의 날숨이다.
그 들숨과 날숨 사이, 어제와 내일 사이의 짧은 멈춤은 무엇인가? 바로 현재다. 현재인 ‘지금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 사랑이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현재의 삶이다. 사랑의 삶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아무 쓸모가 없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 그 너머, 으뜸의 자리에 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면 믿음의 고백도, 소망의 기원도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그 영원이 ‘지금 여기’에 있다. 사랑은 믿음의 뿌리인 어제와 소망의 열매인 내일을 한품에 지닌 영원한 현재(Eternal Now)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확신했다(로마서 10: 10).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은 정신과 육체, 그 전인격의 삶을 가리킨다. 지금의 마음 안에 믿음이, 현재의 몸 안에 소망이 있다. 그 둘을 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믿음은 신앙고백문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다가가는 삶이다. 다가감은 개별적인 발걸음이 아니다. 삶 전체의 방향성이다. 믿음은 다가감, 소망은 기다림이다. 그 다가감과 기다림이 만나는 자리에 사랑이 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 어제의 들숨과 내일의 날숨이 만나 새로운 삶의 숨길을 열어가는 생명의 흐름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 근대 서양철학의 문을 연 데카르트의 명제다. 인식주체인 자아(自我)의 발견, 관념론의 출발이다. 그런데 자크 라캉(J. Lacan)은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에서 세례를 받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나는’ 것들이 훨씬 많다. 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 우리 삶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신다. 우회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생각해보고 핸들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도로상황에 맞춰 손이 자동적으로 핸들을 돌린다. 무의식적 메커니즘, ‘적응 무의식’이다. 모든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야 한다면 일상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다.
데카르트를 비판한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만이 아니다. “데카르트는 틀렸다. 나는 생각하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Amo ergo sum).” 인권운동가 코핀(William S. Coffin) 목사의 웅변이다. 철학의 명제가 사랑의 명제로, ‘생각하는 인식 주체’가 ‘사랑하는 삶의 존재’로 거듭난다. 생각은 혼자만의 것이지만,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홀로 있을 수 없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의 사이(間)에 있는 관계적 존재다. 그래서 인간(人間)이라 부른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 정의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정의롭게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다. 정의는 남에게 큰 소리로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정의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남에게 감화(感化)를 끼치고 베푸는 것, 곧 사랑이다. 가진 자를 향한 분노와 증오를 가득 품고 정의를 외치면서 분신자살하는 인권투사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린도전서 13:3). 사랑이 궁극의 정의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 “이웃을 찾지 말고, 스스로 이웃이 되라“고 가르쳤다. 거룩한 제사장도, 종교적인 레위인도 아니고 왜 하필 천대받는 이방의 사마리아인일까? 사랑은 신성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어둡고 고통스럽고 이질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뤄가는 일상의 삶이라는 뜻 아닐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들의 목록에 정의의 자리는 없다. 평등의 신념, 도덕적 이상의 자리도 없다. 정의, 평등, 도덕 저 너머에 믿음과 소망이 있고, 믿음과 소망 그 너머에 오직 사랑이 있을 따름이다.
예수는 오직 하나의 새 계명을 선포했다.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사랑이 으뜸이다. 제사장과 종교인의 사랑이 아니라, 낯설고 보잘것 없는 이방인의 사랑이…
[출처] (너머의 길녘 27)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작성자 leegadf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