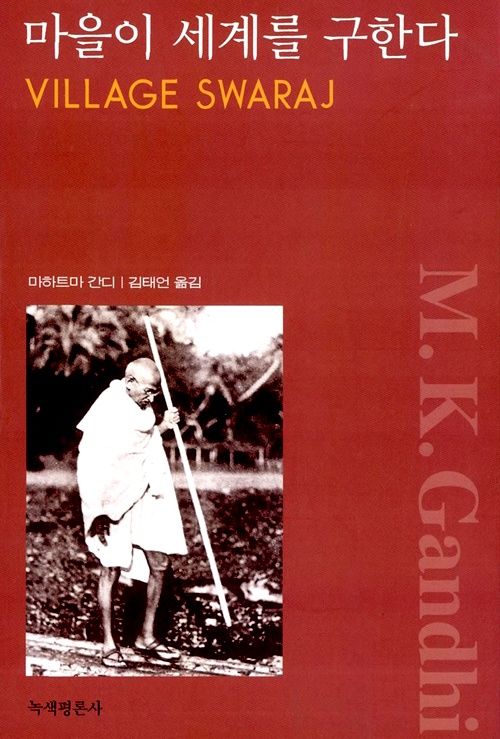1월 27일자 아시아엔의 “[그때 그사람] 1986년 서울대 일반논리학 이상철 강사의 ‘총각總角’과 ‘원만圓滿’” 기사가 나간 뒤 양평에서 농사를 짓는 심범섭 선생이 아래와 같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심범섭 선생은 1980년 이후 30년 동안 건국대 앞에서 ‘인서점’을 운영하며 당시 청년세대와 호흡했으며 지금은 농사 짓는 일과 함께 시대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이상기 기자의 이상철님! 단톡방 글 받고 반가웠습니다. 산골짜기 농사꾼의 생각을 새해 인사 겸 신년 덕담으로 띄웁니다. 손질해서 올리셔도 좋고, 안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대로 잘 있지만, 집사람은 자꾸 망가져가는 속도가 빨리지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그 땐 정말 호신술이 중요한 때였지요. 대학생들은 물론 노동자와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지식인 등 많은 사람이 가명을 쓰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대학가나 신촌, 안암동, 대학로 등 골목 속의 골목에서 막걸리 사발과 노래, 눈물, 울분을 토하며 나누는 문건에 묻어서 돌아다니는 바이러스 같은 ‘어용’이나 ‘쁘락지’라는 말이 가명과 가명 속의 정체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두고 진짜와 가짜가 선별되면서 손에서 손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혁명이라는 불길이 동지의 뜨거운 정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주던 때였지요.
그런 시절에 도처에 대인 지뢰가 묻혀 있는 세상으로 무거운 밀지를 뜨거운 핏속에 건네주고 조각배를 띄우는 철학교수의 마음은 총각의 뿔이 자신을 찌르는 까시가 아니었을까요. 그 때 그 시절의 선배 스승이, 우정이 그랬지요. 더러는 격해서 끌어안고 땅바닥에서 막 뒹굴며 눈물을 쏟았으니까요.
아마 청년 스승은 그래서 총각과 원만이라는 호신용 ‘양날의 칼’ 자루에 알쏭달쏭한 무늬를 새겨놓을 수 밖에 없었겠지요. 그 때 그 어두운 시대의 언어는 그래서 토정비결의 언어와 복조리에 담아서 바이러스처럼 광야로 퍼나르고 광야의 들불을 준비하며 들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어둠 속에서 살았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그 시절 그 청년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상기 회장님도 필경 그 청년강사를 40년이나 맘 속에 그리운 스승으로 오롯이 간직해 오신 건 아닌지요.
여튼, 그 강사님이 제자를 바깥 세상으로 내보내며 허리에 든든히 채워준 호신용 양날의 칼 ‘총각總角과 원만圓滿’은 아리송해서 사육신 중 한 분인 성삼문 같은 이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색논리지요.
설을 이틀 앞둔 오늘 이 글을 쓰는 이곳 양수리 뒷산 부용산 골짜기는 진짜 눈이 펑펑 쏟아지는군요. 하늘이 또 무슨 저지레를 치시려나! 무섭고 두렵고 솔직히 좀 원망스럽네요. 지난 번 무거운 습설에 비닐하우스가 풍덩 주저 앉았고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아니지요. 꼭 80년대가 생각나는 지금, 총각원담이라는 비단주머니를 제자들의 허리띠에 매달아 준 청년교수의 얘기를 들으니 지금 펑펑 쏟이지는 눈을 맞으며 총각의 그 까시를 준비하는 나무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우리가 등산길에 만나는 아까시나 엄나무는 아마 지금쯤 온 몸을 사나운 가시로 무장하는 준비에 바쁠 것입니다. 제가 까시나무가 까시를 준비한다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녀석들이 없으면 구태어 품 들여서 자신을 까시로 무장하려고 하지 않는 산속의 점잖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나무라고 합니다.
이 사나운 까시나무 즉 총각나무가 원래 준비한 것은 까시가 아니라 잎이나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상황을 보니 노루도 염소도 더구나 등산객도 너무 많이 돌아 다니니까 “어, 이거 안되겠네!” 하고 까시로 무장을 하게 된 것이라는군요.
이런 사실은 식물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아끼시나무나 엄나무 등 대개의 까시나무는 자신의 생존공간에 사는 벌레나 노루나 염소 등 동물에게 대략 20%쯤의 잎과 어린 순을 먹이로 주어서 자신의 번식활동을 돕게 합니다. 공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머슴들이 너무 지나치게 잎과 어린 가지를 먹어 치우면 아끼시나무나 엄나무는 “어 이놈들 봐라! 안되겠는데!” 하고 그들이 먹을 잎과 어린 가지의 순을 까시로 변형시켜서 먹을 것도 없애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접근금지’의 피객패를 달아놓는 것이지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잎이나 어린 가지를 변형시켜 까시를 만들어 온 몸을 무장하다니! 참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넘‥ 신기해서 유레카를 외치기는커녕 헛웃음이 나오네요.
시실 식물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죠. 벌레나 새나 온갖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몸을 먹도록 해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과 건강을 위한 의약품까지 마련해 주는 생태계의 주인이니까요.
과유불급이라는 말,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인간이 그 자연에 의식주라는 생존의 기초를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너무나 옳은 이치며 법이 아닐까 싶군요.
마당가에 늘 우뚝 서있는 나무, 길을 가다가 그늘을 지워주는 가로수 또는 등산길에서 문득 만나는 나무들에서 우리는 저 까시나무가 우리에게 제시한 20%라는 기준, 그 과유불급이라는 법에서 오늘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이 어수선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삶의 지혜와 덕성을 깨닫게 되는 새 해가 되길 기도하는 원단이었으면 합니다.
이곳 부용산의 농장 두렁농은 인터넷은커녕 전화도 잘 안되는 통신 오지입니다.
산골짜기 농장 두렁농에서 머슴아저씨 심범섭 올림